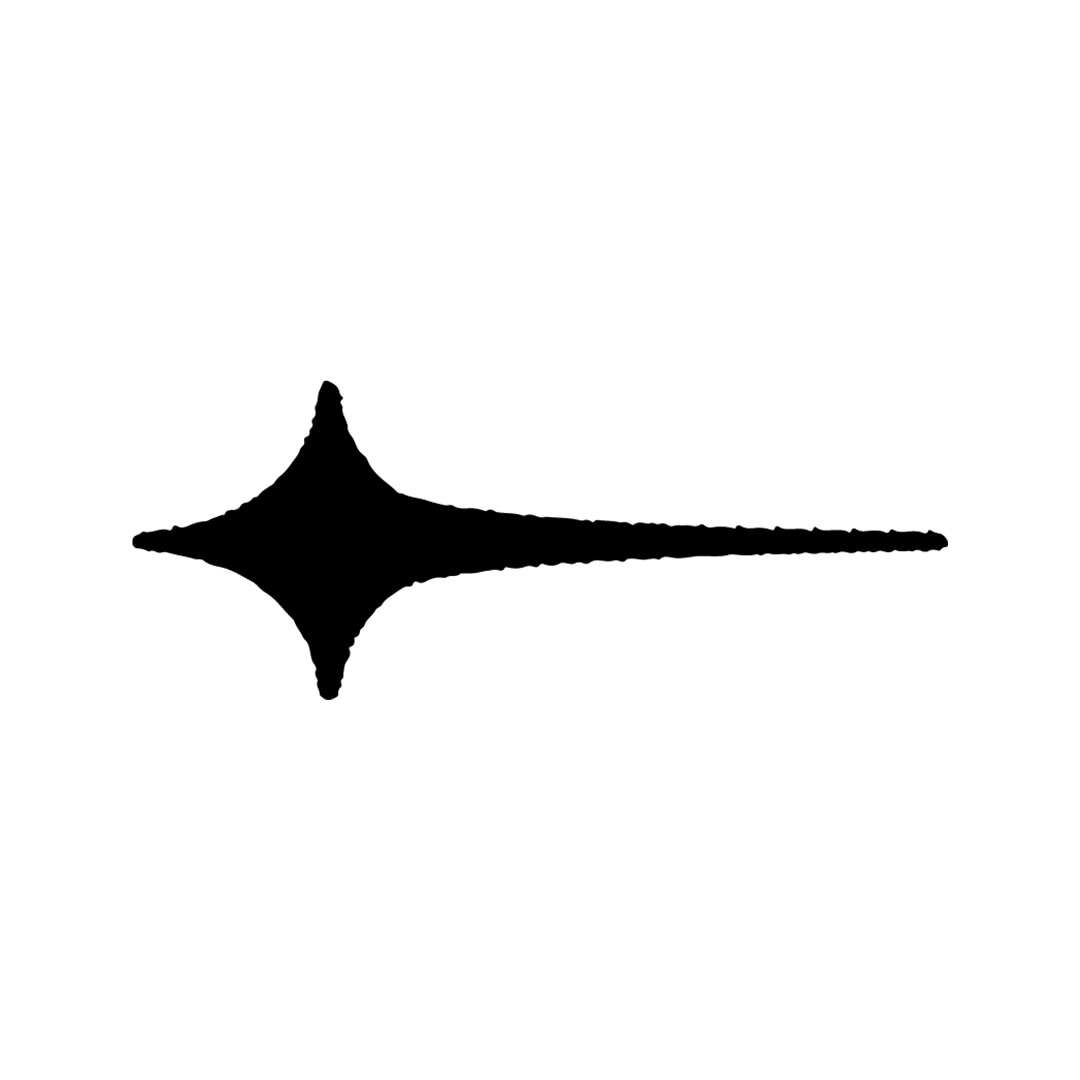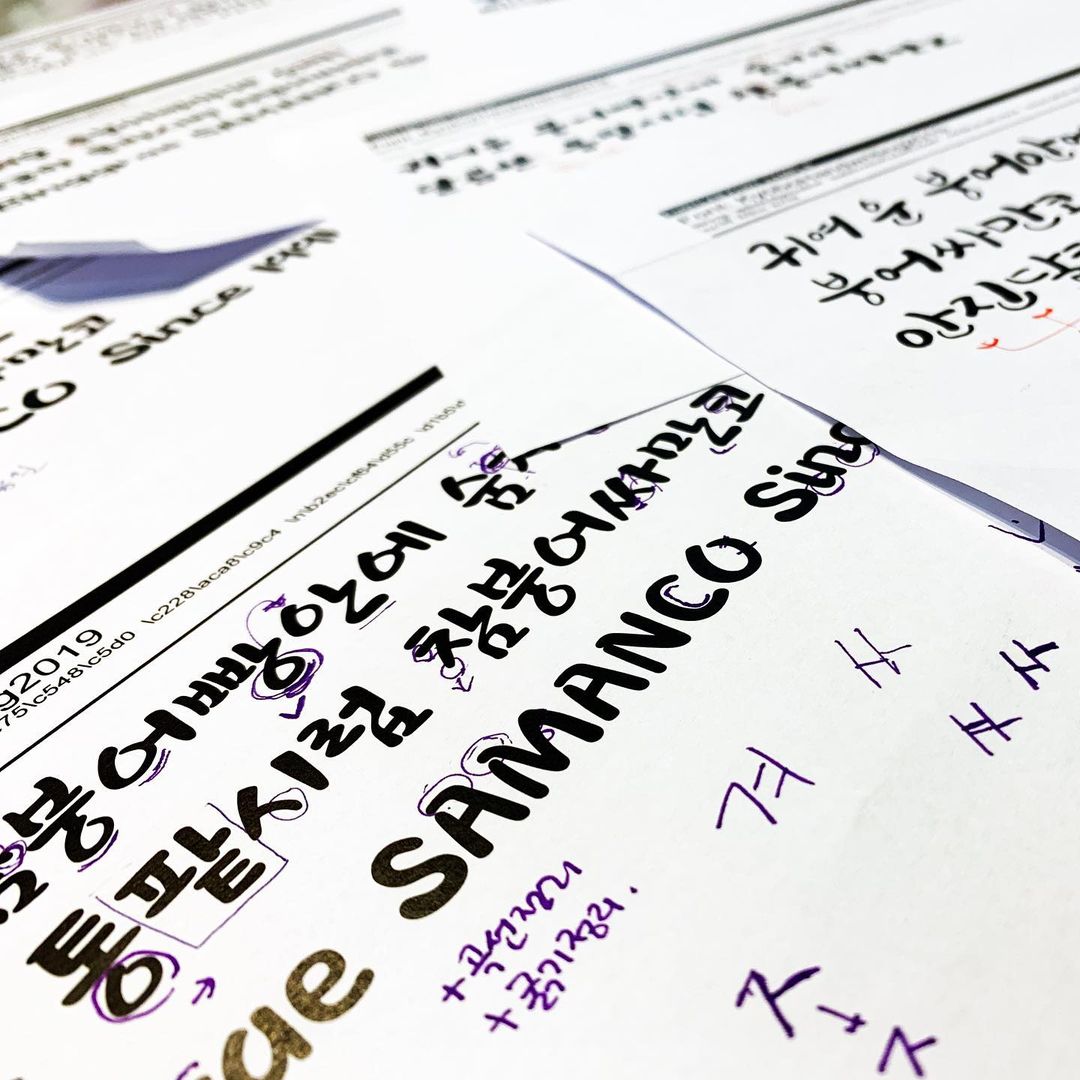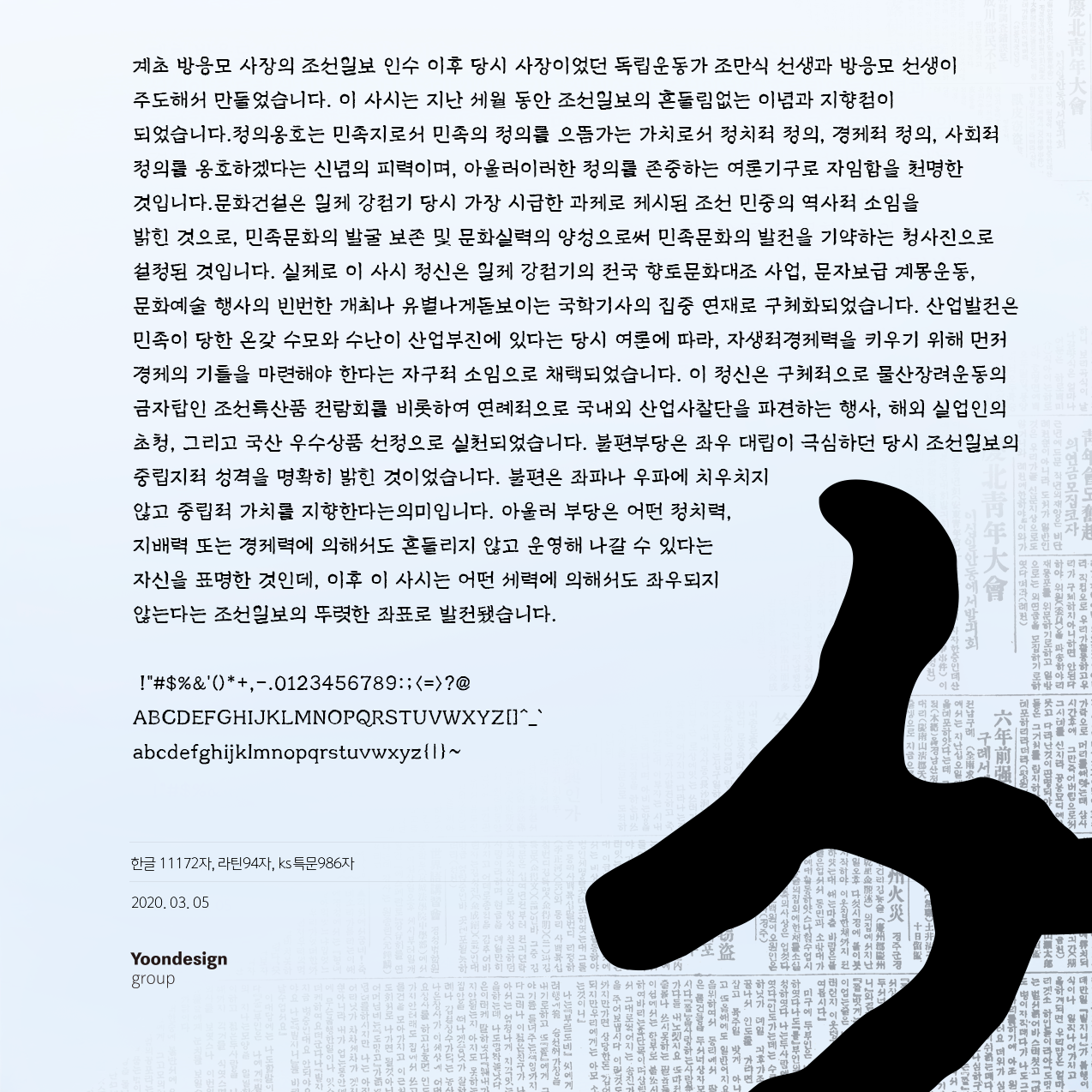interVIEW / afterVIEW 인터뷰(interview)는 말 그대로 서로(inter) 보는(view) 일이다. 서로 보는 일이나, inter-see가 아니라 inter-view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터뷰는 책, 기사, 영상 등 ‘인터뷰 콘텐츠’를 전제로 한 서로―보기다. 인터뷰 자체를 콘텐츠 제작 과정의 일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콘텐츠에는 기획 의도가 있으므로, 콘텐츠를 위한 만남과 대화는 어느 정도 기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인터뷰 또한 그렇다. 인터뷰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보다, 관점과 관점의 상호작용이다. 즉, view와 interaction의 결합이다. 『타이포그래피 서울』은 2011년 창간 이후 국내외 디자인계 인물 약 300명을 인터뷰했다. 타입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설치미술가, 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 어느 날 문득, 그들의 인터뷰 이후가 궁금해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view를 재확인해보고 싶었다. 지금쯤 그들은 어떤 위치와 어떤 view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을지. 지금의 view에 새로운 interaction이 더해지면 어떤 interview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들과 다시 서로―보기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다. 연재 코너 [인터뷰/애프터뷰]를 마련한 까닭은. 특별한 기획의도는 없다. 다만, 그들을 다시 보고 싶었다는 것 외에는.
interVIEW in 2012
[‘기록’보다 ‘기억’을 믿는다], [한국인 디자이너로서의 딜레마 극복], [나 자신과 거리 두기]. 2012년 그래픽 디자이너 신동혁의 인터뷰를 구성했던 소제목들이다. 모두 그의 말을 인용한 것들이다. 9년 전의 신동혁은 디자이너로서의 ‘나’를 엄밀히 규정(規定: 어떤 것의 성격, 내용, 의미 등을 밝혀 정함)해보는 데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였던 듯하다. 그런 그의 천착의 연장선 위에 『타이포그래피 서울』과의 인터뷰가 위치해 있지 않았을까도 싶다.
“메모를 하는 대신 내 기억 속에 보존된 생각들을 꺼내곤 한다”, “내가 밟아온 문화적 토대에서, (···) 새로운 작업적 문법을 개발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내가 디자인 작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맥락’이다. 맥락 유지하기. (···) 맥락 유지란, 자기 작업의 ‘객관화’ 혹은 ‘거리 두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 같은 그의 말들은 스스로에게 한 약언이었는지도 모른다. 에디터가 이런 사후적 인상을 갖게 된 근거는 9년 만에 다시 만난 신동혁, 신동혁 자체다.
afterVIEW in 2021
두 번째 인터뷰는 9년 전 신동혁의 발언―에디터가 사후적으로 ‘신동혁의 엄밀한 자기 규정’으로 여기게 된 몇몇 말들―을 재차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신동혁의 답변은 에디터로 하여금 앞서 언급한 ‘사후적 인상’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기 충분했다. 다소 낯간지러운 말이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신동혁은 “그때(9년 전) 품었던 의심이나 호기심을 놓지 않고 꾸역꾸역 끌고 온 것이 지금의 인터뷰도 성사시키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의역해보는 건 어떨까. 2012년의 ‘나’를 2012년에만 두지 않고 2021년까지 끌고 온 것이 지금의 ‘나’ 아닌가 싶다, 라고 말이다.


2012년에 서울 광장동 작업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었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제 기억도 선명하지는 않아서, 인터뷰 기사와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그래픽 디자이너 신동혁’에 대한 첫인상을 복기해야 했습니다. 긴 머리, 낮은 음성, 적은 말수, 창문 너머 한강과 철교가 멀리 내다보였던 작업실, 퍽 많이 꽂혀 있던 책들, ··· 같은 조각들을 모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기사에서 “굳이 메모를 하는 대신 기억 속에 보존된 생각들을 꺼내곤 한다”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는데, 9년 전 『타이포그래피 서울』과의 만남도 신동혁의 어딘가에 흐릿하게나마 “보존”이 되어 있었기를 바라봅니다.(웃음)
2012년과 2021년을 놓고 보면, 역시 가장 큰 변화는 그래픽 디자이너 신동혁·신해옥이 함께하는 스튜디오 ‘신신’ 아닐까 합니다. ‘무려 9년간 어떻게 지내셨어요?’라는 장엄한(?) 질문 대신, 신신을 오픈한 계기를 여쭤보는 것으로 오랜만의 인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학부생 시절 TW(Typography Workshop)를 할 때부터 해옥 씨와 연애와 협업을 병행해왔던 것 같습니다.(웃음) 그 경험들을 통해 훗날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물론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금방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1년 학부 졸업 후 저는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이너로, 해옥 씨는 디자인 에이전시 직원으로 각자 커리어를 쌓았죠. 그러다 2014년 5월 결혼과 동시에 ‘신해옥·신동혁’이라는 이름으로 듀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신신’은 주변 분들이 저희 두 사람을 부르는 호칭인데, 스튜디오명에 그대로 사용하게 됐네요.



디자인: 신신
“일종의 문화적 콤플렉스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픽 디자인이란 게 서양에서 수입된 거잖아요. (···) 얼마 전에는 유학파 디자이너들이 많아지다 보니 로마자 타이포그래피가 주류가 되고 한글은 등한시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이런 딜레마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디자이너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제가 밟아온 문화적 토대에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선에서 새로운 작업적 문법을 개발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신신이 디자인한 책 『Feuilles』가 독일 북아트재단(Stiftung Buchkunst: 영역하면 ‘Book Art Foundation’, 우리말 독음은 ‘슈티푸텅 북쿤스트’)의 국제 북디자인 시상식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Schönste Bücher aus aller Welt)」에서 최고상인 ‘황금 활자(Golden Letter)’를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식을 접하고 저도 부랴부랴 ‘더 북 소사이어티’(『Feuilles』를 발행한 출판사 ‘미디어버스’가 운영하는 서점)에서 어렵사리 3쇄본을 구했네요.
엄유정 작가의 식물 그림 112점이 A·B·C·D 4개 섹션으로 분류돼 있고, 각 그림들은 단면 인쇄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섹션 구분의 기준은 아마도 그림의 결(이를테면 채색/무채색)과 식물의 종(種)에 따른 듯합니다. 섹션마다 종이의 종류가 다른데, 저는 특히 무채색 드로잉 작품들이 실린 A 섹션의 종이 재질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얇아서 속이 다 비치더군요. 이 페이지의 식물과 저 페이지의 식물이 중첩되는 이미지가 신비로웠어요. 앞면에선 선명했던 식물이 뒷면에선 희미한 상으로 비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식물의 내밀한 뒷모습을 훔쳐보는 기분이랄까, 식물의 영혼을 목격한 것 같달까. 페이지를 쓰다듬을 때 어떤, 정체 모를 관능미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보는 이들을 촉각의 여정으로 인도한다(take the viewer on a haptic journey)’라는 독일 북아트재단의 심사평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육식물 중에는 곤충처럼 탈피를 하는 종들도 있다고 하던데, 『Feuilles』가 마치 그런 종 같기도 합니다. 읽고 사유하게 하는 매체에서 만지고 느끼게 하는 사물로 책의 육체가 바뀐 느낌이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디자이너 신동혁의 9년 전 말, 그러니까 “내가 밟아온 문화적 토대에서 가능한 한 새로운 작업적 문법을 개발해보고 싶다”라는 과제는 성실히 이행되어온 것 같다고요. 『Feuilles』만 놓고 본다면, 제가 일개 수용자로서 느낀 디자인 문법은 ‘만져지는 시각성(touchable visuality)’이라 표현하고 싶네요.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디자이너 신동혁(혹은 ‘신신’)은 어떤 ‘문법’에 천착하고 있나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다만, 9년 전의 제 말은 당시 경험과 요령이 없었기에 좀 피상적으로 떠올렸던 각오였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조금씩 구체적인 단서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밟아온 문화적 토대”라는 건 어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태도로 고쳐 생각하게 되었고, “가능한 한 새로운 작업적 문법을 개발해보고 싶다”는 건 기존 디자인 양식이나 기법 등이 놓친 새로운 조합이나 생경한 접목 등을 통해 다채로운 비평적 가능성을 열어본다, 라는 목적성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 맥락과 관련해서는, 신해옥 씨의 2020년 프로젝트 〈Gathering Flowers〉에 독립 협업자로 참여했을 때 사용한 제 약력이 부연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신동혁: 그래픽 디자이너.
신해옥과 함께 2014년부터 ‘신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나 양식, 관습, 전통, 이론 따위를 재료 삼아서
‘지금, 여기’라는 맥락에 걸맞은 결과물로 갱신해내는 방식을 고안하는 데 관심이 많다.
요즘은 ‘그래픽 디자인이 결국 이미지 생산과 유통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체와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결 짓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좀더 설득력 있고 생명력이 강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놓일 매체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사유하게 되는 거죠. 망상 같지만 ‘소프트웨어/영혼/내용 등’과 ‘하드웨어/영매/형식 등’의 생경하면서도 수긍되는 결합을 꿈꾸기도 해요. 엄유정 작가의 책 『Feuilles』도 그런 고민의 결과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독일 북아트재단 유튜브



신신에서 ‘화원(花園)’이라는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지요? 타 매체와 가진 최근 인터뷰를 읽어보니 책 만듦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에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책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다시 책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최근 들어 자문해보는 질문입니다. 잠정적으로 내린 답은 ‘책이 책으로만 기능하던 시대는 끝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책이 지녔던 강력하고 상징적인 역할은, 이제 책 이외의 다양한 매체들과 연결된 공유 속성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 앞에 과거의 책처럼 강력하고 상징적인 무언가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죠. 한 군데에만 몰아서 위치시키기보다는, 다채널에 걸쳐 분산하고 각 채널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원’이라는 임프린트를 통해, 책을 물리적 공간이나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수많은 온라인 채널을 잇는 매개체 역할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책을 비롯한 그 어떤 매체든 완결형으로서 또는 완전무결한 성질로서 고정돼 있는 건 없죠. 시대 변화 등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은 달라질 수 있고, 각 매체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저희(신신)는 현 시점에 걸맞은 책을 좀더 급진적으로 실험해볼 수 있는 창구로서 ‘화원’을 활용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책 자체에 주목한다기보다는 책을 하이퍼링크처럼 여러 채널을 연결 짓는 수단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창구로서 ‘화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기획 프로그램 〈미술책방 다시 보기〉 중 하나인 ‘윈도우 프로젝트’,
3차원 공간을 2차원 인쇄물로 재해석한 설치 작업, 2020
〈미술책방 다시 보기〉는 미술책방이 연 4회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하는 아티스트 컬래버레이션 행사다.
일종의 미니 전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설치 작업으로 서점 내부가 꾸며진다.
2020년 1차 행사의 주제는 ‘공간 다시 보기’였고, 신신을 비롯하여 조각가 허산,
킴킴갤러리[미술가 김나영과 그레고리 마스(Gregory Maass)가 운영하는 전시기획 그룹]가 참여했다.

“제가 디자인 작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맥락’이에요. 맥락 유지하기. 맥락을 유지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통회화 작가의 도록을 디자인하는 데 굉장히 전위적인 레이아웃을 사용했다면, 그건 맥락을 놓친 거라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로서의 표현 욕구는 반드시 맥락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맥락 유지란, 자기 작업의 ‘객관화’ 혹은 ‘거리 두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9년 전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9년 후의 신동혁이 ‘디자인 작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맥락’일지, 혹은 다른 무언가일지?
큰 틀에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만, 매개하는 단어는 바꾸고 싶네요. ‘맥락’을 ‘조화’로 말입니다. ‘맥락’이 논리적 관계 자체에만 기인하는 것이라면, 조화는 그러한 관계(들) 사이사이 여러 변수들의 개입 여지까지 전제하는 개념이니까요. 9년 전의 ‘맥락’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 작업들도 계산대로 맥락대로 짜인 것들보다는, 의외성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것들이더라고요.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관계들이 상충되는 걸 경험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적 도시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뒤죽박죽 혼재된 도시가 제게는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도 그렇고 앞서 『Feuilles』를 얘기할 때도 제가 ‘자연스러움’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모두 ‘조화’라는 큰 단어와 관계된 저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축가 정현을 중심으로 하는 ‘초타원형 갤러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구 제작소 ‘스탠다드에이’ 서교 쇼룸에서 열렸다.
왠지 어거지 접점 같은데··· 2012년에도 2021년에도 신동혁은 디자이너고, 저는 『타이포그래피 서울』 에디터네요. 이 맥락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오래도록 그대로이길 바라는 것’, ‘언제가 됐든 부디 달라지기 바라는 것’을 꼽아본다면···.
공교롭게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인터뷰하는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2012년에는 운 좋게도 좀 눈에 띄는 루키로 조명받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품었던 의심이나 호기심을 놓지 않고 꾸역꾸역 끌고 온 것이 지금의 인터뷰도 성사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걸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최대한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은 언젠가 익숙한 것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랬고 해옥 씨도 그랬는데, 무언가에 쉽게 싫증 내고 질려 하는 편이었습니다. 작업을 할 때도 이런 기질이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시간을 어느 정도 이겨내는 작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걸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태도를 오래도록 유지한다는 일은 어느 정도 개인 의지의 소산인 것 같네요. 그렇다고 또 억지스럽게 유지하고 싶지는 않고요.
달라지기 바라는 것이라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관계로, 지난 2년간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을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보고 말았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