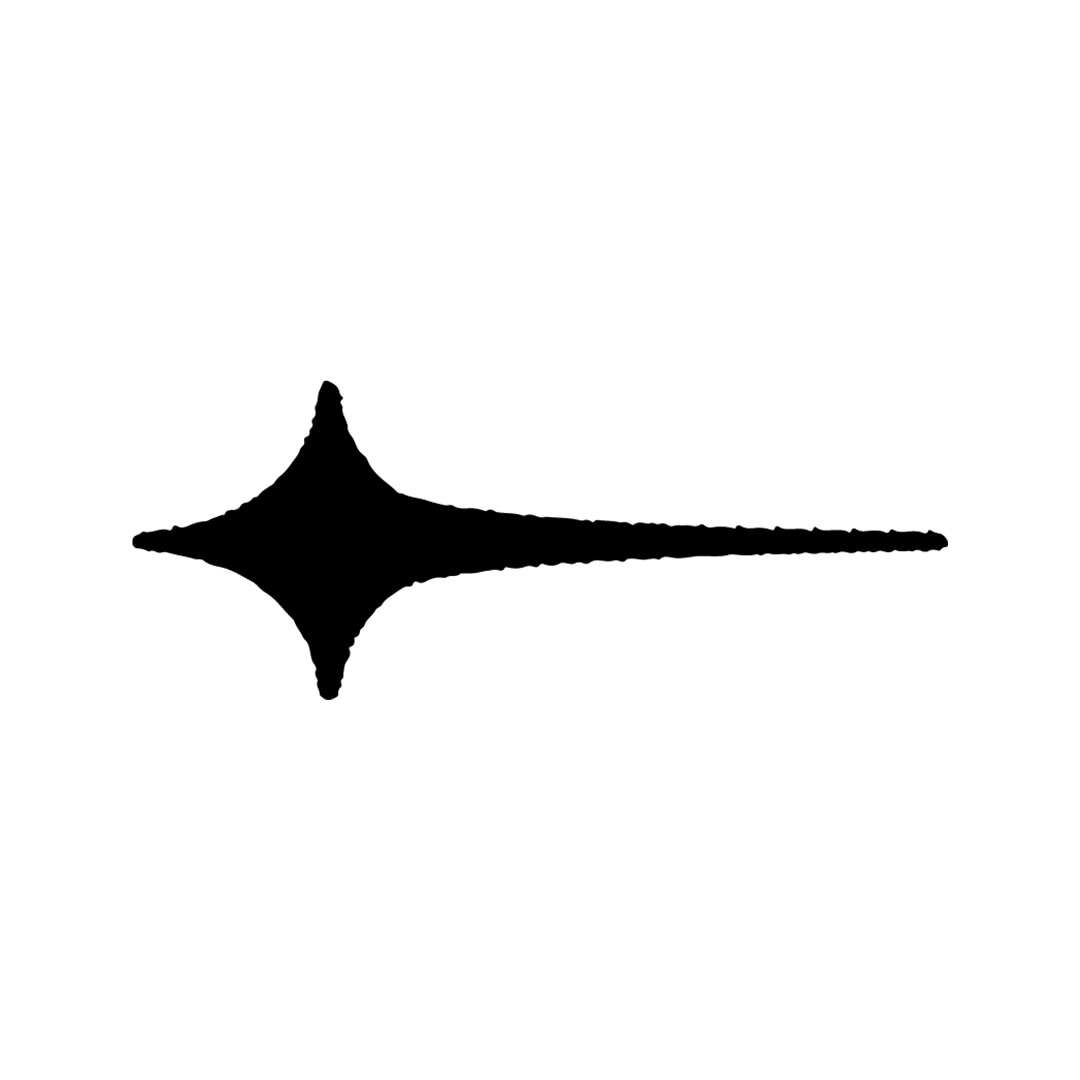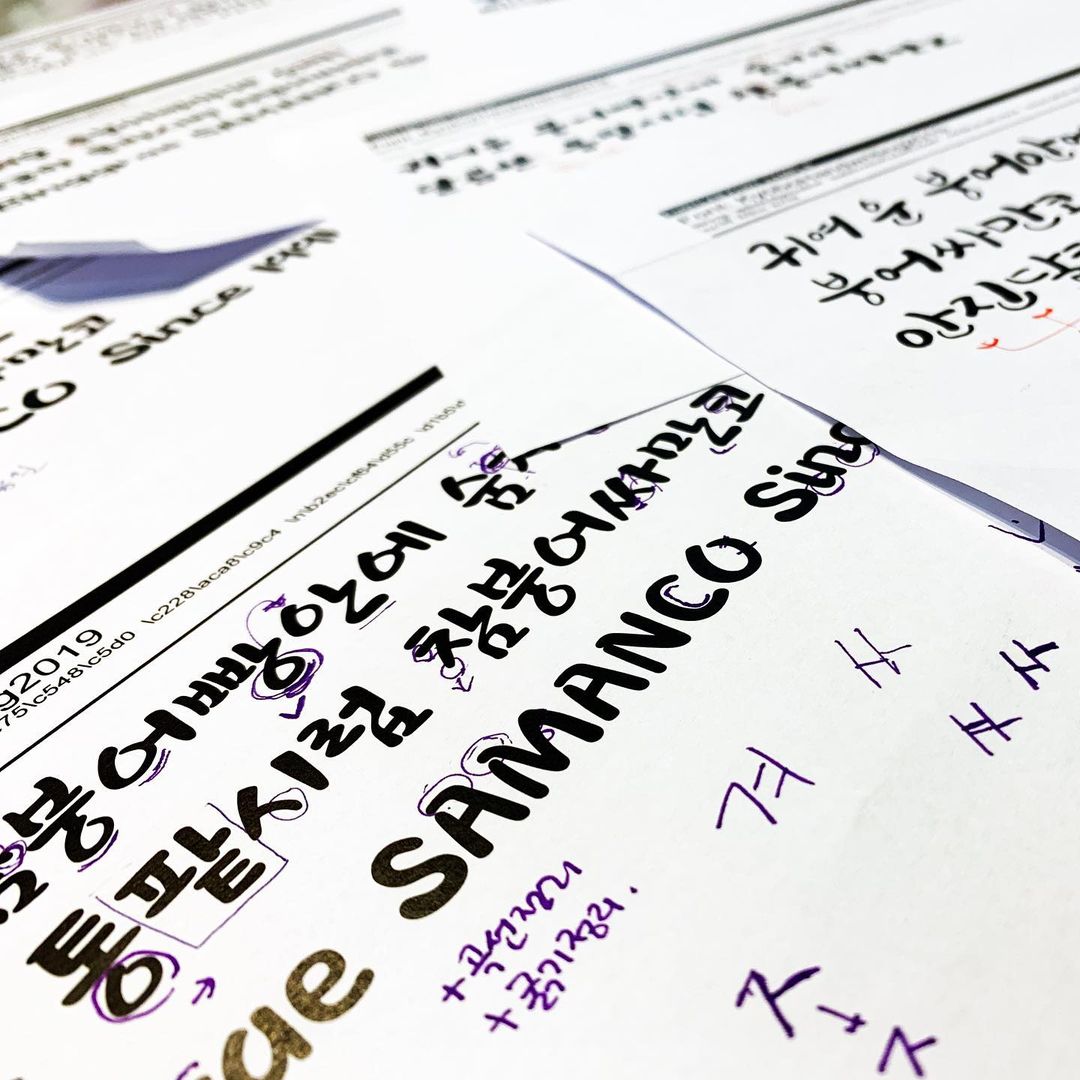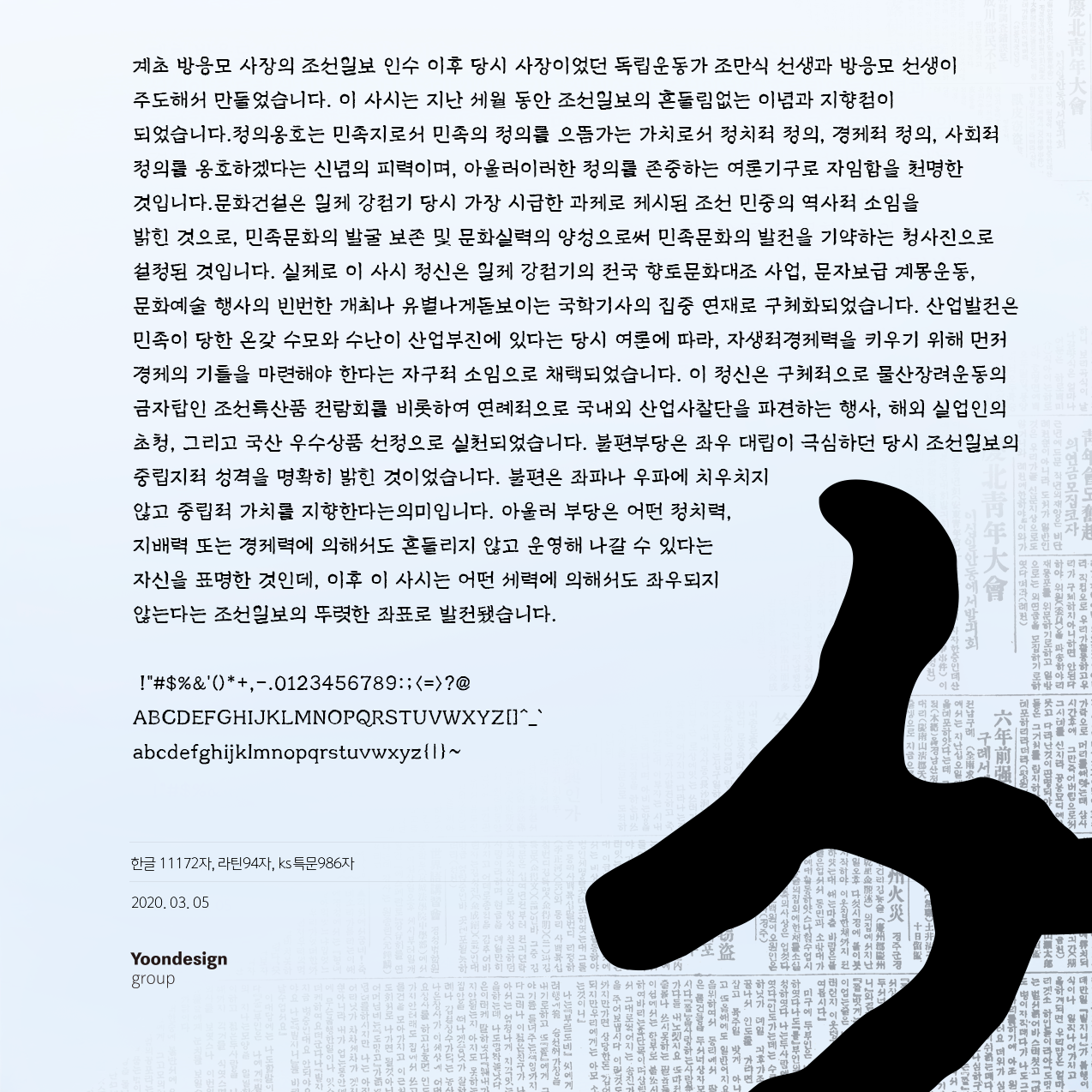타입 디렉터즈 클럽(Type Directors Club, TDC)은 반세기를 넘긴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타이포그래피 단체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뉴욕에는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발달하는 상업문화에 기여하는 자신감 넘치고 창의적인 아트 디렉터들의 시기가 있었다. 광고, 출판, 신문·잡지·방송 등 대중매체, 막 태동하기 시작한 기업의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등에서 활자와 이미지의 전달력을 확인하고 이 분야를 키우기 위한 디자이너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들이 TDC의 씨앗이 되었다. 초기 TDC의 멤버들은 폴 랜드(Paul Rand), 아론 번즈(Aaron Burns), 허브 루발린(Herb Lubalin), 브래드 배리 톰슨(Bradbury Thompson)등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디자인의 역사에 있어 빛나는 이름들이다.
TDC의 공시된 목표는 “타이포그래피의 수준과 관련분야의 수준을 높인다.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자극, 영감을 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활자의 사용과 관련된 물질에 관한 지식을 모으고 전파한다.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들과 협력한다.”이다. TDC는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행사로 국제 타이포그래피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출판물로 완성하여 전 세계에 공개함으로써 단체의 목표를 매년 거르지 않고 잘 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단체는 관련 행사로 매년 7회에 걸친 순회 전시를 운영하는데 2012년, TDC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시가 열리게 되었다. 전시 장소인 삼원페이퍼 갤러리에서 타입 디렉터즈 클럽의 캐롤 왈러(Carol Wahler)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TDC에서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의 역할은 무엇인가?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모두 관여한다. 운영위원회(board)와 협회 회장(president)과 함께 연간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순회 전시의 책임은 많은 일들 중 하나이다. 디자인계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들과 회장은 임기가 2년인데 비해 나는 1984년부터 일해 왔으며 올해가 29년째이다.
당신이 바로 TDC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생각이 든다.
맞다. 나는 TDC의 모든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 접근 가능하다. 옛 자료들 중에는 지금은 전설이 된 디자이너들의 공모전 수상작 등이 있다. 얼마 전 이제는 노인이 된 한 회원이 자기가 입회할 때 받았던 두 장의 추천서가 허브 루발린과 아론 번즈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혹시 이 추천서들을 찾아줄 수 있느냐고 했다. 이들을 자료실에서 찾아 복사본을 보내 주었더니 그 회원은 감동했다.
발표 자료를 보니 1998년에 회원수 500명에서 올해는 1,000명이 넘었다. 지난 10여 년 사이 급격한 회원 수 증가의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다. 이 새로운 매체에 사람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글과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본다. 글자로 전달하는 기술이자 시각 예술인 타이포그라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TDC 멤버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회비만 내면 된다(웃음). 예전에는 회원이 되려면 심사를 거쳐야 했다. 두 통의 추천서, 몇 개의 작품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그런데 1998년, 유명한 타입 디자이너인 에드 벵깃(Ed Benguiat)이 회장으로 있을 때 이런 관문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는 협회의 문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공모전과 출판 외에 어떤 활동을 하나? 학생 멤버들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있나?
세미나와 워크샵 등 교육 행사가 중심이 된다. 매달 셋째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세미나가 열린다. 정기적인 세미나 외에도 뉴욕에 들르는 저명한 디자이너들을 놓치지 않고 수시로 세미나가 열린다. 바로 얼마 전에는 프랑스의 타입 디자이너 장 프랑스와 포르쉐(Jean Francois Porchez)의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학생들은 회비가 저렴한 것 외에 모든 행사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다. 뉴욕 웨스트(West) 36가에 있는 TDC의 공간에는 이같은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학생과 현업 디자이너, 연사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리고 정보를 교환한다. 뉴욕은 워낙 다문화 환경이라 폰트 디자인 워크샵 중 정기적으로 그리스 문자나 아라비아 문자 디자인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전체 회원 가운데 해외 회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
해외 회원도 많다. 25퍼센트 정도는 해외 회원이다.
TDC 회원들의 활동을 보니 대부분 뉴욕이라는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의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해외 회원들은 이를 누리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얼마전부터 웹캐스팅(Web casting)을 시작했다.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세미나 등 교육 콘텐츠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부에 있는 한 회원은 웹캐스팅으로 자기 학생들과 함께 세미나를 들었고 교육 효과를 크게 봤다고 하더라. 실시간 화상 회의 등은 점점 더 협회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독일의 저명한 디자이너 에릭 슈피커만(Erik Spiekermann)이 참여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와의 회의를 위해서라도 화상 회의가 더욱 활성화 될 것 같다.
TDC가 미국의 다른 디자이너 단체, 즉 AIGA(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 SOTA(the Society of Typographic Aficionados)등과 차별화 되는 점은 무엇인가?
AIGA는 훨씬 규모가 크다. 그러나 그래픽디자인의 기본은 타이포그래피가 아닌가? 우리는 핵심적인 분야의 신장에 집중하고 있는 단체다. SOTA는 타이포그래피 단체로 우리와 목적하는 바가 같다. 우리의 주요 행사가 공모전과 출판인 데 비해 SOTA는 TypeCon이라는 컨퍼런스 운영에 집중한다. TDC의 운영 목표 중 하나는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TypeCon을 후원하고 컨퍼런스가 열리는 장소에서 TDC 수상작 전시를 하고 있다.

TDC 국제 공모전은 타이포그래피 분야와 타입 디자인 분야, 또 얼마 전 추가된 영화 타이틀 디자인을 조명하는 TDC 인트로(Intro)가 있다. 그중 타입 디자인 공모전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이는 미국 유일의 타입 디자인 공모전인가?
타입 디자인 공모전은 TDC²(스퀘어드)라고 하며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CA』 잡지사에서, 또 AIGA에서도 폰트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역사와 규모, 수준면에서 타입디자인 분야 최고의 국제 공모전은 일본의 모리사와 공모전과 TDC²라고 자부한다.
공모전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매 해 공모전 수상작의 경향은 그 해의 심사위원 그룹의 배경과 성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TDC 연감을 보면 심사위원장이 8명의 디자이너를 선택하여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이 심사위원장은 어떻게 선출이 되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심사위원장은 30년이 넘는 공모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중복되지 않고 매년 새로운 사람이 선출되었다.
그런 방식이라면 TDC 심사위원장은 현장의 선수들 사이에서는 꼭 한 번 써 보고 싶은 감투가 되겠다.
그렇다. 하지만 한 해 맡아 운영하고 나면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을 것이다(웃음). 심사위원이건 운영위원이건 모두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맡는 직책이다. 모두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고 시간을 쪼개어 자원봉사하는 것이다.
심사와 전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우리는 비영리 단체라서 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당분간은 고마운 인연으로 프랫 미술대학교(Pratt Institute)의 맨하탄 빌딩에서 심사를 할 것 같다. 여러 개의 교실을 활용하여 작품을 깔아놓고 심사위원들이 교실을 이동하며 심사한다. 전시는 허브 루발린 연구센터가 있는 쿠퍼 유니온 대학(Cooper Union)의 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순회 전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매년 7회를 기획하는데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열리고 해외에도 나간다. 디자인이 발달한 해외 거점 도시들에 연계 사무실이 있고 이들과 계획한다. 독일에는 구텐베르크 북 페어 등에 참여하는 등 거의 매년 전시계획이 있다. 일본에도 매년 가는 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쿄 TDC와는 한 번도 교류가 없었다. 올해는 한국에서의 전시 후에 가을에 홍콩에서 열리는 ATypI(Association Typographique Internationale)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TDC 전시가 있을 것이다.
전시물의 이동과 전시를 혼자 하는 것 같은데, 힘겹지 않은가?
이제는 베테랑이다. 수상작을 커다란 하나의 트렁크에 꾸린다. 다들 내가 나타나면 “커다란 검정 트렁크(big black case)는 어디 있나?” 한다. 30x40x12인치의 가방에 책자들을 잘 꾸리고 웬만한 크기의 포스터는 말아서 대각선으로 넣는, 나만의 가방 꾸리는 방법이 있다. 전시 오프닝 하루 전에만 도착하면 전시도 문제 없다. 전시 기간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상작은 7개를 받아야 한다. 몇 년 전에는 ‘클록투(QlockTwo)’라는 디지털 시계의 타이포그래피가 상을 받았는데 3개가 하나의 세트였다. 고가의 시계를 일곱 세트 받을 수 없어서 이 경우에는 사진을 전시했다.

TDC에서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0년에는 이화여대에 다니는 한국학생도 장학금을 받았더라. 장학생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TDC는 뉴욕이 본산지이다. 따라서 장학금은 창의적인 학생들이 많이 모인 뉴욕의 디자인 학교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매년 6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프랫, 파슨스(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SVA(School of Visual Art), 쿠퍼 유니온에서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고 그 외의 미국에 있는 학교 하나, 해외 학교 하나를 선정하여 학생을 추천받는다. 당연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학교가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의 수상과정이나 수상작에서 특별히 언급할 것이 있는가?
올해부터 공모전 지원 방식에 실물 제출이 어려울 경우 파일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운영위원중 웹디자이너의 영향으로 변화가 시도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만족했다. 스크린으로도 우수한 타이포그래피를 알아 보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이는 디자인 결과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 않은 디자이너나 작품 제작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학생 지원자들에게 지원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TDC의 목표 중 그 첫 번째 것이 “타이포그래피의 수준과 관련 분야의 수준을 높인다”이다. 그런데 디자인 분야의 수준을 높이려면 디자인을 발주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동시적으로 필요하다. 윤디자인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타이포그래피 서울』의 목표도 전문가를 넘어서서 일반인에게 까지 타이포그래피를 친숙한 주제로 알리는 것이다. 일반인의 교육을 위해서 TDC는 어떤 노력을 해왔나?
우리가 이제까지 해 온 모든 것이 전문가를 넘어서서 일반인에게까지 타이포그래피라는 예술이자 기술을 알리는 노력이었다. TDC 사무실이 있는 뉴욕은 패션 업계가 주로 포진해 있는 지역이다. 나는 전시나 세미나가 있을때 이웃들을 초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타이포그래피라는 영역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타입이 있지 않나. 직물의 패턴에도, 식품의 패키지 디자인에도, 영화를 볼 때도 타이포그래피를 경험한다. 남편과 나는 히치콕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 히치콕의 초기 영화 중 하나인 무성영화를 보게 되었다.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또 대사를 읽으면서 대사의 타이포그래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모든 우리의 경험에 타이포그래피와의 접면이 있다.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부분의 타이포그래피에서부터 차근 차근 소개해 나간다면 교육의 도구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본 적이 있는가? 시각적 인상이 어떤가?
물론 본 적이 있지만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식품 패키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동안 꼭 한 번 편의점이라도 들러서 한글의 다양한 인상을 접해보길 바란다.(웃음)
왈러 사무총장은 네 명의 손주가 있다고 자랑했다. 아이들을 훌륭히 성인으로 성장시킨 일하는 여성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딸이 18세가 되었을 때 일을 시작했다면서 남들과는 거꾸로 인생을 살았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한다고 했다.
유서 깊은 타이포그래피 단체의 사무총장과 한 시간 가량 인터뷰를 하는 동안 협회의 한 해를 구성하는 여러 행사들이 상세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동시에 빠듯이 꾸려내야 하는 비영리 단체의 고단함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매년 도서관에 등장하는 고급 인쇄된 TDC 타이포그래피 연감(Typography Annual)의 이면에 많은 사람들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노고가 있었다는 것이 대조적이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고 부러웠던 것은 1946년에 정한 협회의 목표가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은 변했을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흔히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개인이건 단체건 일의 시작에 있어서 ‘초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시작이며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늘 그 ‘초심’에 비추어보며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영속의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