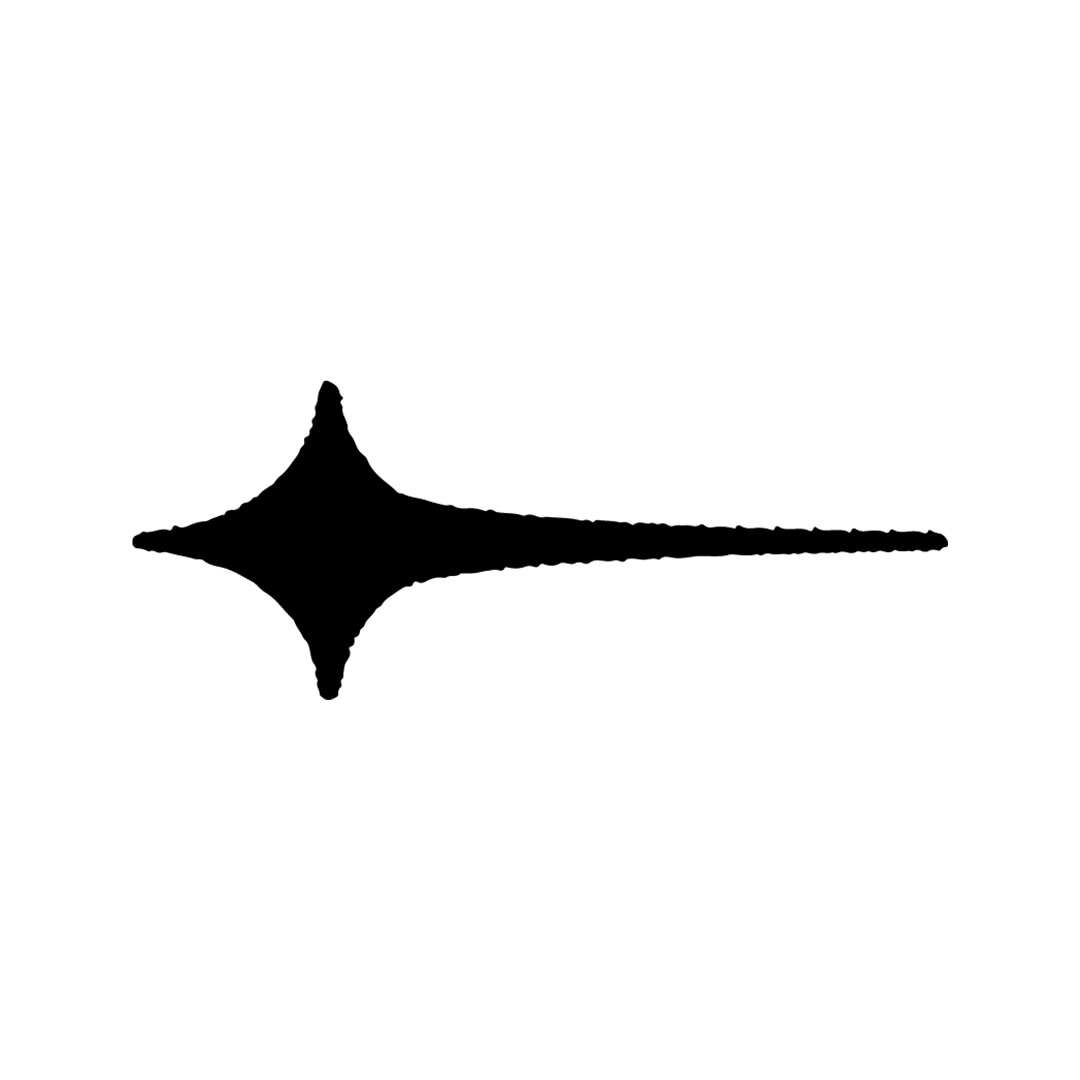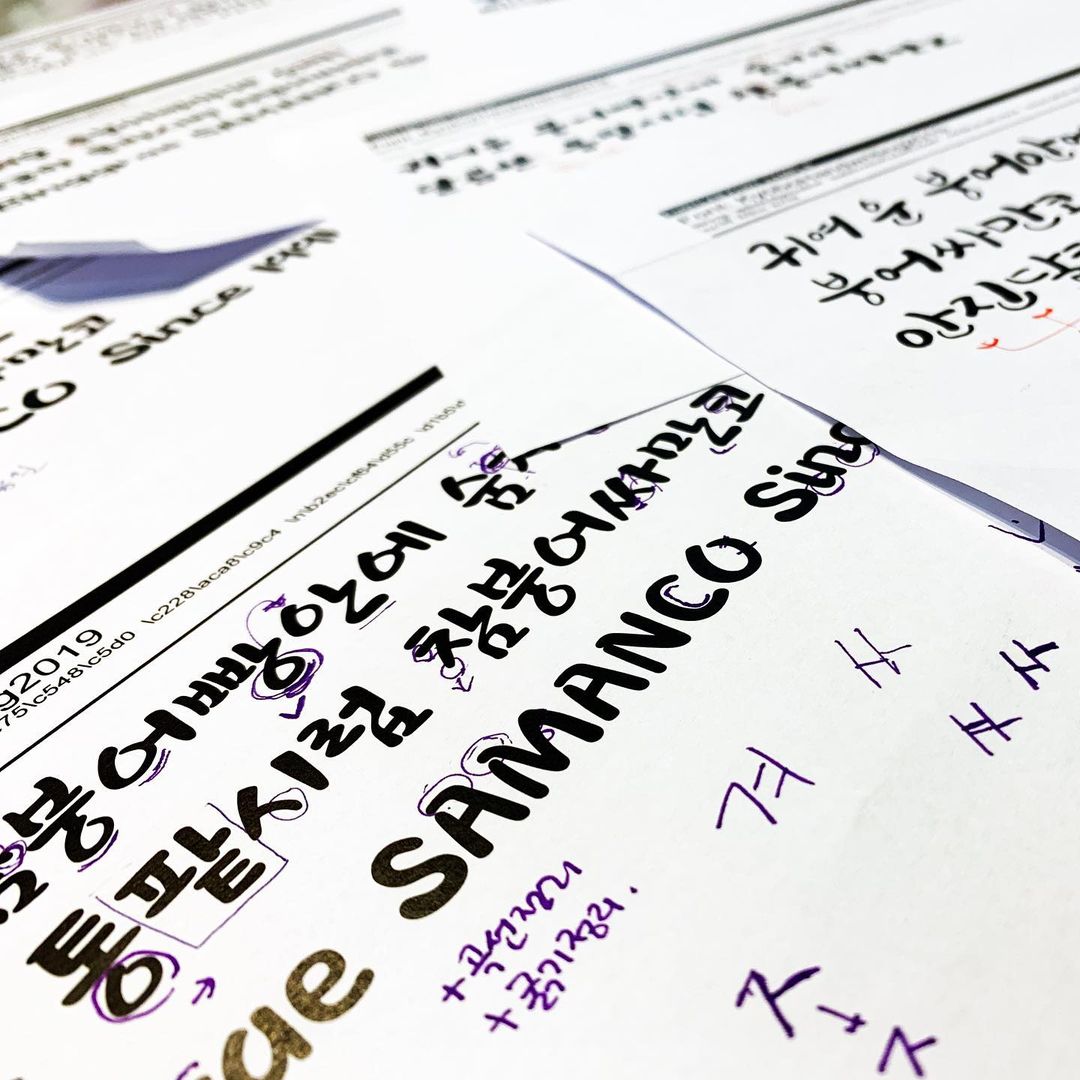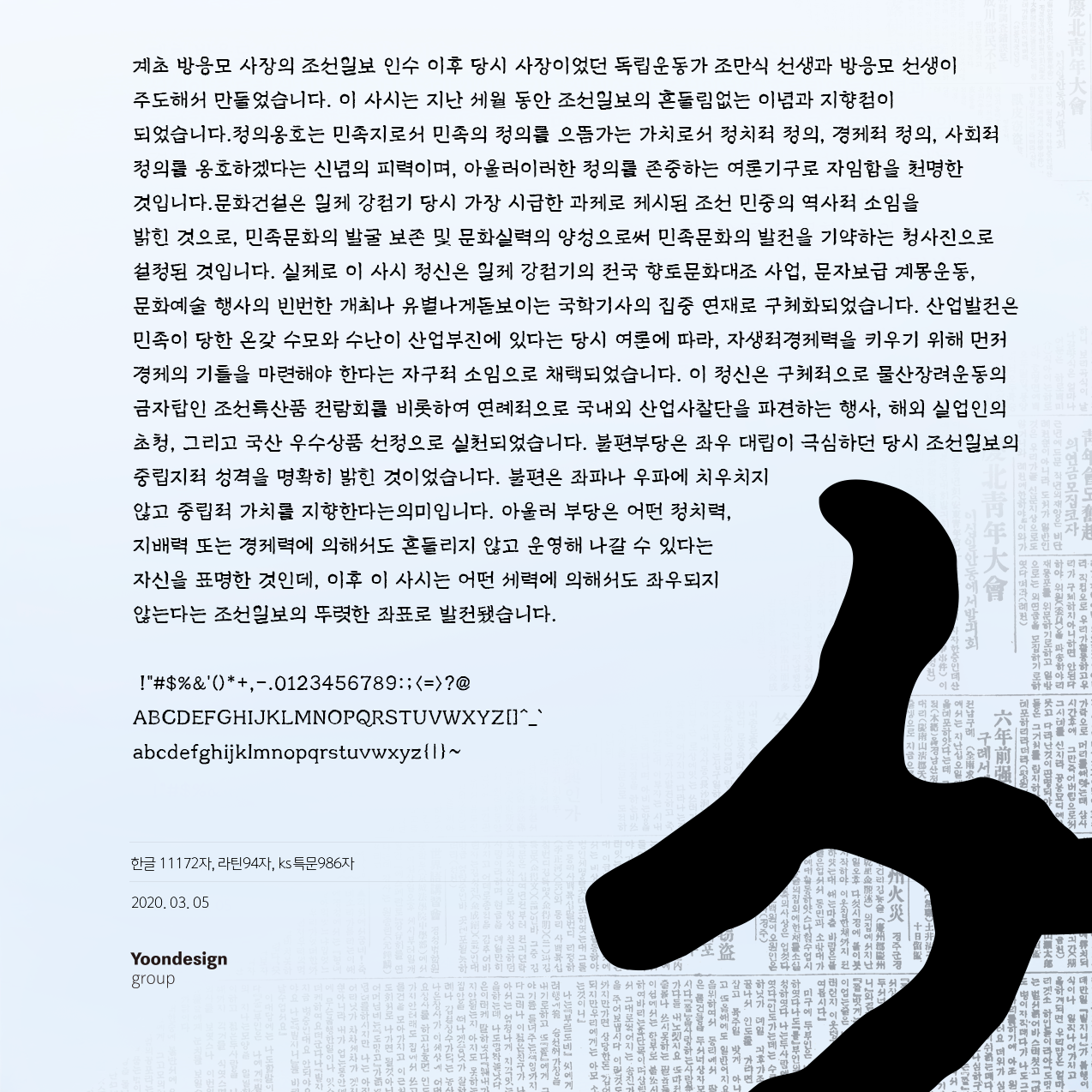interVIEW / afterVIEW 인터뷰(interview)는 말 그대로 서로(inter) 보는(view) 일이다. 서로 보는 일이나, inter-see가 아니라 inter-view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터뷰는 책, 기사, 영상 등 ‘인터뷰 콘텐츠’를 전제로 한 서로―보기다. 인터뷰 자체를 콘텐츠 제작 과정의 일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콘텐츠에는 기획 의도가 있으므로, 콘텐츠를 위한 만남과 대화는 어느 정도 기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인터뷰 또한 그렇다. 인터뷰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보다, 관점과 관점의 상호작용이다. 즉, view와 interaction의 결합이다. 『타이포그래피 서울』은 2011년 창간 이후 국내외 디자인계 인물 약 300명을 인터뷰했다. 타입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설치미술가, 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 어느 날 문득, 그들의 인터뷰 이후가 궁금해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view를 재확인해보고 싶었다. 지금쯤 그들은 어떤 위치와 어떤 view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을지. 지금의 view에 새로운 interaction이 더해지면 어떤 interview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들과 다시 서로―보기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다. 연재 코너 [인터뷰/애프터뷰]를 마련한 까닭은. 특별한 기획의도는 없다. 다만, 그들을 다시 보고 싶었다는 것 외에는.
interVIEW in 2014
2014년 인터뷰 때 조규형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었다. 현지 예술학교인 콘스트팍(Konstfack)에서 ‘Storytelling’ 분과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소규모 1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었다. 그는 몇몇 북유럽 국가들을 무대로 서체와 가구와 공간을 디자인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인터뷰는 유학이나 해외 이주를 고민 중인 국내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인터뷰 속 조규형의 이야기 때문에 북유럽행을 결정했다는 독자도 있었다. 그 독자는 “여기서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는 절대적 수평 관계”, “스웨덴 특유의 ‘평등’ 개념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 “소통의 효율성” 같은 인터뷰 속 조규형의 말들이 퍽 고무적이었다고 했다.
afterVIEW in 2020
지금 조규형은 스웨덴이 아닌 한국에 있다. 디자이너 최정유와 함께 스튜디오 워드(studio word)를 운영한다. 1인에서 2인으로,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라는 두 가지가 6년 새 조규형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아닐까 싶다. 『타이포그래피 서울』과 다시 만난 그는 2014년보다 좀더 차분한 언어를 구사하고, 꼭 해야 할 말을 최소한의 어휘로써 전달한다.
그가 6년 전 스웨덴인들로부터 “소통의 효율성”을 체감했듯, 에디터 역시 조규형으로부터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인터뷰에서 그는 “오래 써도 질리지 않는 덜 자극적인 디자인”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어쩌면 이 디자이너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모른다, 라고 에디터는 인터뷰 원고를 정리하며 줄곧 생각했다.

2014년 인터뷰 때와 지금, 가장 큰 차이라면 역시 ‘스튜디오 워드’의 존재 아닐까요. 최정유 디자이너와 함께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셨지요. 6년간 어떻게 지냈는가 대신, 스튜디오 소개와 오픈 과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5년까지 스톡홀름에서 활동 후, 2016년 한국으로 귀국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LVI design 소속 디자이너로 mete라는 가구 브랜드 론칭과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구와 공간 디자인의 전반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결혼과 함께 최정유 디자이너와 스튜디오 워드를 공동으로 세워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워드 얘기를 좀더 이어가도 될까요?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영어 소개문 말인데요. 우선, 원문과 의역 문장을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They are striving to coin a creative and useful language of design based on their close observation and discovery of their surroundings and objets, thei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radition and modernity, as well as their work ethic of maintaining fresh perspectives and genuineness.
그들(디자이너 조규형·최정유)은 ‘독창적이면서 쓸모 있는 디자인 언어 주조하기’에 천착한다. 주변 환경과 오브제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탐구, 전통 및 현대에의 포괄적 이해, 그리고 낡지 않는 관점과 진정성을 지향하는 직업 윤리로써.
두 가지 표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a creative and useful language of design(독창적이면서 쓸모 있는 디자인 언어)”, 다른 하나는 “work ethic of maintaining fresh perspectives and genuineness(낡지 않는 관점과 진정성을 지향하는 직업 윤리)”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개념이 스튜디오 워드의 색채 내지는 존재 방식 아닐까 하는데요. 스튜디오 운영자의 철학이기도 할 것 같고요.
‘스튜디오 워드’라는 이름은 Gregory Alan Isakov의 ‘Words’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 ‘Words mean more at night’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스튜디오명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어는 사전적으로 그 의미가 정의될 수 있지만 문장, 상황,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디자인도 환경과 사용자에 따라 사용성과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확장되는 디자인 활동을 위해서는 창의적 접근과 함께 쓰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용과 의미가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접근과 독자성 그리고 윤리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랫동안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접근이나 남과 다른 차별성, 조형 언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최근에 엔씨소프트(NCSOFT)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NC TYPE PLAY’라는 일종의 딩벳폰트를 제작하셨지요. 라틴 알파벳과 기호를 타이핑하면 게임 캐릭터의 이미지가 입력되는 폰트더군요.
메이킹 필름에서, 디자이너 조규형은 역시나 ‘언어’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를테면 “문자가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언어가 될 수 있다”, “게임 속 세상에서 우리는 캐릭터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플레이를 통해 다른 유저와 소통하는데, 그렇다면 게임도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NC TYPE PLAY’의 헤드 카피 자체도 ‘엔씨의 플레이를 담은 그림 언어’입니다. 왠지 이 카피(특히 ‘그림 언어’)는 디자이너 조규형이 제안한 것 아닐까 짐작해봅니다만.
이 프로젝트의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글자를 글자(문자)가 아닌 이미지(그래픽)로 바라봤다는 점일 겁니다. 앞서 질문 드렸던 “a creative and useful language of design”과도 맞닿는 사례 같은데요. 실제 제작자로부터 작업 의도와 에필로그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림 서체’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라틴 알파벳 3종, 2015년 한글 1종을 발표했었어요. 문자와 그림의 협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올 초 엔씨소프트에서 그림 서체 협업 제안이 먼저 왔습니다. 한동안 브랜딩, 가구/공간 디자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저로서는 다시 서체를 작업한다는 상황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설렘도 있었습니다.
기존 그림 서체에서는 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게임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게임은 배경, 캐릭터, 무기, 관계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리고, 서체로 엮는 작업을 선행했습니다.
일반 서체에는 Regular와 Bold가 있는데, NC TYPE PLAY에는 Regular와 Level up이 존재합니다. Regular가 문자의 모양으로 조합되어 가독성을 가지고 있다면, 캐릭터 간의 움직임과 확장된 이야기가 중심인 Level up은 가독성이 파괴된 형식입니다. 본 서체는 NC TYPE PLAY 사이트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림 서체를 이용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본 프로젝트가 충분히 대담한가? 내 작업 정체성의 연장선에 있는가? 내가 흥미로워하는가?”
여전히 6년 전 기준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혹은, 기준에 변화가 생겼다면 어떤 연유 때문일까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자기 주도’ 혹은 ‘디자이너-주체’라는 맥락의 한 사례로 꼽을 만한 최근 작업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은 스톡홀름에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활동은 작업을 선행하여 완성하고, 이를 전시와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제작자를 만나 대량 생산으로 잇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전시를 목적으로 한 비상업적 프로젝트를 하고는 있지만, 전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기에 완전한 자기 주도적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 활동에 비교하면 자율성은 떨어지지만, 협업자 또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그들이 주는 목적과 제한들이 대담성, 정체성, 몰입도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밀라노 디자인 위크(Milan Design Week 2019)에서 열린 ‘Wallpaper* Handmade’라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최정유 디자이너와 저는 ‘Cutlery Family Project’라는 작업을 전시했습니다. ‘Love’라는 큰 주제로 진행하였고, 주제의 해석과 매체는 저희 둘이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정유·조규형 두 디자이너의 사회적 고민의 산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역, 종교, 인종, 정치 이념 차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대상을 이해하기보다는 배척하려는 태도를 개선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점을 깊이 고민했고, ‘다른 모습의 것들이 모여 한 쌍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활에서 보여주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수저, 포크, 나이프를 디자인하여 하나의 Cutlery Family로 발표했습니다.


오롯이 제 주관에 근거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톡홀름의 예술학교 콘스트팍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오랜 기간 현지 생활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이너 조규형의 작업에서 저는 얼마간 (북유럽풍이 아닌) 동양미를 감각하게 됩니다. 동양미보다는 ‘선(禪, Zen)의 미감’이라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공간 디자인을 진행한 갤러리아 백화점의 VIP 라운지 ‘메종 갤러리아(Maison Galleria)’, 스톡홀름의 가구 디자이너 John Astbury와 협업한 ‘칼데라 테이블(Caldera L Coffee Table)’, 2019 공예트렌드페어의 온양민속박물관 부스 ‘오브제 온양’에 전시됐던 ‘누비 쟁반(nubi Tray)’ 같은 작업들이 저로서는 Zen Style처럼 다가왔습니다.
디자이너 조규형 인스타그램 피드의 전반적인 결 또한 상당히 차분하고 진중해 보였어요. ‘디자인을 화두 삼아, 자신이 가 닿고 싶은 어떤 지점을 향해 묵묵히 정진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더 작업들로부터 ‘선의 미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멋대로 이렇게 인상비평을 해놓아서요.(웃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더없이 간단하답니다. 디자이너로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기를 바라시는지요.
현재 제 자신의 작업을 어떤 특정한 스타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저 자신이 사용하다 보니, 오래 써도 질리지 않는 덜 자극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Timeless Design’이죠. 제품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에서 특히 이를 강조하려는 편입니다.
최근 발표한 프로젝트들이 이 Timeless Design 분야의 디자인이라서, 아마도 에디터님에게 차분하고 진중한 인상을 주었던 듯하네요. 단, Timeless Design이 Minimal Design처럼 단순성과 기능성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개성’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 누적에 따라 피로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환기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죠. 어려운 작업입니다만,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반드시 지키고 싶은, 스스로 에피그램처럼 여기는 워드(word)나 워딩(wording)이 있나요?
Write my words with meaningful and beautiful u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