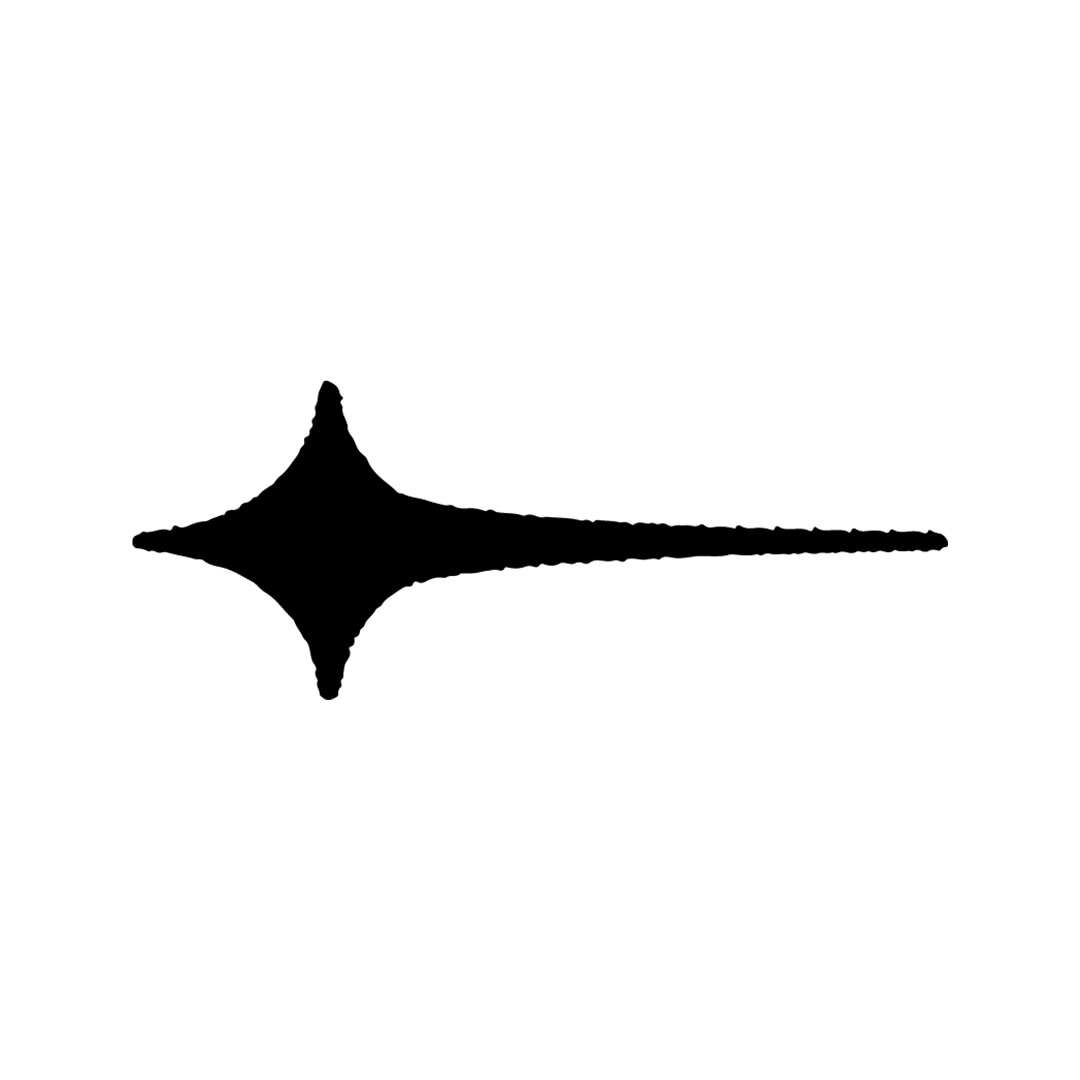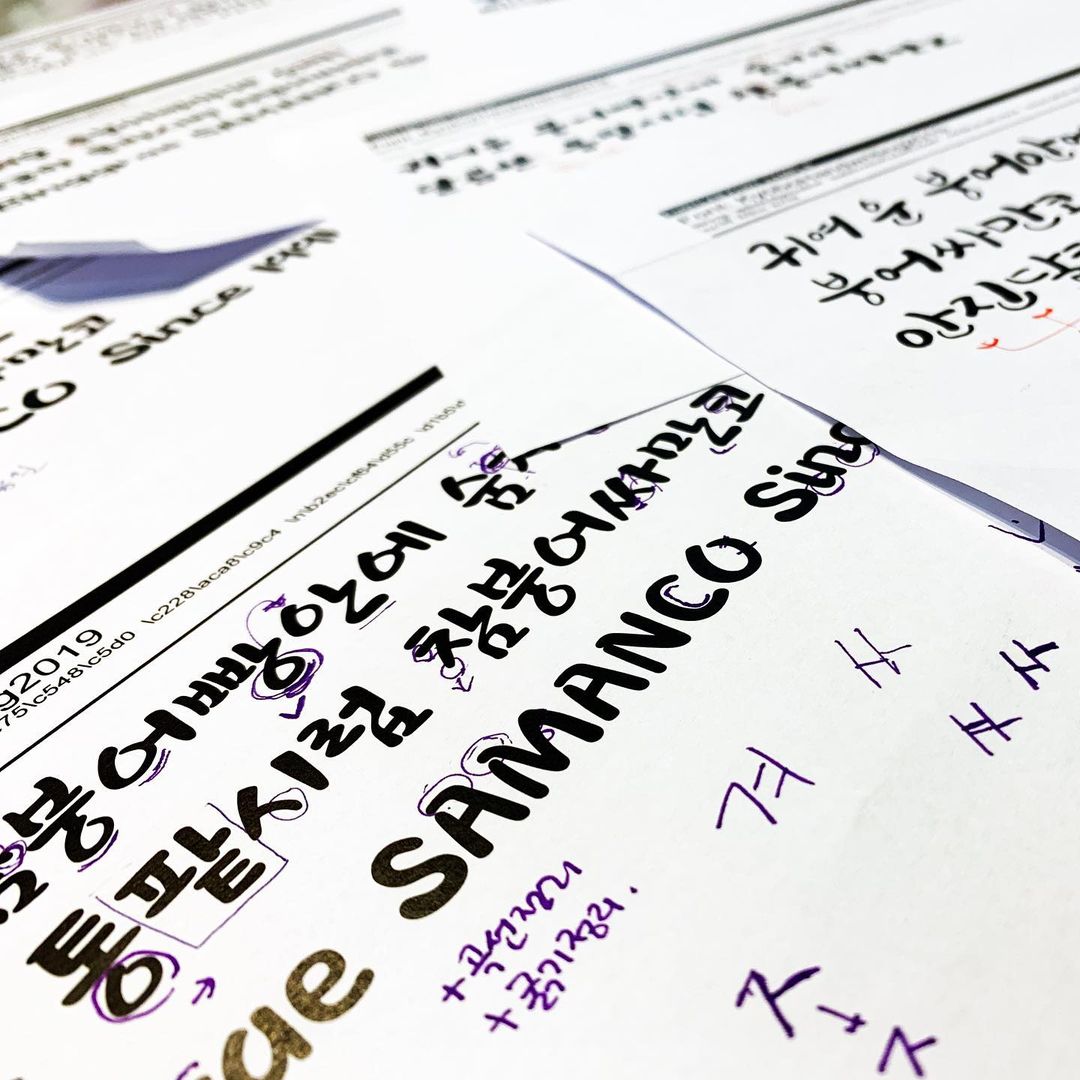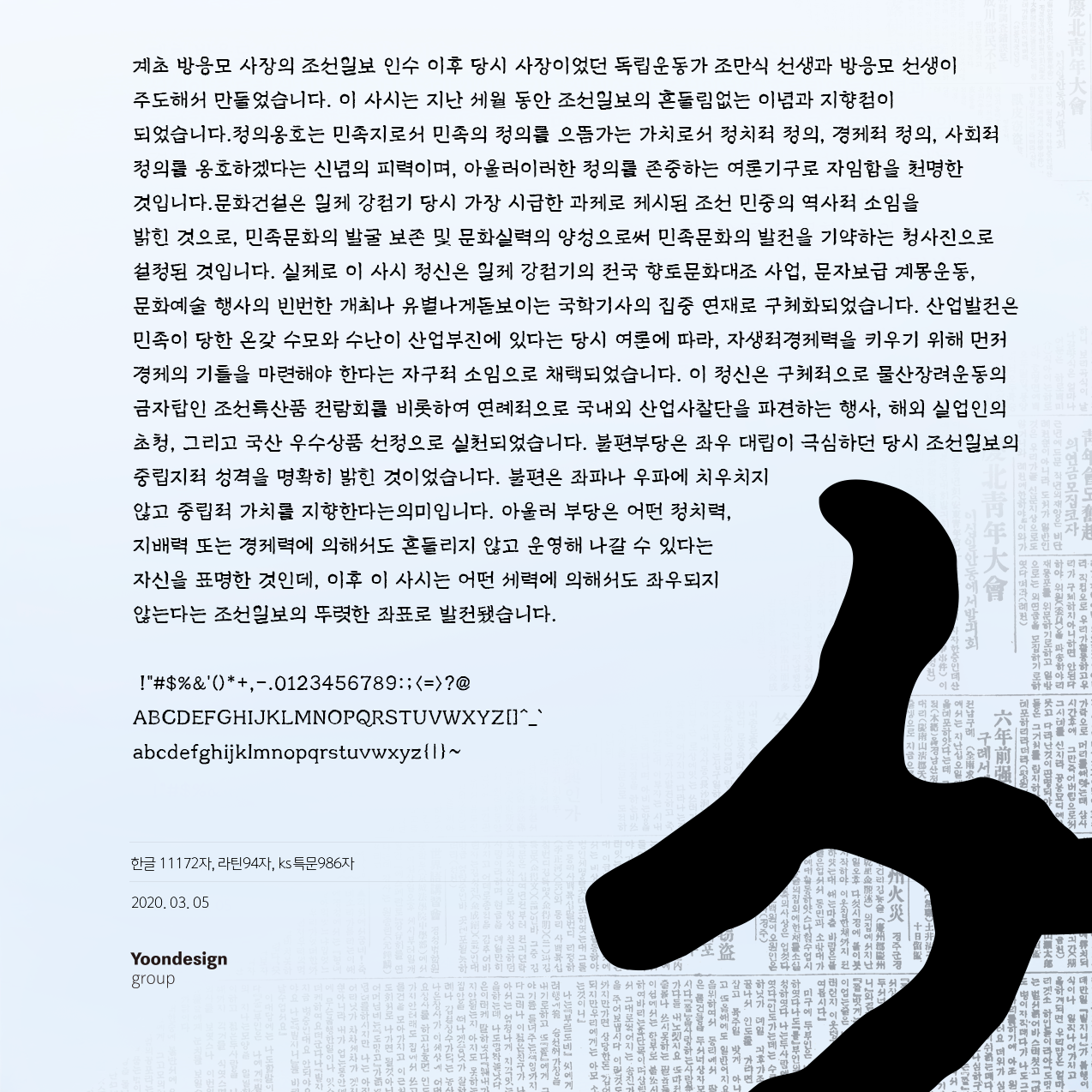interVIEW / afterVIEW 인터뷰(interview)는 말 그대로 서로(inter) 보는(view) 일이다. 서로 보는 일이나, inter-see가 아니라 inter-view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터뷰는 책, 기사, 영상 등 ‘인터뷰 콘텐츠’를 전제로 한 서로―보기다. 인터뷰 자체를 콘텐츠 제작 과정의 일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콘텐츠에는 기획 의도가 있으므로, 콘텐츠를 위한 만남과 대화는 어느 정도 기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인터뷰 또한 그렇다. 인터뷰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보다, 관점과 관점의 상호작용이다. 즉, view와 interaction의 결합이다. 『타이포그래피 서울』은 2011년 창간 이후 국내외 디자인계 인물 약 300명을 인터뷰했다. 타입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설치미술가, 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 어느 날 문득, 그들의 인터뷰 이후가 궁금해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view를 재확인해보고 싶었다. 지금쯤 그들은 어떤 위치와 어떤 view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을지. 지금의 view에 새로운 interaction이 더해지면 어떤 interview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들과 다시 서로―보기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다. 연재 코너 [인터뷰/애프터뷰]를 마련한 까닭은. 특별한 기획의도는 없다. 다만, 그들을 다시 보고 싶었다는 것 외에는.
interVIEW in 2013
7년 전 인터뷰 제목은 「욕망을 채우는 창작열, 디자이너 정제일」이었다. ‘욕망’과 ‘창작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당시 정제일은 다작가였다. 작업의 양도 양인데, 가짓수가 많았다. 그는 “워낙 욕심이 많다 보니 사진, 영상, 편집, 그래픽, 브랜딩,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야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깊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맹점 역시 존재한다”라는 자기 성찰적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afterVIEW in 2020
정제일은 여전히 다작가인 듯 보인다. 그가 운영하는 OSC 스튜디오는 사진, 영상, 편집, 그래픽, 브랜딩, 웹 등을 다룬다. 7년 전의 작업량과 가짓수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차이가 있기는 하다. 정제일에겐 이제 ‘욕망을 채우는 창작열’이란 타이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건 “워낙 욕심이 많다 보니” 여러 분야를 다뤘던 시절의 얘기다. 지금 정제일은 제 욕심(욕망)의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자칭하기로는 “비즈니스 관점의 디자이너로 확장”이라고 한다. 자기 욕망의 외부로 나아가기, 즉 욕심 버리기는 어째서 디자이너 개인의 ‘확장’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묻기 위해 정제일과 ‘애프터뷰’를 진행했다.

2013년의 ‘욕망을 채우는 창작열’이, 지금은 ‘욕망을 분산 분출하는 창작열’로 변한 느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욕망의 배기량은 같은데, 이제는 다기통 엔진을 장착한 모양새입니다. 욕망의 분출뿐 아니라 피스톤 운동까지 가능해진 상태, 그러니까 창작열과 표현욕이 상당히 정제된 방식으로 흡기/배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통 수가 늘어난 만큼, 욕망 채우기의 성공/실패에 따른 진동 또한 안정화됐을 듯합니다. 기본적인 마력과 토크(torque)에 진중함까지 더한 중형 세단 같은, 그런 제원을 갖게 된 노련한 디자이너. ···라는 것이 2020년의 정제일에 대한 제 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OSC[oscillator(발진기·진동자)의 준말]라는 스튜디오명도 의미심장하게 보이더군요.
7년 전에는 제 창작열의 표출과 설득의 방향이 나 자신, 즉 내부로 향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외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주관과 감성이 중요한 작가적인 관점에서, 객관성과 이성적 판단이 중요한 비즈니스 관점의 디자이너로 확장된 거죠. OSC 스튜디오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 중 하나의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파동을 일으키는 진동자인 ‘oscillator’의 의미처럼, OSC 스튜디오의 디자인과 작업물들이 외부에 좋은 파장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 워낙 욕심이 많다 보니 사진, 영상, 편집, 그래픽, 브랜딩, 웹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들 분야 중에서 우선을 두기 어려우나 중심이 되는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사진을 고르겠습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미적 기준의 순간적인 판단력에 대한 능력이 높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해 또 저 자신을 발전시켜줄 원동력이 되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역에서 두루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저 대답은 지금 읽어도 퍽 인상적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멋’이라고. 디자이너 정제일의 ‘멋’을 성립시키는 코어(core)가 어쩌면 사진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진에 대한 입장, 지금도 동일한가요?
제게 사진의 영향력과 역할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특정 분야를 정해서 중요도를 따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사진을 포함해 영상, 그래픽, 브랜딩, UX/UI 등 다양한 영역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는 결과를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표현의 목적, 표현되는 감각,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략과 시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멋’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랄까요. 방금 얘기한 부분들이 이왕이면 ‘멋’까지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안경 브랜드 아워그레이(OURGREY)와 카페 플라츠(Cafe-Plaats)를 운영하고 있죠? 둘 다 OSC 스튜디오의 자체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안경 브랜드, 카페. 이 세 가지는 어떤 접점으로 이어지나요?
언급하신 대로 아워그레이와 카페 플라츠는 OSC 스튜디오가 자체 기획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느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디자인부터 상품, 온오프라인의 소비자 경험까지 브랜딩 전반을 통합적 관점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기획의 주체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된 셈이죠. OSC-클라이언트-결과물, 이 셋이 하나 되는 일종의 삼위일체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경험은 앞으로 또 다른 클라이언트의 디자인 작업과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분명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일을 한다는 건, 컨설팅하며 설득시키는 존재, 즉 클라이언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 디자인 일을 한다면,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비싸고 그럴듯한 솔루션을 제안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나라면 이 솔루션을 과연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의 향후 이상향을 예측해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기. 디자인 일을 한다는 건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딱히 보여주고 싶다거나 강요하고 이해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다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는 질문에 저렇게 답하셨죠. 현재 시점에서 디자이너 정제일은 ‘나다움’을 어떻게 정의할지 궁금합니다.
조건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 하지만 나의 색을 잃지 않는 것.




‘라이프 아카이브 코리아(LIFE Archive Korea)’ 공식 웹사이트 제작, 2019

뜬금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업 영역이 그래픽, 패션, 사진, 영상 등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에 ‘음악’을 추가할 계획은 없나요?
음악은 그래픽, 패션, 사진, 영상 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영상에 사용될 음악들을 직접 제작해 마스터링까지 한 경험들이 있지만, 공식적인 작업이었다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가까웠습니다. 제게 음악이란, 아직은 좀더 취미 생활로 남겨두었다가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정식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