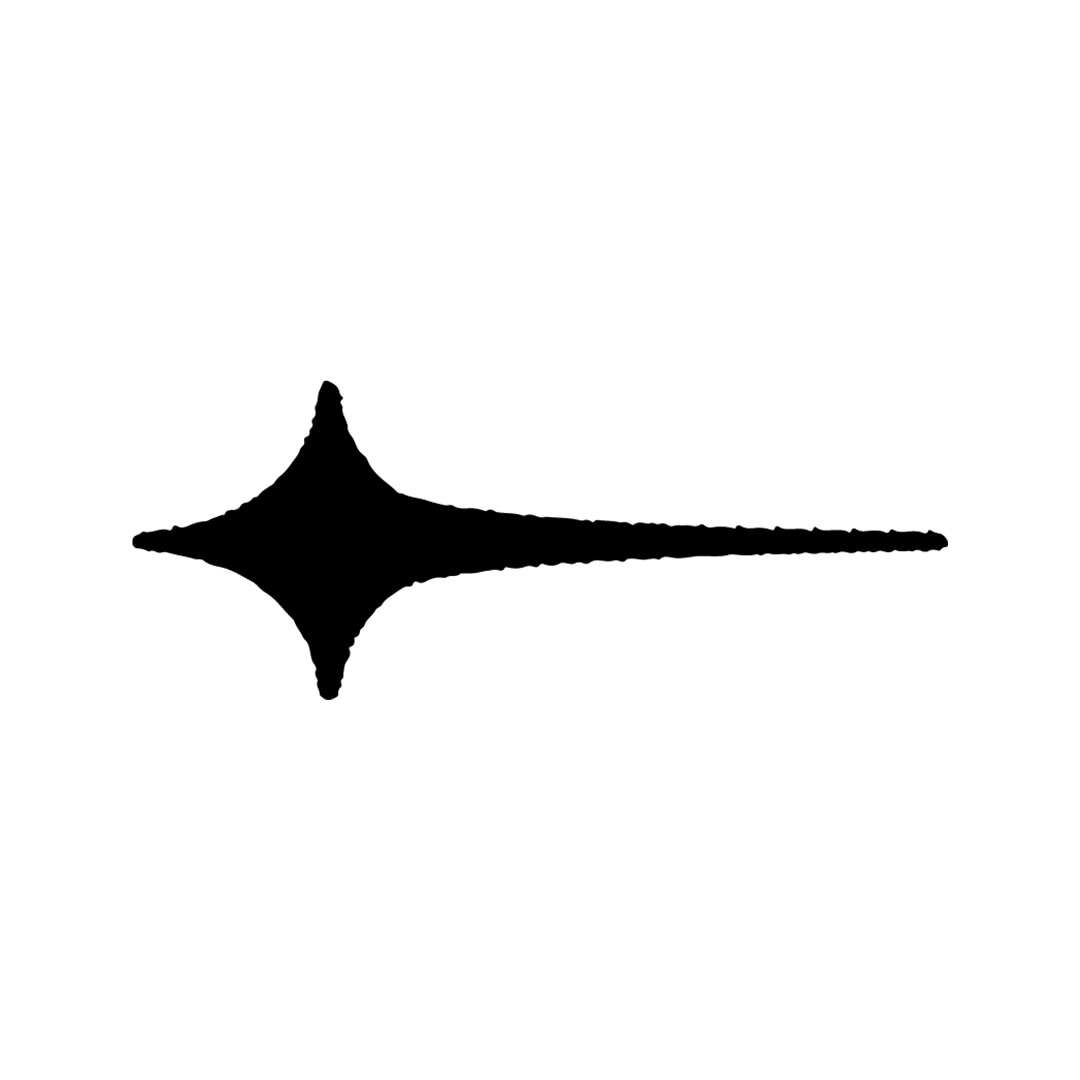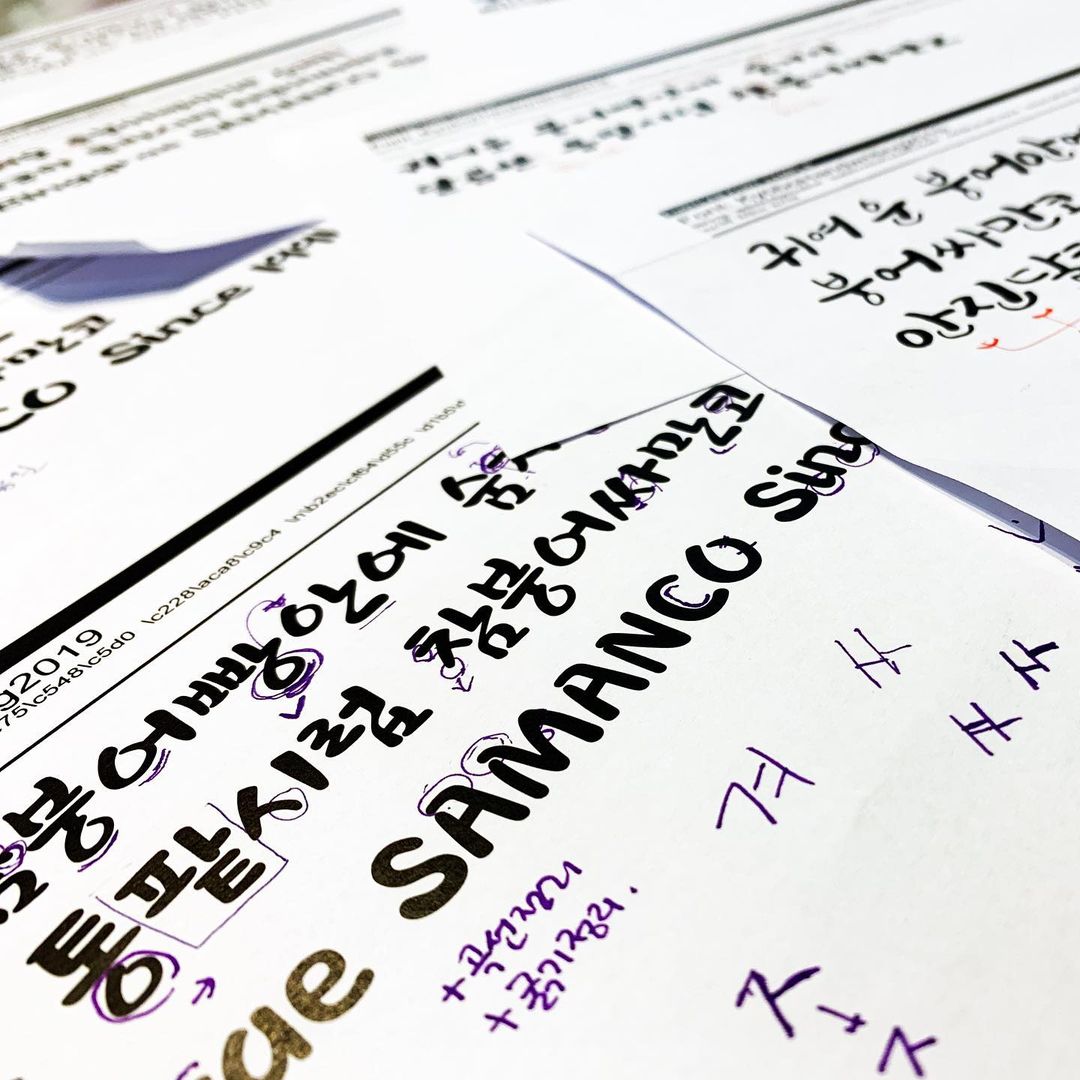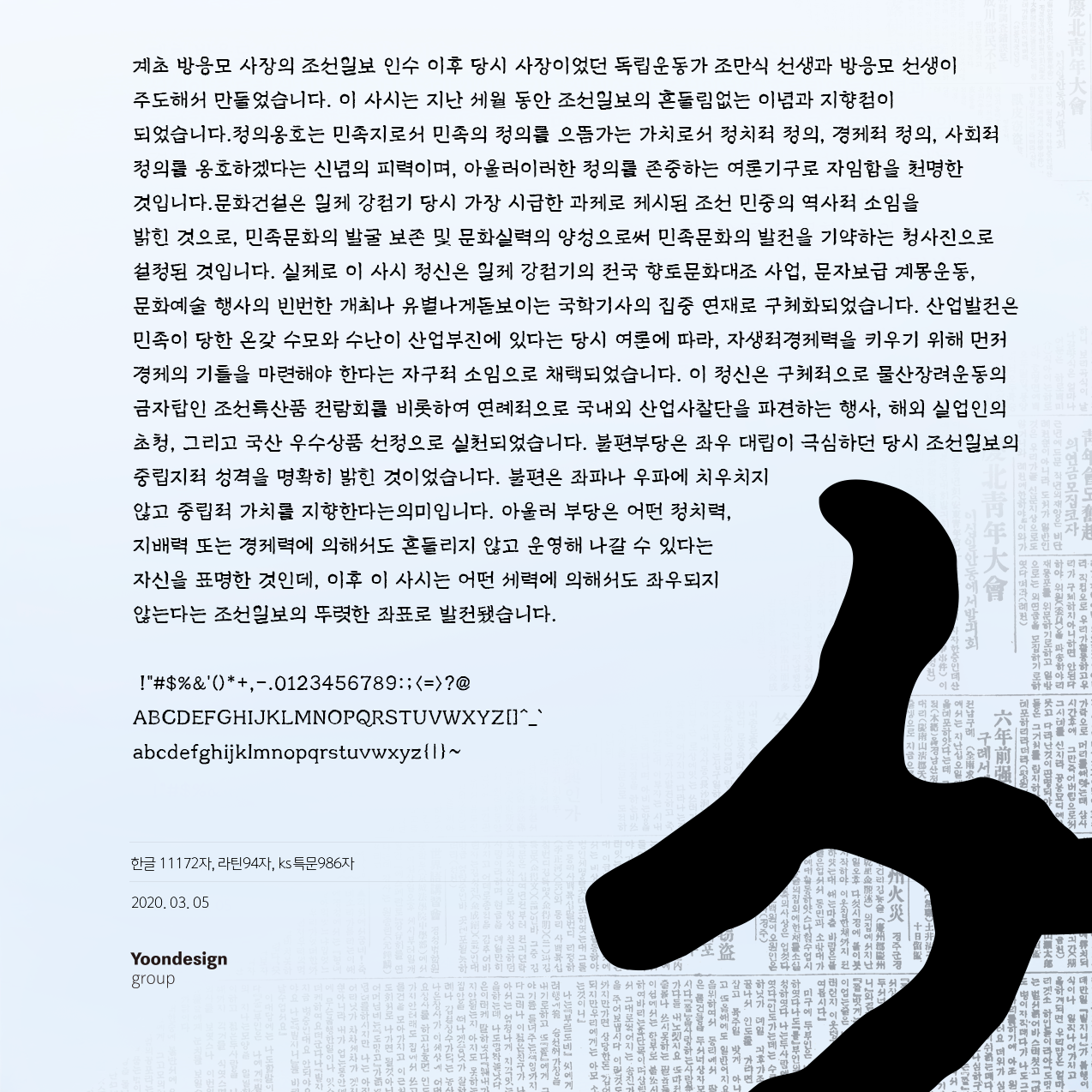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 사람이 디자이너라면, 자신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을 경험한 이후 그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가게 될까? 누군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도 예전처럼 살아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과거의 삶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고치에서 벗어난 나비처럼, 예전과 똑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다. 디자이너로 살다가 삶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박활민은 후자에 속한 사람이다.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2001년을 기점으로 봐요. 9. 11 사건이 저에겐 멘붕이 올 정도로 쇼크였어요. 내가 꼭 디자이너가 되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겼죠. 그러면 디자인을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는 가운데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산업 영역 속에서 정해진 디자인이 아니라 그 시대가 디자이너에게 요구하는 주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찾은 해답이 바로 ‘삶 디자인’이었어요. 2008년부터 삶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블로그에 계속 썼죠. 지금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웃음).
어떤 의미로는 삶 디자인이 공론화된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요즘은 삶 디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프로젝트로 접근해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공유재인데 공공재나 공공지역, 그러니까 보통 커먼스라고 일컬어지는 개념들이에요. 예전엔 배가 고프면 산에 가서 열매 따 먹고 강에 가서 물고기 잡고 그랬잖아요. 누구 산이다 강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죠. 결국, 공유재라는 건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생존을 서포트 하는 기반 시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유화되면서 이런 공통 기반이 사라지니까 원래 갖고 있던 권리라는 생각조차 못 하게 됐어요. 우리 사고 안에서 사라진 공유재나 커먼스 개념을 문화적 상상력으로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서식 프로젝트>도 하게 된 거고요.
<서식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네요.
대학로에 있는 한국공연예술센터 건물 안에 서식자들을 위한 집 네 채를 제가 짓고 서식할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데 전시를 하는 중에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돌아다니면서 도시에서 직접 서식을 해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강에서도 자고(웃음). 이동은 자전거로 하고.
서울에서 서식을 해보니 어떠셨어요?
한강에서 잔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태적 퀄리티가 높아요. 강바람이 밤새 시원하게 불어오니까 공기가 굉장히 상쾌하고. 지금은 장마철이라 모기가 없어서 좋은 때거든요. 한강에 가보면 실제로 저 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자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생활 문화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 탁 트인 공간과 자연 안에서 존재하고 싶다는 욕구가 아직 면면히 흐르고 있는 거죠. 잠은 꼭 집에서 자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30년 상환 주택부금으로 기꺼이 노예 계약을 한 후에(웃음) 기를 쓰고 거기로 들어가서 자려고 하죠(웃음). 다른 상상력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봐도 좋을 텐데 삶의 방식이 되게 획일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죠.



획일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니고 고유한 개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런데 개인이라는 것도 근대가 만들어낸 개념이라면? 수없이 많은 질문과 가능성의 모색 가운데 그는 문득문득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꺼냈다. 삶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저렇게 살아야 할지, 그에게도 정해진 딱 하나의 해답 같은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혼란한 상황 속에서 문화적 상상력은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침반이 되어주지 않을까.
삶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삶, 혹은 대안적 삶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이동 경로라는 게 회사, 마트, 집, 회사, 마트, 집…(웃음) 이렇잖아요. 이미 하나의 시스템화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경로를 계속 쳇바퀴 돌 듯 살고 있고요. 그러면 같은 쳇바퀴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욕망의 수준은 “이 쳇바퀴를 편안하게 돌리자!(웃음)”이 정도인 거죠. 편안한 일상이 현재 가장 바라는 욕망이 되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서식 프로젝트를 하면서 도시의 공간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될 때마다 동네 탐방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틈새를 본 느낌이 들었어요.
동네 탐방도 일종의 서식 프로젝트인가요?
다양한 삶에 대한 탐색이죠. 대학로 뒤에 낙산이라고 있는데 그 성곽 뒤가 장수마을이에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받아서 마을이 정리도 예쁘게 잘 되어있고 좁은 골목, 오래된 기와지붕, 고양이 등 정감 있는 풍경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렸더니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나 봐요. 이런 걸 봐도 현대 디자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역행하는 것에 대한 반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두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타인의 욕망에 물든 사회에서 문화적 상상력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도 모르게 내 사고가 무언가에 물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 게 힘든 일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간 존재 자체가 침해받거나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이동 경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회사, 마트, 집…(웃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관련되어있는데 이 연관성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프레임으로 보는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의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생명력을 주체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게 삶 디자인의 가장 근본이 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라이브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저한테는 다급한 문제에요. 삶 디자인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고요. 점점 공급형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공급은 편리함과 불안을 같이 주지요. 디자인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공급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식이 머릿속을 완전히 잠식해버리면 삶의 생명력, 라이브성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내가 야생의 사자인데 사자는 사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냥을 해서 토끼를 잡은 후 시장에 갖고 가서 판 다음 그 돈으로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거죠(웃음). 자기가 사냥을 해서 먹으면 되는데 고기 공급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웃음).



그에게 디자인은 자연스러운 삶의 생명력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자립이 가능할까, 궁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겼다. 삶을 궁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궁리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궁리하고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그가 가진 든든한 밑천이다. 그렇기에 지금-여기, 현실의 삶이 그에게는 가장 핫한 주제다.
집에 난로를 놓으셨잖아요. 그것도 궁리에서 나온 건가요?
네. 그럼요. 난로를 놓으면서 대단히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난로를 하나 집에 들여놓는 행위는 생각보다 중요해요(웃음). 난로는 진짜 굉장한 발명품이거든요. 무엇이 더 진보적인 기술이냐, 사실 디자인계에서 그런 질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봐요. 저도 집에 난로를 만들고 나서야 오래되었으면서도 앞서 가는 기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에너지, 노동, 가족, 유대감 등 본질적인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니 지금은 집을 어떻게 뜯어고칠까(웃음), 도시 안에서의 주거를 어떤 식으로까지 상상해볼 수 있을까, 를 또 궁리하지요.
‘하자’에서의 작업은 어떠세요? 탈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요.
‘하자센터’는 1999년에 공교육 시스템이 갖고 있던 한계를 배경으로 대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설립된 기관이에요. 저도 초기 세팅 멤버였고요. ‘하자’라는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그때까지 교육은 해라! 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자!로(웃음). 조한혜정 선생님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된 거고요. 저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자’에서 계속 해왔었죠. 개인적인 방황으로 잠시 인도에 가 있다가 다시 십 년 만에 ‘하자’에 돌아온 후부터 지금까지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자’에선 아이들하고 스스로 생산하고 탐구하고 궁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집 짓는 일도 하고 계시는데 직접 지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래도 집의 생산적 기능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공급형 삶의 방식이 공급형 주거를 낳고 공급형 주거의 공간 디자인을 보면 집안에서 생산의 기능을 거의 다 뺏고 있거든요. 예전 집에는 생산의 개념이 공간에 깃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주의 기능만 있고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몇 평인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의 전부인 거예요. 평수 넓은 아파트는 실제로 안 쓰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집을 짓는 궁리를 해보면 잠은 어디에서 자고, 음식을 만드는 공간은 어디에 두고, 재료는 어떻게 보관할지…. 이런 물음을 갖게 되거든요. 집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주거 공간 안에 생산의 기능과 공간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버려진 물건으로 재활용하거나 노머니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차원적으로 보는 세계 말고 그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보지 못했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틈새들을 계속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물건뿐만 아니라 사고도(웃음). 노머니 프로젝트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공간을 인식할 때도 대상이 아니라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배경, 또는 에너지가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이 나오더라고요. 노머니 라이프 스타일은 돈 없이 구질구질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확보하자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시간을 쏟아 붓는 뺑뺑이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시도해보고 싶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