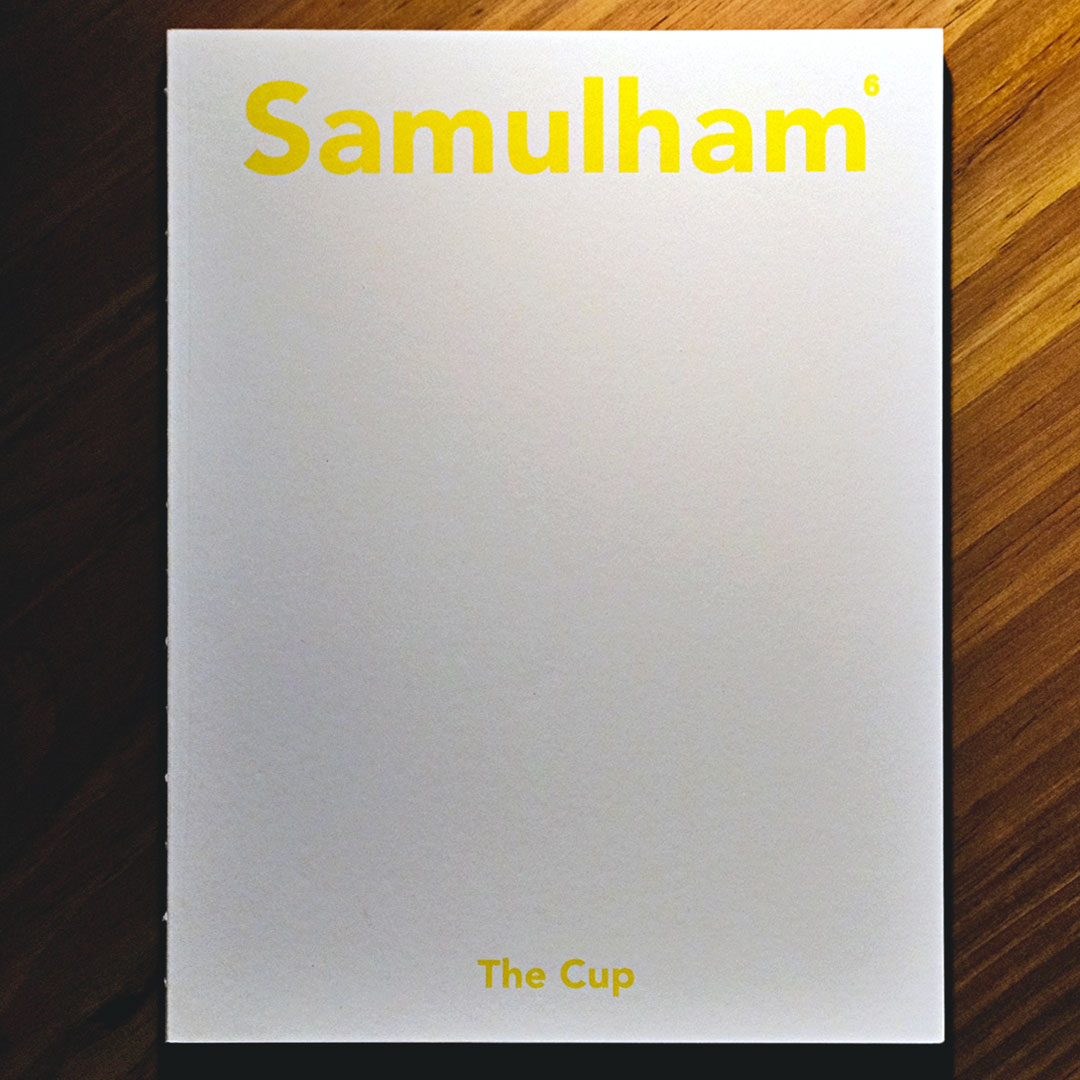한 달 한 권
1 제목 | 2 차례 | 3 서문
딱 세 가지만 속성 소개
일단은 1, 2, 3만 읽어보는 디자이너
“ 123 읽자이너 ”
#8 매거진 『사물함』 6호
한 달 한 권, 디자이너들이 일독하면 좋을 디자인·미술·인문 분야의 양서를 소개한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에디터가 직접 구입하여 읽은 책들이 그 대상이다. 서론―본론―결론 꼴을 갖춘 서평의 형식이 아니라, 1제목―2차례―3서문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다룬다. 그래서 코너명이 「123 읽자이너」다. 여덟 번째 책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체조스튜디오’(강아름·이정은 디자이너)가 만드는 매거진 『사물함(Samulham)』 6호(2021. 10.)다.

1 제목
『사물함』은 집 안에 놓인
익숙한 사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매 호 하나의 사물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그것과 연결된 삶의 장면들을 들여다본다.
― 매거진 소개문
매 호 한 가지 사물을 다룬다. 그래서 제호가 『사물함』이다. 『사물함』이 다루는 사물은 어딘가 특출한 물건이 아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이미 가지고 있을 평범한 물품이다. 매거진 스스로 “집 안에 놓인 익숙한 사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영문 제호를 ‘Locker’(즉, 서양식 사물함)가 아니라 ‘Samulham’이라 정한 건, 『사물함』 안의 보관물/기록물들이 “익숙한 사물들”임을 넌지시 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창간호 ‘조명’, 2호 ‘베개’, 3호 ‘밀폐 용기’, 4호 ‘월경 용품’, 5호 ‘창문’에 이어 6호가 담은 사물은 ‘잔(The Cup)’이다. 이 잔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그것과 연결된 삶의 장면들을 들여다본” 관찰기가 이번 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다. 『사물함』의 시선은 마치 영화 미술 감독에 가깝다. 장르도 정서도 다양할 독자들의 한 편 한 편 일상을 ‘소품’이라는 미술의 관점으로 정성껏 단장해준다. 매거진의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나면, 섬세한 독자들은 자기 곁의 사물을 문득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래, 거기 그렇게, 그래서 있었던 거로군’ 하고 눈길을 주며.
『타이포그래피 서울』은 매거진 『사물함』을 만드는 ‘체조스튜디오’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인터뷰는 『사물함』을 이렇게 소개했었다.
내 곁에 사물이, 그러니까
매거진 한 권 분량만큼의 세계가 놓여 있었음을 깨닫는 경험.
그런 세계들/사물들의 총합이 바로 나의 일상다반사였음을 실감하는 각성.
독자들의 세계를 그리고 세계관을 ‘볼만하게’ 디자인해주는 기획물, 『사물함』.
2 차례
질문들 잔을 탐구하기 전 음미해볼 의문형 명제들
사물의 자리 Ⅰ ‘잔이 있다는 것’에 관한 짧은 산문, 첫 번째
환대의 습관 ― 편혜영(소설가)
장면들 잔이 존재하였던 영화의 장면들
사물의 자리 Ⅱ ‘잔이 있다는 것’에 관한 짧은 산문, 두 번째
우리가 잔을 높이 들어올릴 때 ― 신유진(소설가)
Aimless Smile 사진으로 사유한 잔
photography by 정멜멜
당신의 사물을 그려주세요 독자 투고: 독자들의 잔 드로잉
역사와 종류 시대별/국가별/용도별 잔 도감
Tea Cups in the Park 미국, 영국 등 해외 유원지의 찻잔 모양 놀이기구들
사물의 부재 「사물의 자리」와 조응하는, ‘잔의 부재’에 관한 짧은 산문
컵이 뭘까요 ― 전진우(가구 제작자)
사물의 자리 Ⅲ ‘잔이 있다는 것’에 관한 짧은 산문, 세 번째
버지니아 울프의 컵 ― 권희철(문학평론가)
※ 각 차례 옆의 주(註)는 『타이포그래피 서울』이 덧붙임
차례의 흐름을 미리 알아둔다면 『사물함』의 열림이 약간은 더 두근거릴지 모른다. 우선, 주제 ‘잔’에 대하여 [질문들]을 던져본다. 그러고는 ‘잔’이라는 [사물의 자리(Ⅰ)]에 관하여 문학적으로 사유해본다. 왠지 나의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학적이지는 않은) 평범한 일상과는 동떨어진 듯 느껴질 수 있으니, 순수문학보다 좀더 내 일상과 닮아 있을 대중 영화 속 [장면들]을 보기로 한다. 한 장면 한 장면마다 내가 알던 잔, 그 잔들이 보인다. 잔이 있음으로써 나의 일상도 그럴듯한 씬(scene)이 될 수 있겠다, 하고 감응해본다.
그러면 다시, 잔이라는 [사물의 자리(Ⅱ)]에 문학적 무드를 더해본다. 그저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던 잔, 그 사물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엔 더 열성적으로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해본다. ‘잔’을 주제로 한 예술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본다. 하지만 사진 어디를 봐도 잔은 없다. 피사체는 잔이 아니라 여성의 몸이다. [Aimless Smile]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무도 아무 데도 향하지 않는 미소, 막연한 미소, 그냥 지어진 미소, 그냥 그렇게 거기 있는 미소, … 사진들의 페이지를 곁에 두고 잔의 있음, 잔의 존재를 골똘히 숙고해본다. 매일 쓰는 사물을 두고 이런 사고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싶어진다.
이쯤에서 사유는 잠깐 멈추고, 다시 일상의 차원에 더 가까운 잔과 마주한다. 독자들이 보내온 잔 드로잉과 소박한 손글씨 문장들에 공감한다. [당신의 사물을 그려주세요]라는 요청은 이제 보니 우리 삶의 한 장면씩을 서로 보여줘볼까요, 라는 제안이었음을 알게 된다. 잔의 [역사와 종류]가 이리도 방대했음에 감탄하고, 해외에 실재하는 [찻잔 모양 놀이기구들 ― Tea Cups in the Park!]에 웃음도 지어본다.
예술적 잔과 일상적 잔을 몇 차례 호흡을 나누어 감상했다. 잔의 존재는 예술적이기도 일상적이기도 하다, 잔이 있음으로써 예술적 일상 혹은 일상적 예술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라는 아이디어에 자연스럽게 동화된다. 그러고 나니 이번엔 잔의 없음에 대하여 사유할 차례란다. [사물의 부재]라니. 잔이 부재한다면 삶의 장면은 어떤 모습일까. 곰곰 떠올려봐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확실한 건, 누군가에게 “당신의 잔을 그려주세요” 하고 말을 걸기란 불가능하다는 것.
다행히, ‘부재’가 아니라 ‘자리’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한다. 다시, 잔이라는 [사물의 자리(Ⅲ)]로 왔다. 『사물함』은 이렇듯 한 차례의 ‘부재’와 세 차례의 ‘자리’를 남기며 닫히고 있다.
3 서문
매거진 『사물함』의 서문, 그러니까 권두언에 해당하는 차례는 앞서 본 것처럼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마치 독자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의 사물을, 자신의 삶을 얼마나 궁금해 하시나요’ 하고 묻는 것 같다. How curious are you about your matters and your life? [질문들]이 발원한 대상은 사물(6호의 경우 ‘잔’)이나, 그 답은 발원지로만 회신되지 않는다. 예기치 않게 그 답은 ‘나 자신’에게도 향한다. 익숙한 사물들을 궁금해 하는 동안, 얼마간 독자들의 삶의 한 장면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 제목처럼 「The Curious Case of ( )」 같이 변화할지도 모르겠다. Benjamin Button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분실하면 안 될 무언가를 사물함 안에 넣어두듯.
빈 잔을 바라본 기억이 있는가
잔에 남겨진 자국을 닦으면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모두 지워지나
‘마신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기분을 가져다주는가
컵을 내려놓는 순간을 인지해본 경험이 있는가
― 매거진 『사물함』 6호, [질문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