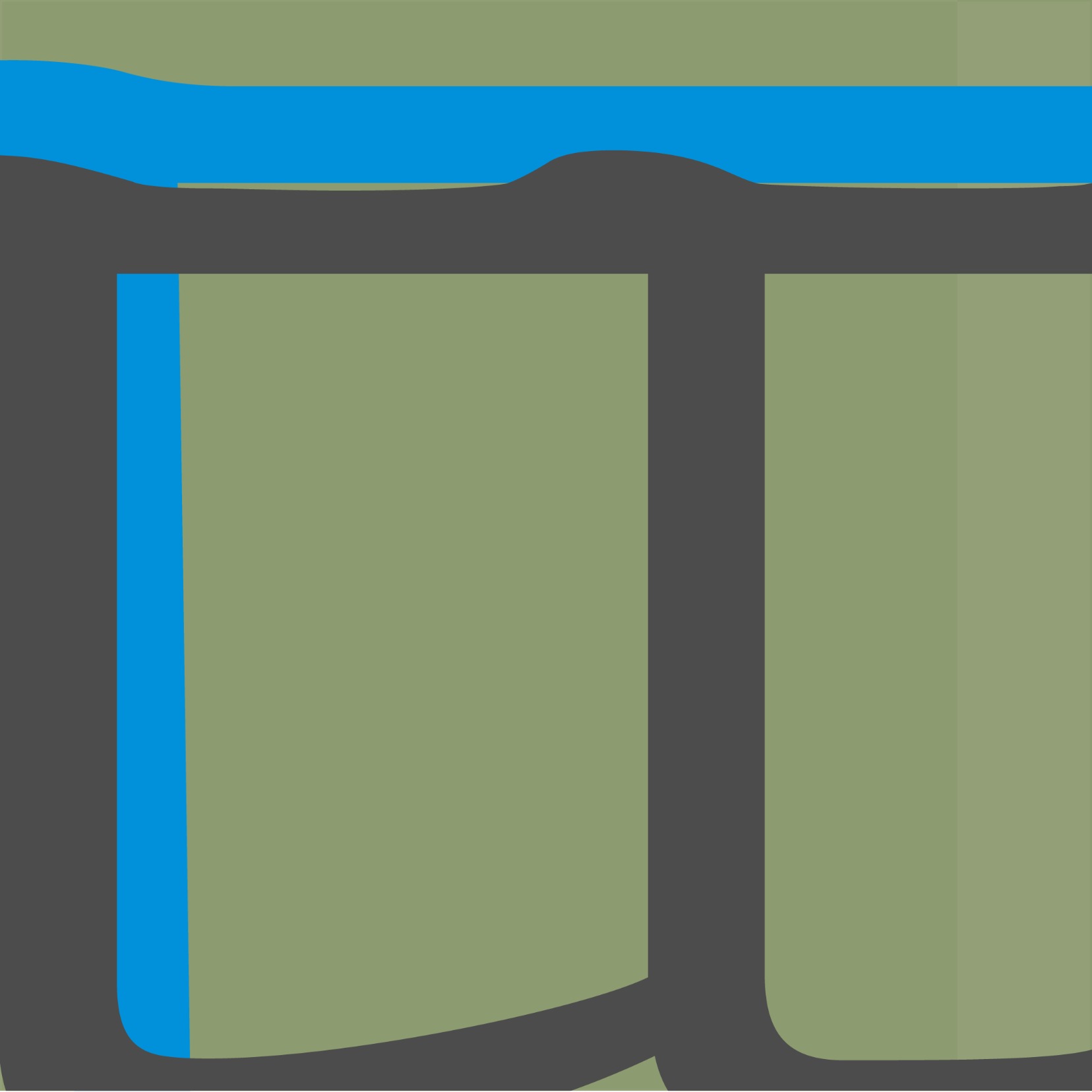정병규라는 이름 앞에는 자주 '대한민국 1세대 북 디자이너'라는 수식이 함께한다. 그는 우리나라에 북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립한 인물이다. 북 디자인 하면 타악기인 '북'을 디자인하는 줄 알던 때였다고, 정병규는 이런저런 인터뷰와 세미나를 통해 젊은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북 디자이너보다 좀 더 포괄적인 출판 디자이너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앙일보 아트디렉터를 지내기도 한 그는 책 장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쇄물의 편집 디자인을 두루 해왔으니, 북 디자이너보다는 출판 디자이너 쪽이 정병규라는 인물을 수식하는 데 적합할 것이다. 그럼에도 왠지 정.병.규. 이름 석 자를 생각하면 언제나 책의 형상이 떠오른다. 다독가인 그는 문예창작학과, 불어불문과를 전공하고 민음사 편집부장, 홍성사 주간 등을 거치며 책의 몸이 아닌 책의 속살, 즉 글(텍스트)을 먼저 만졌다.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고(故) 이윤기와는 형제처럼 막역한 사이였고, 동년배인 소설가 박범신과는 서로 이름을 부른다. 문학평론가 황현산, 시인 이시영 등 문인들과의 교류는 유명하다.
그가 강의에서, 혹은 여러 인터뷰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기억에 꽤 오래 남는다. 아마도 특유의 정확한 문장형 어투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눈을 감은 채 말하는 모습도 그의 이야기를 텍스트 형태로 기억에 인식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듯하다. 의식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현 주제에 적확한 단어와 술어를 알맞게 고르는 것 같은 얼굴. 눈을 감고 이야기하는 그의 심상은 그러하다. 책을 닮은 사람. 지금은 절판된 어느 두껍고 오랜 초판본 같은.
‘정병규 개인전’이 합정동 골목의 어느 소담한 갤러리에서 열렸다.(2015년 12월 9일~13일) ‘사각형’이라는 이름의 공간이다. 전시는 말 그대로 ‘개인전’이었다. 정병규라는 책 한 권의 1장부터 지금까지의 페이지들을 펼쳐놓았다. 유년기에 받은 표창장, 젊은 시절의 여권, 디자인계와 문학계 동료들과 함께한 사진, 신문에 실린 자신의 기사 등등이 마치 목차처럼 분류되어 스크랩되어 있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작은 전시 공간 바닥에 차곡차곡 놓여 있었으며, 관람객은 방석에 앉아 허리를 수그려 감상해야 했다. 일상의 기록을 온라인에 공유하여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확인하는 SNS 세대에게는 이런 광경이 낯설지도 모르겠다. 한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폐쇄적으로 보관되어 있던 물성의 기록물들을 맞대하는 경험이라니. 게다가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전시장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 허리와 목을 푹 숙여야 한다. 집들이 때 앨범을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손님들에게 결혼식 사진이며 가족 사진이며 쑥스러워하며 한 장씩 보여주는 풍경이 떠오르기도 한다. 앨범 주변에 둥그렇게 모여 앉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한 곳에 모으게 된다. 신발을 벗고, 엉덩이를 바닥에 대는 일련의 과정만으로도 신발을 신고 서 있을 때의 경직됨은 어느 정도 제거된다. 인쇄된 프레임 안에 포착된 그 사람의 앳된 시절과, 또한 흘러간 이야기들은 신발 벗고 앉은 이들의 손과 접촉하며 더욱 밀접해진다. 타인의 생의 기록에 좀 더 바짝 다가가는 기분. 이런 조용한 화학작용이, 정병규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 사각형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모든 연인들의 욕망일 것이다. 책 좋아하던 사람이 책의 속살뿐 아니라 책의 몸까지 단장해주고 싶게 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편집자로서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정병규는 혼자 공부하여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프랑스로 디자인 유학을 떠날 당시에는 출판계 지인들이 조금씩 모아 유학비를 보태주기도 했다. 그때는 그런 일이 가능했었다고 정병규는 오랜 후 어느 인터뷰에서 소회를 남겼다.

정병규 스스로 여러 사진 옆에 직접 메모해둔 짤막한 문구들은 소소한 재미를 더했다. 특히, 담배 한 대를 손에 든 고 이윤기의 사진에 “이놈의 OO, 이윤기!”라고 써놓은 모습은 정답고 애틋하다. 정병규는 자신과 친동생 정재규 화백, 그리고 이윤기는 형제처럼 가까웠다고 술회한 바 있다. 세 사람은 1999년 그림책 『어른의 학교』(민음사)를 함께 만들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관객이라면 “이놈의 OO, 이윤기!”라는 메모 앞에서 쉽게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저 짧은 문장에 한 예술가의 삶과 인간적 면모와 로망이 모두 담겨 있으니 말이다.
『씨네21』 김혜리 기자는 정병규와의 인터뷰에서 알베르 카뮈를 닮았다고 썼는데, 이번 개인전에서 이삼십대 시절 사진들을 보니 카뮈보다는 프란츠 카프카를 더 닮은 것 같다. 궐련 하나를 입에 문 그의 옆모습은 디자이너라기보다 차라리 예술가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그에 대한 실제 인상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술은 못 마셔도 커피와 담배만큼은 곁에 두는 그는 이국적이기까지 하다. 평면적인 한국 사회에서 정병규라는 인물과 같은 어른은 흔하지 않다.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속에 지니고 있고, 장시간 말하는 동안에도 문장의 주술·술보·술목 관계가 오롯이 유지되며, 그렇게나 두껍고 방대한 책 한 권이면서도 독자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텍스트를 힘껏 열어 보여주는 젊음이라니. 그런 어른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1946년생인 이 디자이너의 이야기 분량이 올해로 70 챕터다. 이번 개인전 제목이 〈러키 세븐〉인데, 70 챕터를 갈무리하는 키워드인 걸까. 어쨌든 지금까지보다 더욱 경쾌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다음 페이지에 이어질 것 같다. 정병규라는 책은 언제나 펼쳐져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