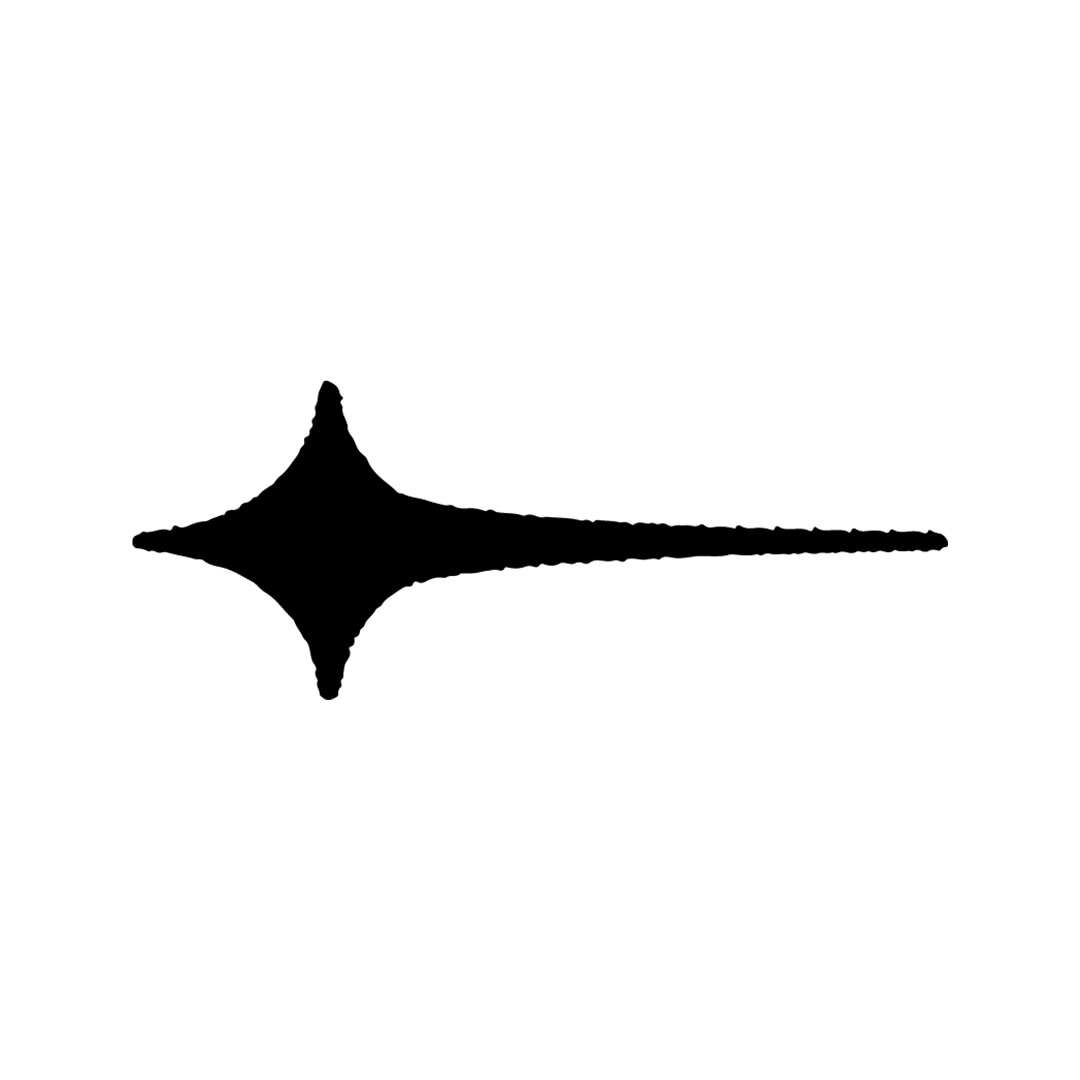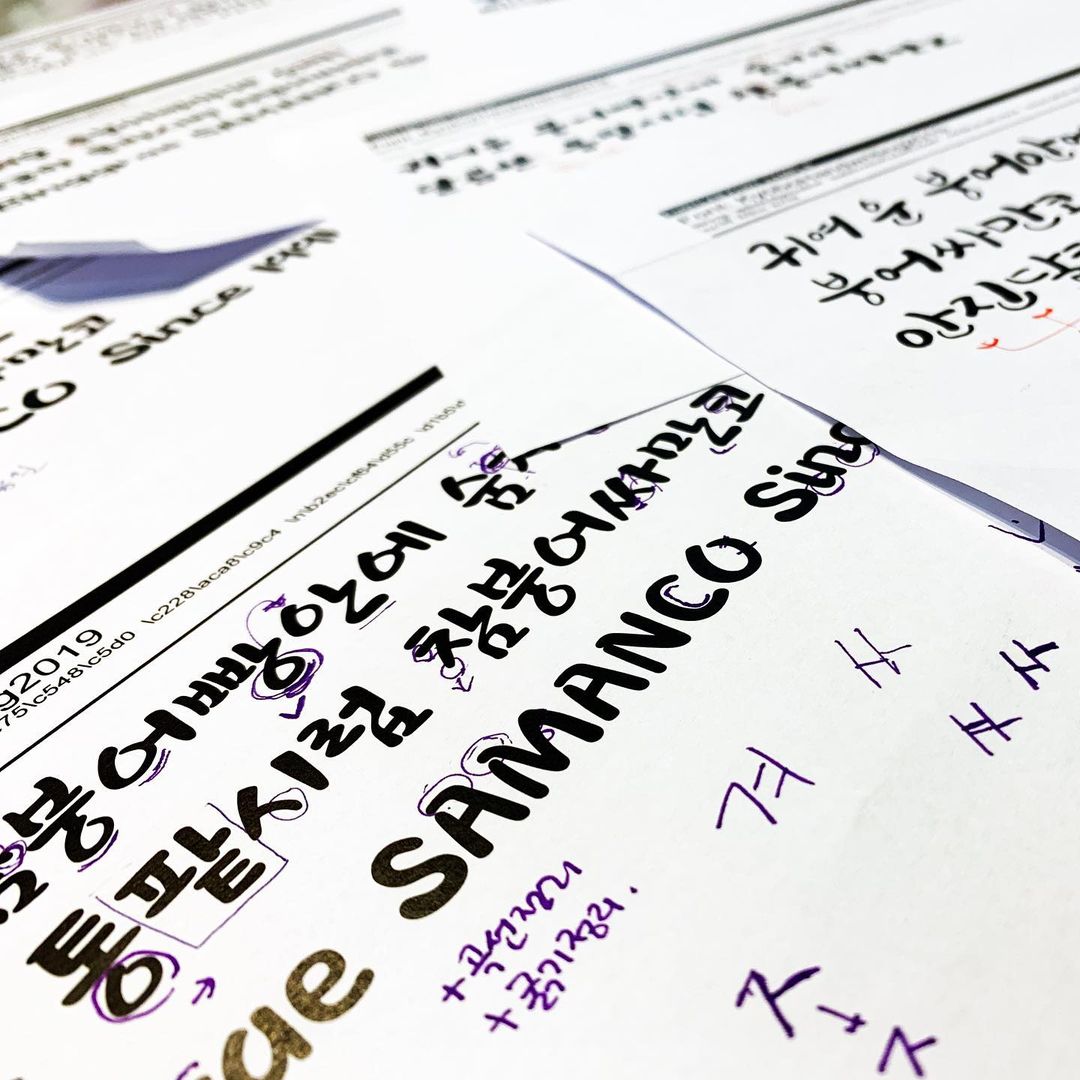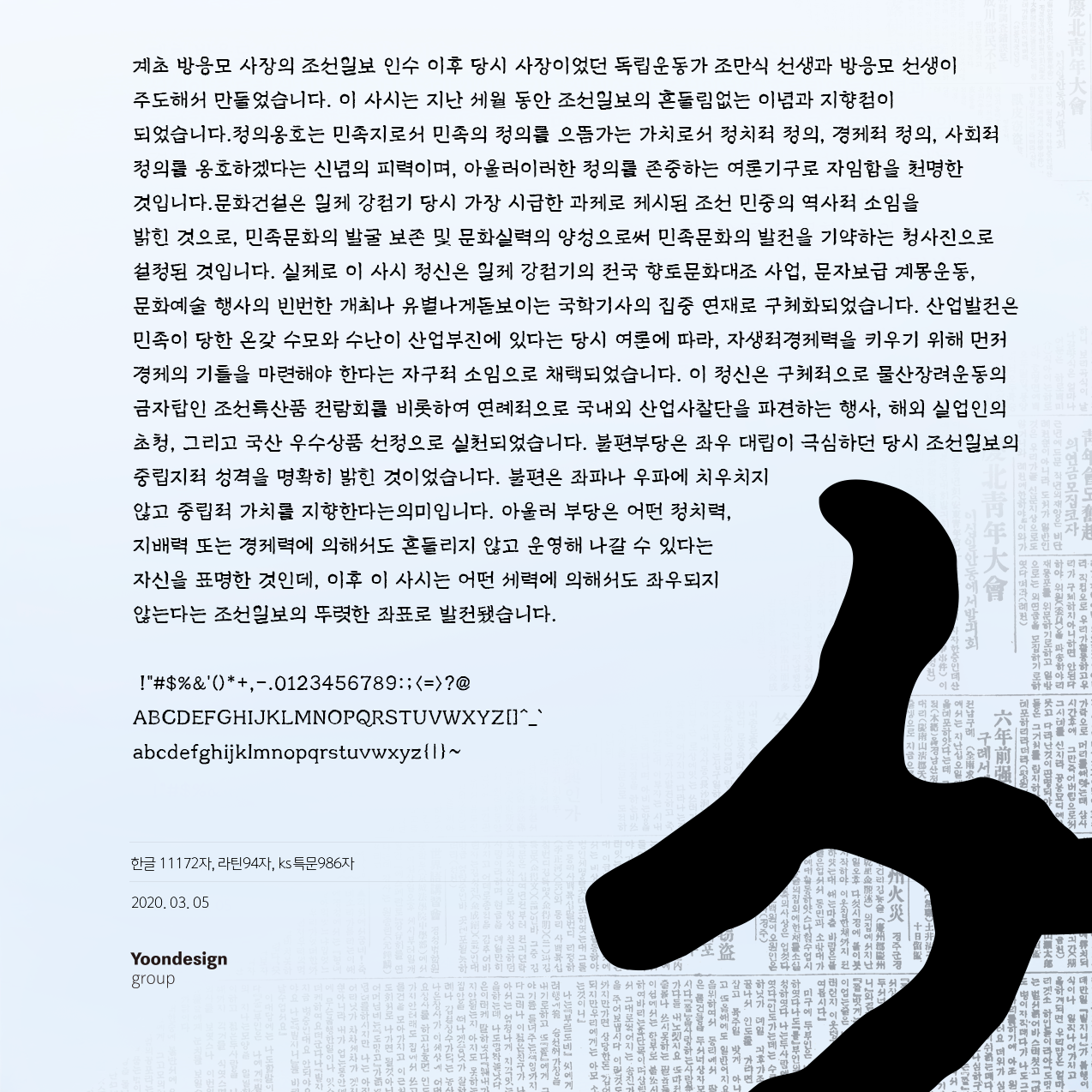시골 생활의 어려움은 해본 사람만이 안다. 도시에서 꿈꾸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디자인 세계를 동경하는 것과 실제로 그 씬에 머물면서 꾸준히 결과를 내는 것 또한 이상과 현실만큼이나 거리가 있을 것이다. 암흑 속 안개를 뚫고 단 하나 자신 안의 불빛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 구불구불 좁은 도로를 지나 목장도 하나 건너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다. 아침이면 뒷산에서 꿩이 내려오고 고라니가 차 앞을 막고 있단다. 도시에서 줄곧 살았던 그가 파주로 들어와 외진 곳에 둥지를 튼 이유는 무엇일까.

집이 멋있어요. 특별히 파주로 오신 이유가 있나요?
군 생활을 이 근처에서 했어요. 마트 갈 때 제가 포복하던 곳을 지나요(웃음).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저지르는 것이다 보니 그냥 저질렀네요. 작년에 이사 왔는데 살아보니 정말 좋아요. 다만 겨울엔 춥다는 거(웃음). 원래 영어 기숙학교였던 곳인데 내부 구조를 거의 다 뜯어냈어요. 1층은 통으로 쓰고 싶어서 문이랑 벽이랑 다 때려 부수고 주방도 넓게 만들었어요. 주방 옆에서 일하는 게 로망이었거든요(웃음).
‘디자인 삼촌’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별명 같은 건데요, 제가 막 디자이너가 됐을 무렵 사촌 조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면서 같이 놀아주니까 저를 잘 따랐죠. 얼굴에 털도 많으니까 신기해하고(웃음). 옹알옹알하면서 디자인 삼촌, 디자인 삼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삼촌을 너무 사랑해요(웃음). 삼촌만이 가진 느낌이랄까, 삼촌은 죽을 때까지 삼촌이잖아요. 제 꿈이 죽을 때까지 디자인하는 거니까 삼촌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젠 친구들도 그렇게 불러요(웃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픽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하시는 분이라고.
네, 다 해요(웃음). 애니메이션을 전공해서 디자인보다 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애니메이션도 재미있지만, 디자인을 통해 하나를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작업에 흥미를 갖게 됐죠. 하나를 오래 붙잡고 있기보다 이런저런 작업을 많이 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 스타일링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처음엔 인터뷰 요청받고 타이포그래피를 주도적으로 하는 디자이너는 아닌데 저한테 뭐를?(웃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감성을 좋아한다, 이런 게 없이 그때그때 신 나게 작업하는 편이에요.
작업할 때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타이포그래피는 그래요. 부분적인 시각에 지배당해서 전체를 안 보고 타이포그래피 플레이 능력만 보여주자고 작정하면 제대로 망할 수 있어요(웃음). 역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인을 빼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실력이 뛰어나도 시각이 너무 좁으면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 디테일하거나 뛰어난 실력을 갖추진 못했지만, 자유롭고 넓게 보려고 해요. 다양한 경험들을 해본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었다. 마음처럼 작업이 안 나와 끝없이 밤을 새워야 했던 날 아침엔 주먹으로 벽을 치며 울었다. 누군가 다가오면 으르렁, 이빨을 보였다. 그래도 이 길 외에 가고 싶은 다른 길은 없었다. 그래서일까. 미치게 사랑하는 길을 걸어온 그에게선 사람 냄새가 난다. 가슴에 사랑이 많아서인지도 모르겠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 따뜻한 봄날 같은 그 사랑이 오랜 시간 강도 높은 작업을 꾸준히 해내도록 이끌지 않았을까.
본인은 어떤 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디자인 자체를 좋아해요. 장르에 상관없이. 파주에 온 것도 작업의 주체자로 온전히 마음을 쏟고 싶어서예요. 오래 작업하다보니 ‘디자인’이라는 직업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도시에 있는 디자이너들과 비슷하게 되고 싶진 않아요.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긴 하지만 남들과 다른 세계를 갖고 싶어요. 온리 원이 되고 싶죠. 남들의 기준대로 살기보다 제 기준을 만들고 싶고. 어중간한 디자이너로 남고 싶진 않아요.
디자인 삼촌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놀랄 만한 기술이나 스킬이 제 장점은 아니에요. 다 잘한다고 말은 했지만(웃음). 테크닉만으로 승부를 걸기엔 진짜 잘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해외에 나가면 잘하는 분들은 더 많을 거고. 제가 여러 가지를 잘한다고 해봤자 한 가지만 깊이 판 분들과 비교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믹스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본질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까요.
디자인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이든 영화든 장르마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디자인은 유기적인 생명체고, 어디에 대입하는 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 뿐 그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오히려 기획에 의미가 있죠. 필요한 곳에서 사심 없이 좋은 역할을 해낼 때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 좋은 디자인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할 때 전혀 사심 없이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사심이 정말 많았어요(웃음). 디자인을 할 때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고.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말겠어! 이런 마음도 많았고요. 하지만 놀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웃음). 성공 욕심이 독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지금은 제 갈 길 가려고요. 디자인은 중간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활동이고, 그 활동을 저는 너무 사랑해요.


그에게 디자인은 대상으로서의 명사가 아니라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동사다. 고정된 오브젝트가 아니라 달리고 뒹굴고 땀 흘리는 액션이다. 디자인의 세계는 실력으로 통한다. 그만큼 냉정한 곳이기도 하다.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기댈 곳도 없었다던 그가 지금의 자신을 일궈내기까지 보냈을 시간은 짐작만으로도 묵직하다. 죽을 때까지 디자인하는 행복한 장인이길 바란다는 그. 디자인이 필요한 곳에서 삼촌~하고 부르면 어디든 나타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즐거움을 줄 것 같다.
아트 디렉터로서의 경험은 어떠세요?
3년 정도 영화 포스터 작업을 했어요. 공간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포토그래퍼 등 콘셉트를 구체화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작업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전체를 보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전주국제영화제랑 상상마당 음악영화제에서 아트 디렉팅을 하면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픽 디자이너는 책상 밖을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전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한정된 범주를 벗어나는 시도를 많이 해요. 안전한 방향으로는 잘 안 가요(웃음).
작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인가요?
네. 막 휘둘러요(웃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댄다고(웃음). 하지만 1을 부탁했는데 10을 하려고 하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담당자하고도 거의 친구가 돼요. 저의 뻔뻔함으로(웃음).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 작업도 거기까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같이 뛰어놀면서 하는 게 좋아요. 투썸 작업할 때도 4층 건물에 막 뛰어 올라가서 전체 벽에 퍼포먼스하고. 끝나고 결국 몸살 났지만(웃음).
분야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내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정규혁’이라는 개인이 주목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누가 했네, 라고 확인 도장 받는 스타가 되기보다 철저하게 디자인의 입장에서 상황에 적합한 결과를 내려고 하죠. 그래도 제 특징은 있어요. 정확하게 딱 맞추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지 날 것의 느낌이 나요. 너무 완벽한 건 답답하더라고요. 좌우대칭도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중간에 맞춰 넣자 이러면 대세에 영향 없으니까 정렬 강박 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웃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해외 일에 도전하고 싶어요. 안주하지 않고 움직이면서 죽을 때까지 장인으로 살고 싶거든요. 올림픽 디자인하는 게 꿈이에요. 페스티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올림픽도 전 세계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스터든 티셔츠든 디자인이 일상생활에서 쓰인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을 고치다 보니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직접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겨울에도 뜨거운 물 펑펑 나오는 집으로(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