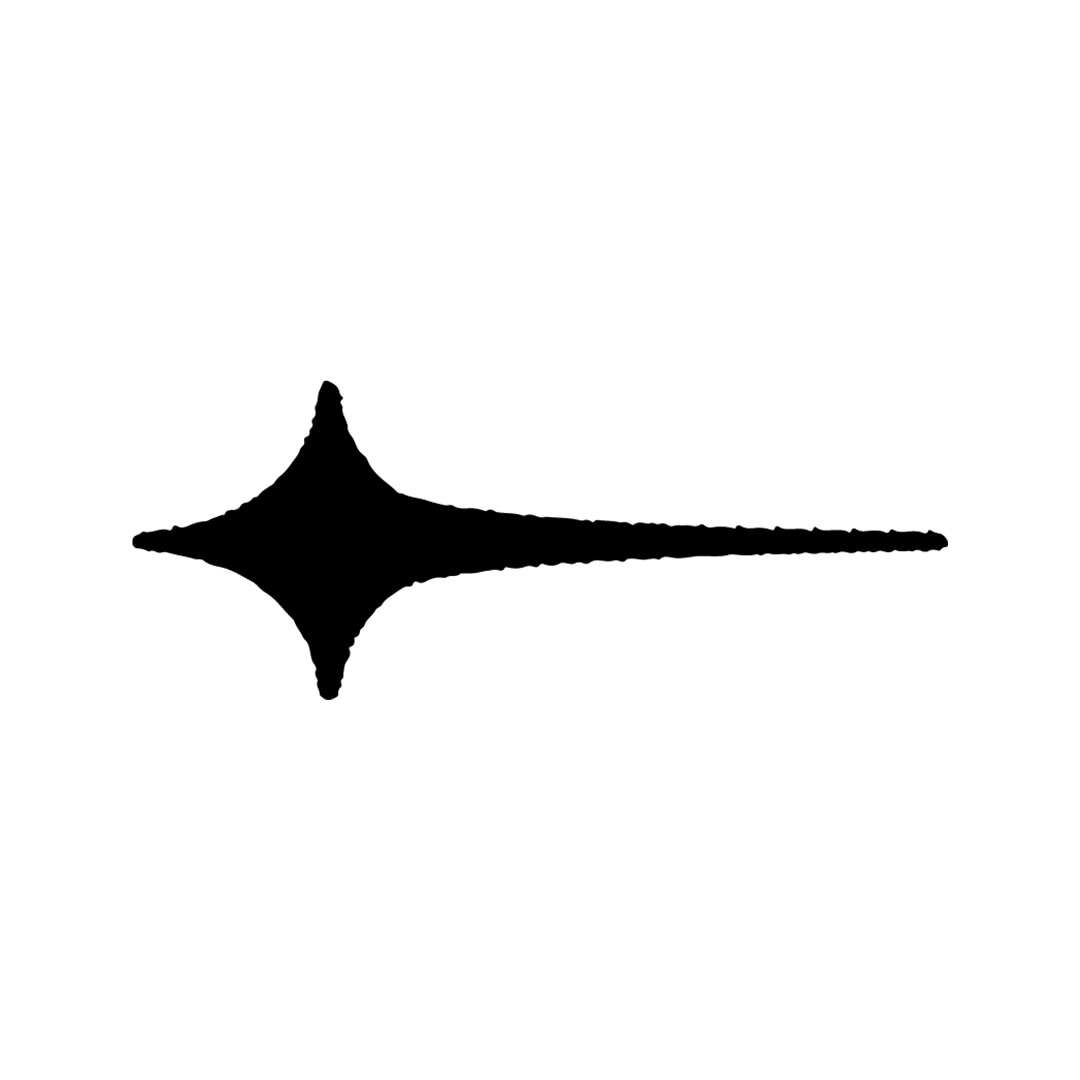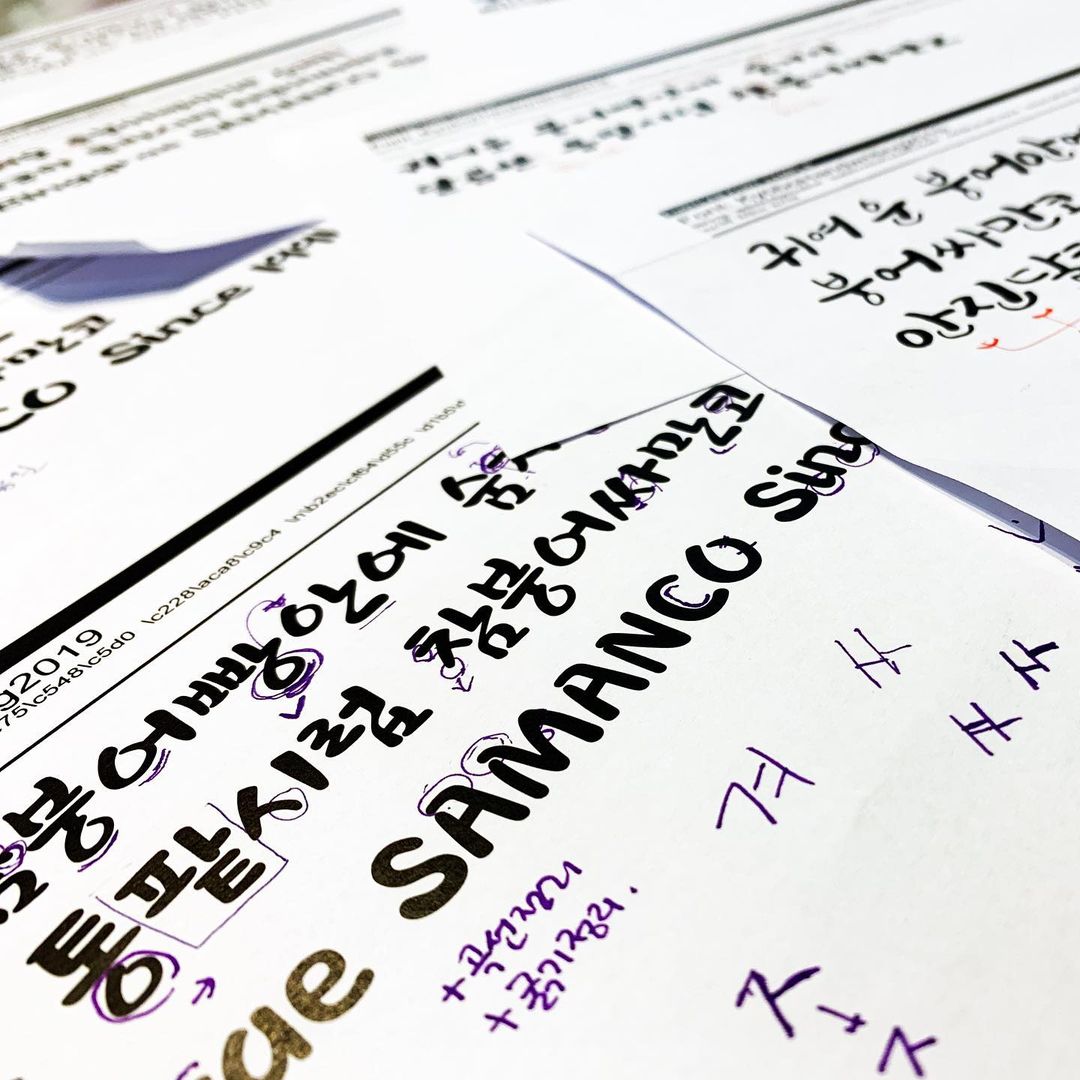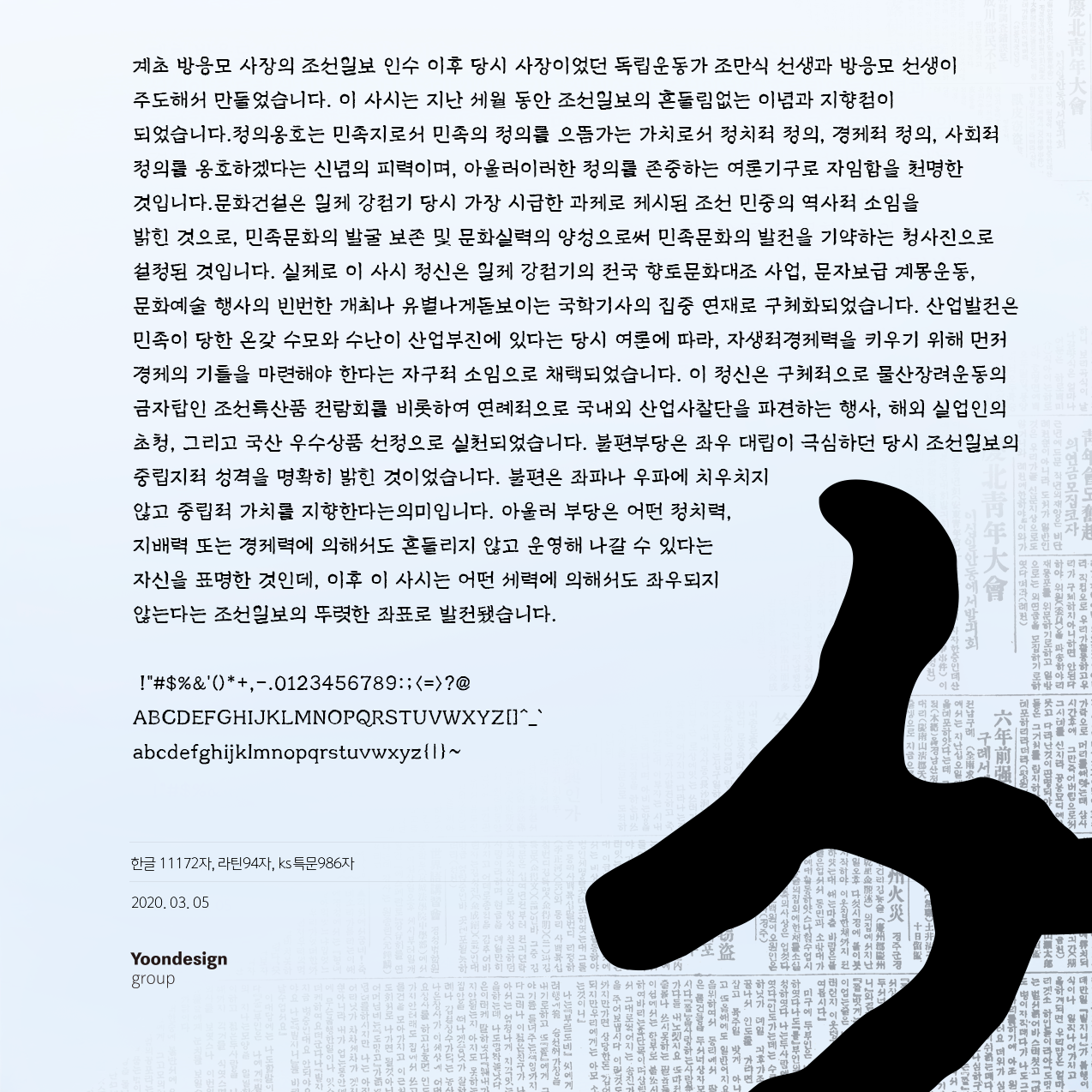가장 일본적인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사토 고이치(Sato Koichi). 얼마 전 한국의 제자가 기획한 전시에 참여하러 우리나라에 온 그를 만났다. 그는 '가장 일본적인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수식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친다. 디자이너가 된 지 50여 년이 된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생각으로 작업한 적 없다는 그의 오래된 이야기, 여느 젊은 디자이너 못지 않은 열정적인 고민과 생각을 들려주었다.

이번에 한국은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올해 제가 딱 70살이 되었네요. 도쿄에 있는 타마미술대학교에서 강의한 지 20년 만에 정년퇴임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얼마전 학교에서 크게 개인전도 했었어요. 갤러리 사각형에서 열린 이번 <그로잉 포스터> 전은 제자였던 채병록 씨가 기획한 전시에요. 저의 정년퇴임을 아쉬워했던 그는 제가 가르쳤던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을 참여 작가로 모으고, 각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연구한 작품과 신작을 모아 전시하기로 했어요. 저에게도 함께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저 또한, 제 작품을 한국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흔쾌히 응했지요. 원래는 작품으로만 참여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방문한 적 없는 저의 아내가 꼭 오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일본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라는 평을 받고 계신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디자이너가 된 지 50여 년이 됐네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생각을 하며 디자인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젊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에 소개됐던 유명한 작품들이 그런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에 강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 전통의 미와 그 생각을 작품에 담아야겠다는 의식과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스럽지’ 않아요.(웃음)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대학 시절 미국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모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모방하고 똑같이 만들어도 미국인에게는 소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이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들이 내 작품을 보고 ‘왜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소원이었죠. 그러던 중 설날에 한 백화점에서 일본 근대 목판화 전시를 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일본인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서라고 느낀 거죠. 그 이후 일본화 관련 전시가 있으면 어디로든 달려갔고 이와 함께 일본인에게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일본화 안에는 일본 글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인만이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건 후지산이나 기모노 입은 여성을 그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평범한 찻잔의 단조로운 형태에도 일본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런 소스나 방법을 역으로 현대적인 매체, 디자인이나 포스터에 넣으면 그것이 일본인 만의 시각적 언어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깨우쳤던 것이지요.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앞에 언급했던 대로 공부하고 분석한 가운데 찾아냈던 모티브가 ‘상자 시리즈’였어요. 뚜껑은 없지만 내면과 외면, 안과 밖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상자를 에어 브러쉬로 표현한 작품이지요. 상자 자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한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서 여러 가지 에어 브러쉬로 표현했는데요, 그게 일본적인 시각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그런 표현 방식을 쓰기 시작한 거고요. 사물도 하나의 존재라고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테고 그것이 결국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는 관계성이 돼요. 저는 그런 관계성을 이 작품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양의 윤회사상처럼 무언가 연결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동양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 서양에서 호기심을 갖고 요구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도 그때 많이 알려졌고 사람들 기억에 전 일본적인 작가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진 거네요.
저 자체도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는 뉴욕이나 파리가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동양적인 철학 사상이 붐이 되고 그러면서 동서양이 융합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는 특정한 곳이 문화의 중심이 아니라 그 어디라도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로컬(local)’은 단순히 특정한 지역이 아닌, 내가 있는 자연스러운 자리. 그곳이 어디든 ‘로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이 그 당시 작업에 녹아 있어요. 후지산 하나를 그려도 그것을 더욱 깊게 바라보고 저만의 시각 언어로 표현하니까 저를 찾는 클라이언트가 많았지요. 그들 덕에 어쩔 수 없이 후지산을 그린 것처럼 일본 고유의 문화가 담긴 작품 수도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일본적인 것을 표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저만의 독립적인 시각 언어를 일본인인 제가 표현했으니 자연스럽게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죠.
특별한 작업 프로세스나 작업 스타일이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산책하거나 작업 외 일상적인 것을 해요. 그런 중에 재미있는 요소를 찾았을 때 다음엔 어디 어디에 이렇게 써먹어야지, 라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미있는 인쇄물을 모아서 조그맣게 잘라 모아놓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디자이너가 한 작품일 수도 있고 동네에서 만든 찌라시일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색깔이나 요소, 종이 질감 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저 나름의 샘플집을 만드는 것이지요. 작업할 때 이 요소와 저 요소를 섞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 색깔과 저 색깔을 섞기도 해요. 참 재미있지요.


컴퓨터를 못 다루신다고 들었어요. 디지털 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맞아요. 저는 이메일 계정도 없고 컴퓨터를 켜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 저의 작업은 충분히 작업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생각한 다음 어시스턴트가 표현하게 하죠.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오거든요. 어시스턴트가 올 때까지 충분히 생각한 후 스케치를 해 놓고 그의 옆에 앉아서 설명하며 작업해요. 그런데 제 생각을 디지털로 옮겼을 때 막상 재미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작업을 멈추고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하죠. 또, 일본의 표준 포스터 사이즈인 B1으로 작업을 옮겼을 때 느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 부분부분을 A3사이즈로 뽑아 벽에 조각조각 붙인 후 디테일을 살피기도 해요.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고. 그래서 괜찮으면 계속 진행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스톱하는 거죠.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타이포그래피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작품을 해도 하나의 방법, 하나의 표현만 고수하지 않아요. 계속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죠. 너무 많은 작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작품 속의 타이포그래피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곤란하지만, 근래에 작품에서는 그것을 굳이 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 안에서 타이포그래피만 놓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오히려 묻고 싶네요.(웃음) 모든 요소가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지 작업 안에서 타이포그래피 따로 일러스트레이션 및 이미지 따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요. 물론 타이포그래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별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연 문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부분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잘 설계된 하나의 서체 디자인이 올바른 문자인가? 아니면 옛날 당나라 시대 때 마구 흘려 쓴 글자가 올바른 문자인가? 이것도 아니면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막대로 쓴 글이 올바른 문자인가? 아니면 역으로 올바른 타이포그래피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읽히면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재미나고 흥미롭게 읽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재미있게’라고 하는 방법은 세상에 너무나 많지요. 이것의 포인트는 바로 의외성인데요, 아! 이렇게도 읽히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찾는 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역으로 재미있게 하는 방식은 잘 읽히게 하는 방법을 부정하면 돼요. 제대로 읽히는 것을 부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힐까 하는 미묘한 간격, 그 사이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