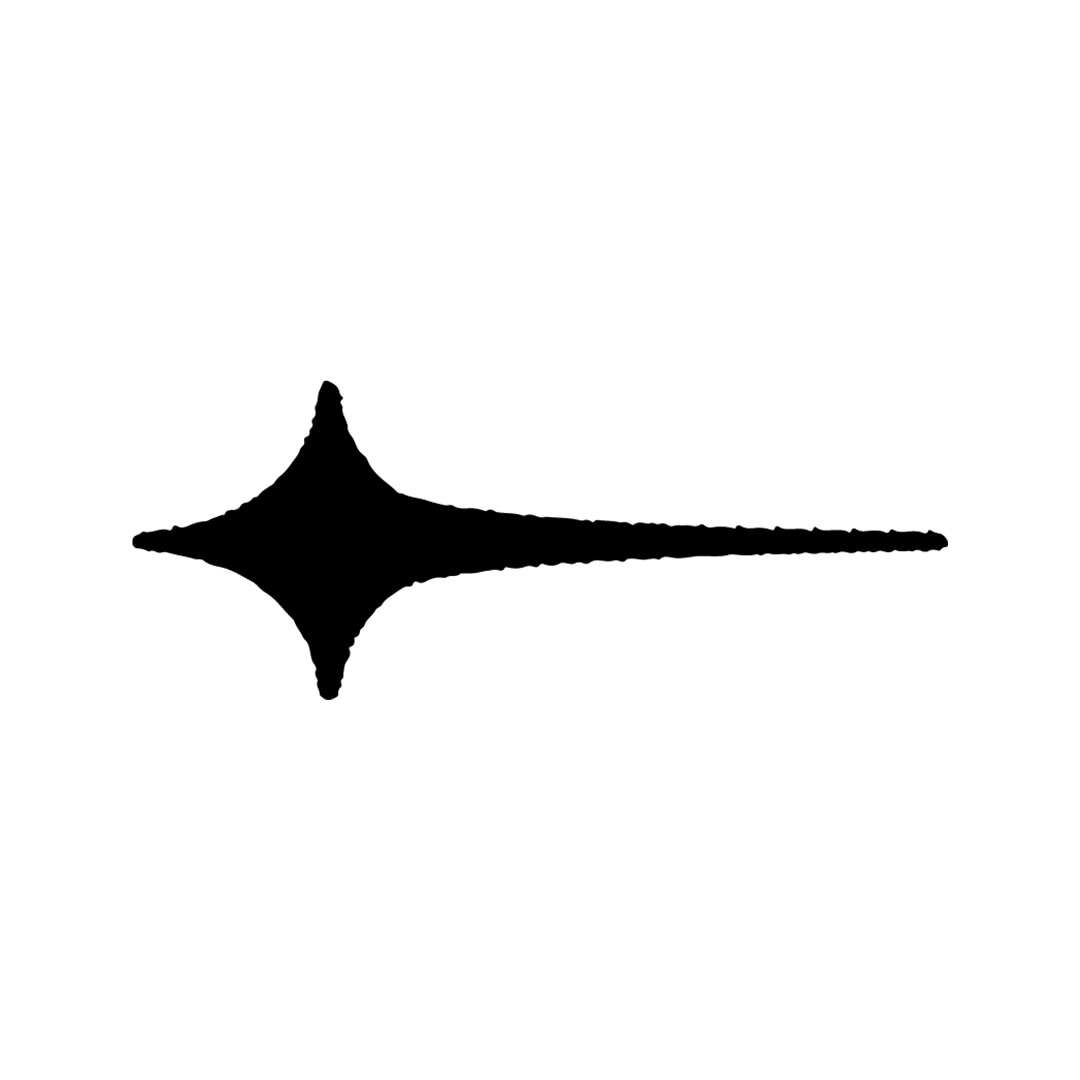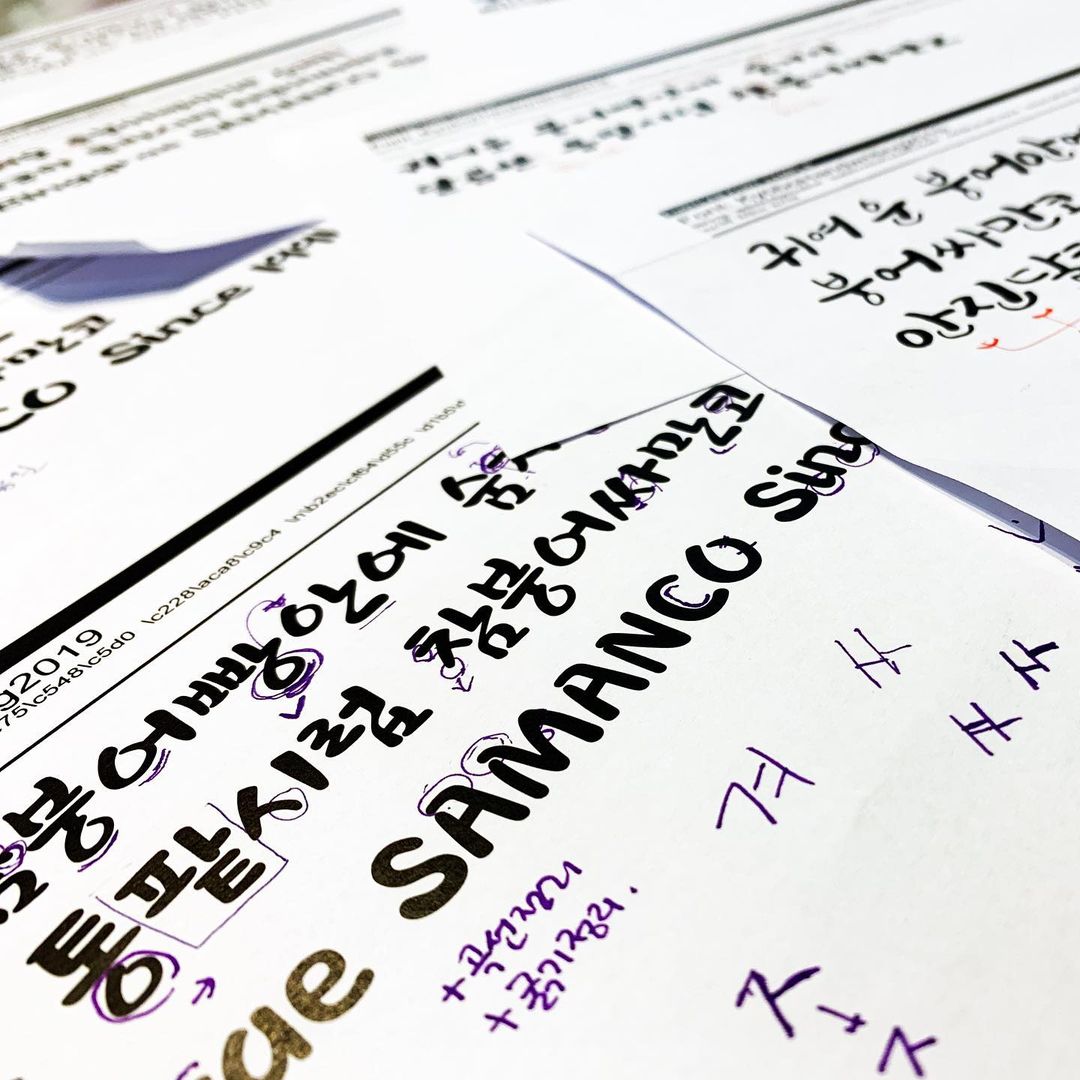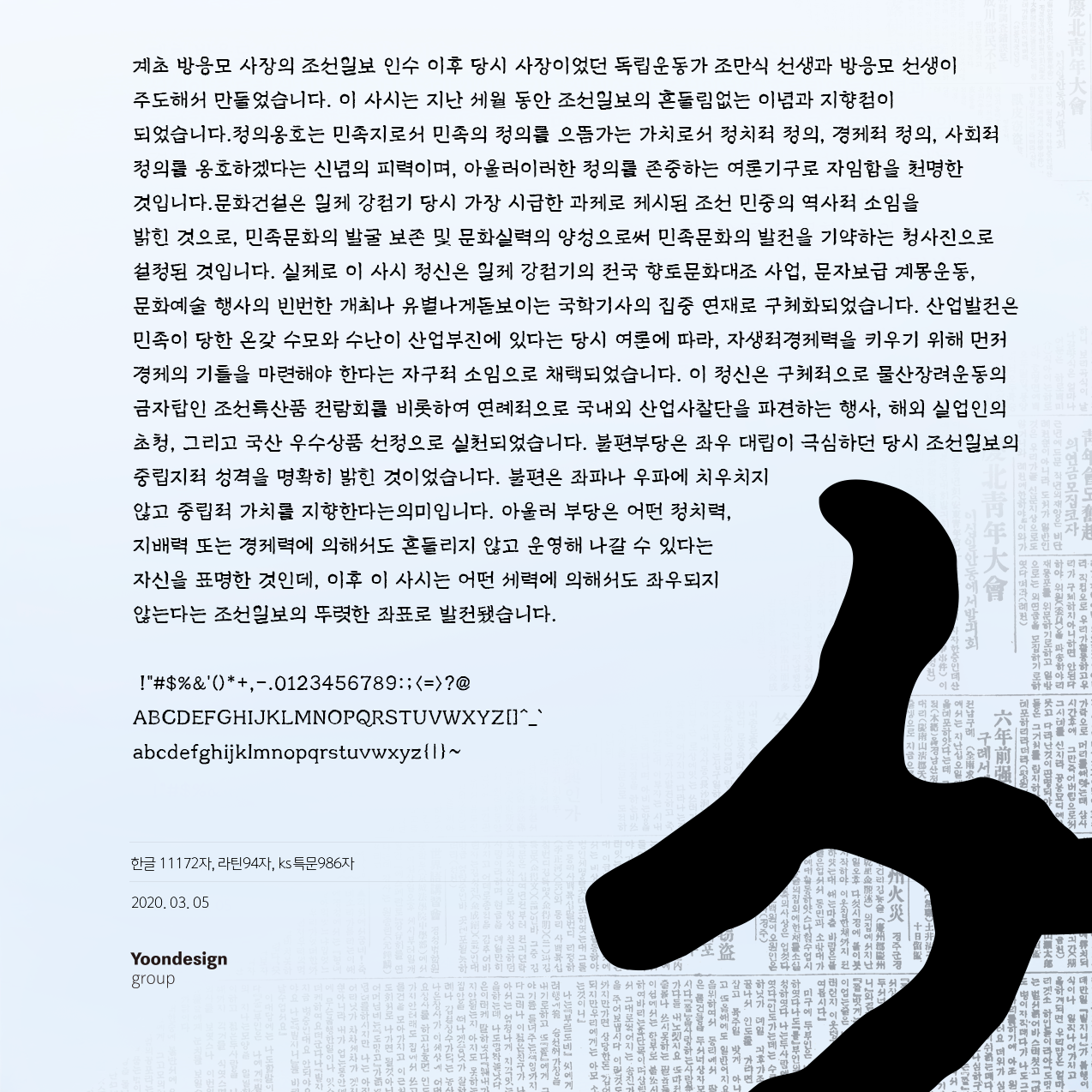2002년 6월에 설립된 웹 디자인 스튜디오 ‘비쥬얼스토리’(www.visualstory.co.kr)는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다. 현재 위치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이사 온 지는 5년째. 스튜디오의 히스토리 절반을 ‘홍대 앞’이라 불리는 이 동네에서 지내온 셈이다. 그동안 비쥬얼스토리는 ‘웹’이라는 디지털 공간을 디자인해왔다. 기업 웹사이트를 비롯해 원더걸스와 2PM 등 가수들의 홈페이지 작업을 해오며 웹 디자인 분야에서 입지를 다졌다. 아무래도 디지털 친화적일 것만 같은 곳이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반대다. 각종 고철들, 빨래판, 돌멩이, 화분 같은 것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흡사 시골집의 정경 같기도 하다. 이 소품들은 비쥬얼스토리 대표인 안병국이 손수 가져다 놓은 것들이다. 10년 이상 웹 디자이너로 살아온 그는 “오래된 고물처럼 손때 묻은 디지털이 좋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캘리그래피와 도예 등 손때를 묻혀가며 작업하는 일을 즐긴다고 한다. 스튜디오에 따로 캘리그래피 작업실까지 마련해놓았을 정도다. 묵향이 감도는 웹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덩달아 사람 냄새도 나는 듯하다. 안병국이 ‘손때 묻은 디지털’을 위해 작업하는 곳, 비쥬얼스토리를 구경해보자.




스튜디오 식구들이 축구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데에도 사용된다고.

심지어 스튜디오 식구들의 사적인(?) 메시지까지 적혀 있다. 그중 하나. ‘의욕 제로! 아놔 살리도~’


스튜디오 곳곳에는 이렇게 누군가 쓰다 버린 물건들이 장식품처럼 놓여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적절한 조화가 좋은 웹 디자인을 만든다”라고 말하는 안병국이 직접 꾸민 인테리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공존을 강조하는 그답게 컴퓨터와 붓을 한 공간에 놓아두었다.

아직까지 보관해왔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들이 광복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작품.

군 복무 시절에 만든 것으로 제목은 <열린 생각 유치한 사고>이다. 군대 행정반에 있던 종이와 제본기를 활용해 수작업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왜 홍대앞인가?
회사 초창기에는 서울 사당동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어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그러고는 돈암동으로 옮겼다가, 2007년에 이곳 홍대 앞으로 왔다. 스튜디오 위치가 서울 외곽 쪽일 경우, 변방 혹은 2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또 아무래도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보니, 이런저런 볼거리가 많은 홍대앞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 이사를 오게 되었다.
왜 하필 고물들을 갖다 놓았나? 혹시 디자이너들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자극하려고?
그들보다는 내 크리에이티비티를 위해서다(웃음). 길거리에서 고물들을 보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꼭 어딘가에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주워온다. 또 고물이란 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던 물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손때 묻은 것들이 좋다.
왜 회의 공간을 개방형으로 둔 것인지?
예전에는 지금처럼 개방형이 아니라 ‘회의실’을 따로 두었다. 그런데 스튜디오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내부에서는 굳이 비밀스럽게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것이었다. 나 역시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의 공간을 열어놓았다.
왜 회의 공간에 온도계를 붙여놓았나? 열정의 온도를 재려고?
내가 붙인 건 아니고···. 디자이너들이 붙여놓았다. 음,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건물 관리자가 난방을 제때 안 해준다. 계속 온도를 확인하면서 관리자에게 따지려고 한다.(웃음)
왜 이렇게 술이 많은가?
오해하지 말아달라. 나는 결코 애주가는 아니다(웃음). 강병인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은 술들을 쌓아두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