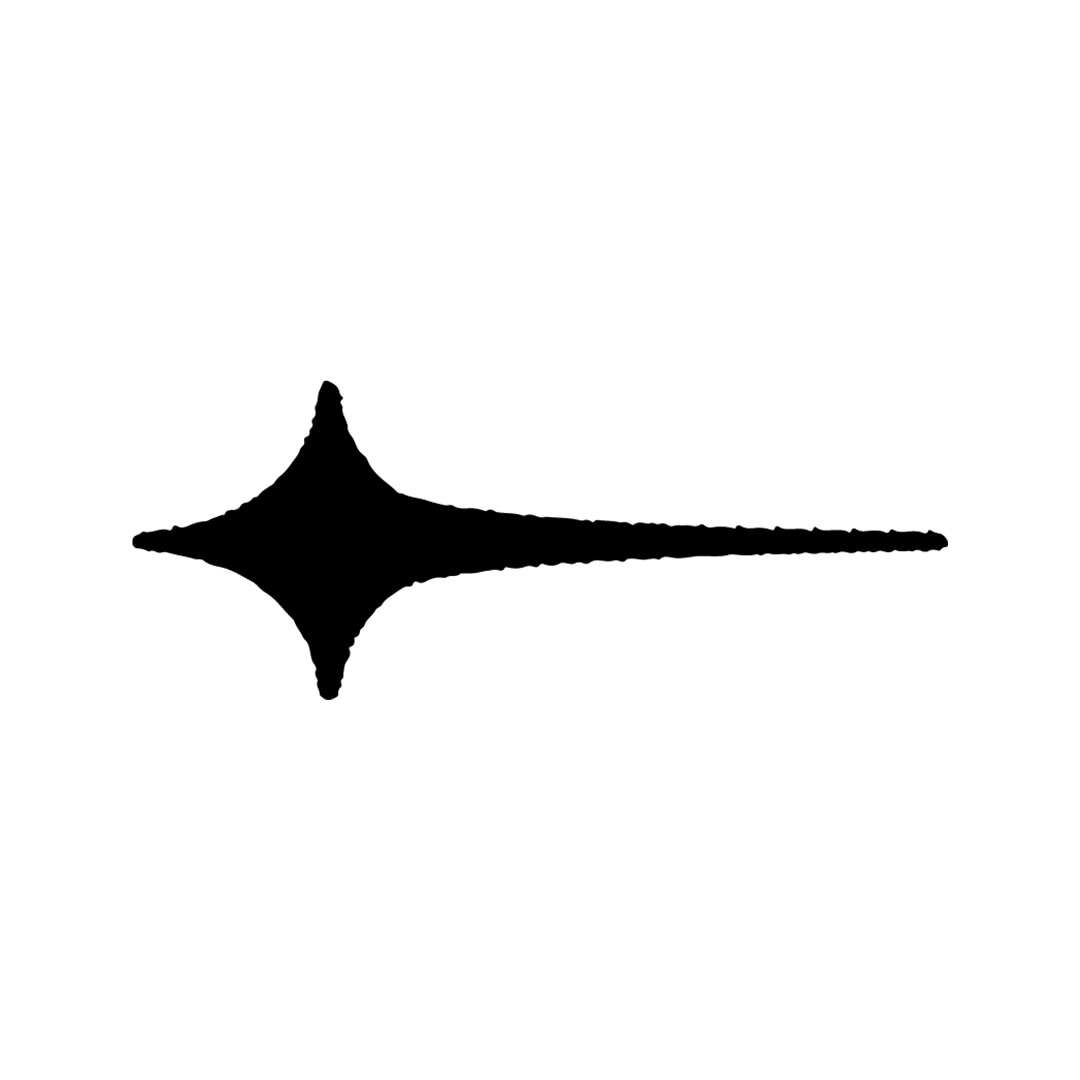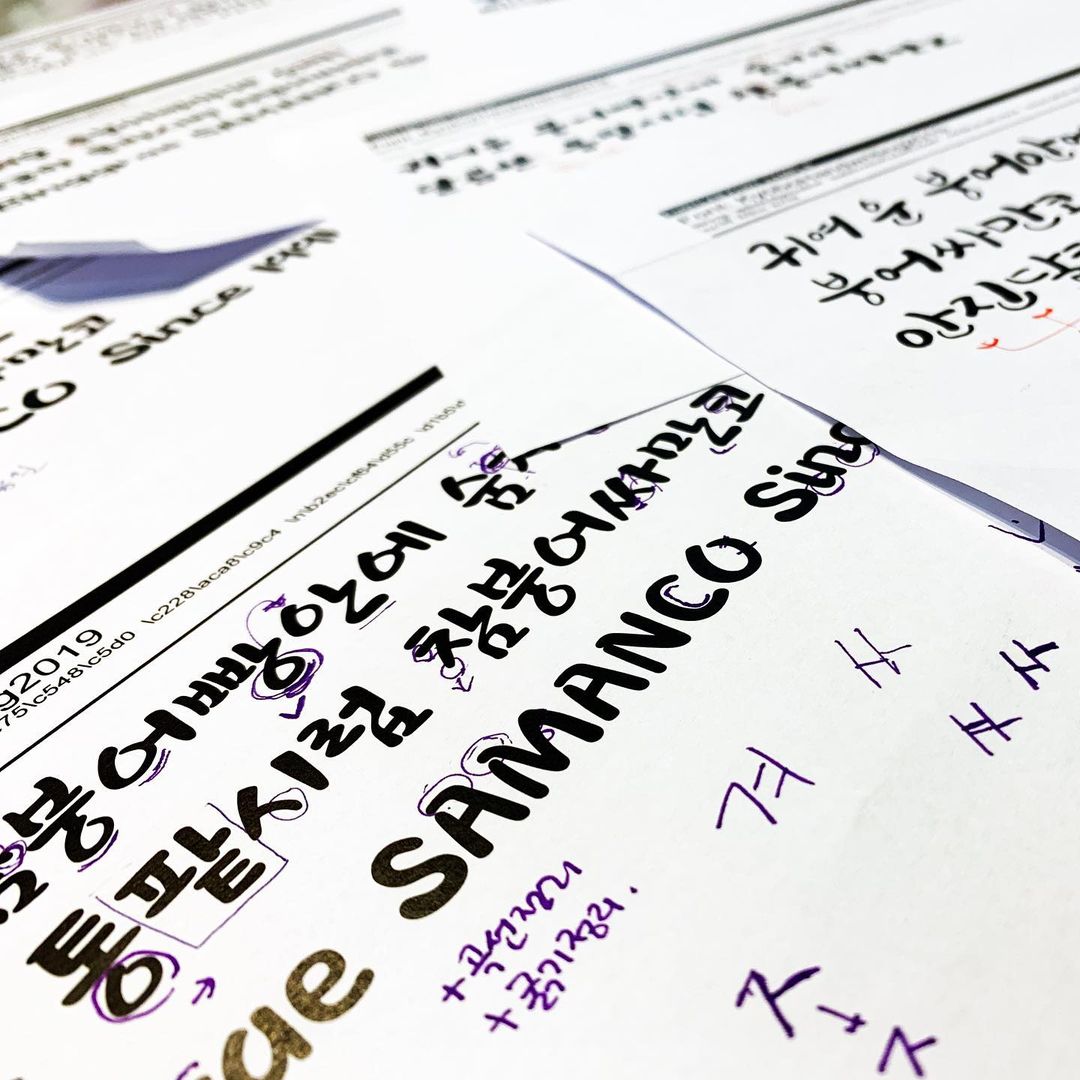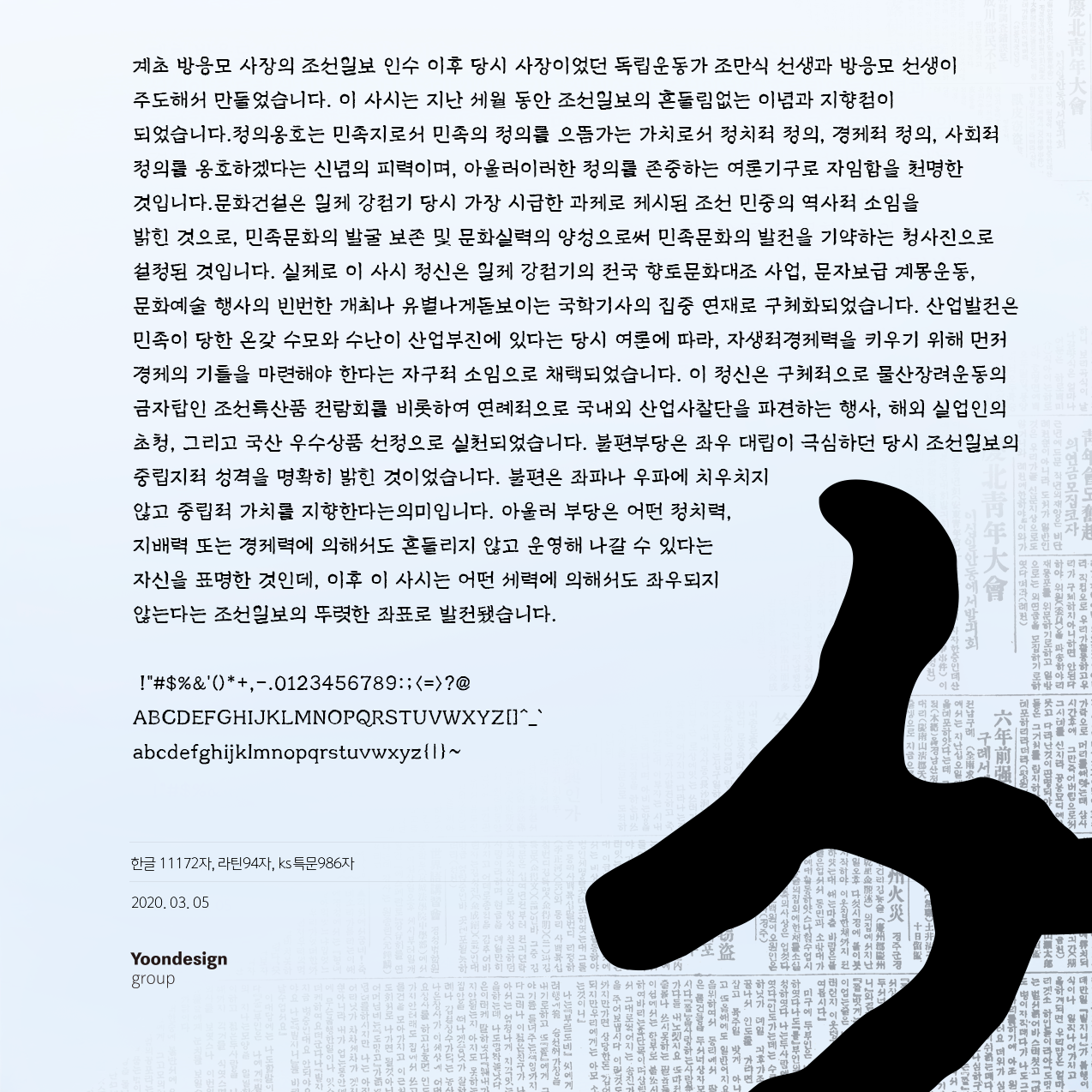수리수리 마수리~ 홀라당 낡은 집이 새집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상하지. 참 친근하다. 분명 모던의 옷을 완벽히 입었건만 예스러움도 생생하다.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히스토리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집수리 목수 김재관. 흙 한 줌, 나무 한 그루에도 맞는 새 옷을 입히고 싶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촉망받던 건축가에서 집수리 목수로의 삶, 그 깊은 이야기를 들어본다.

‘건축가’에서 ‘집수리 목수’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아주 탁월한 건축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열심히 했지요. 그렇게 애쓴 만큼 성취감도 있었고, 심지어는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에겐 재능이 없구나.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나 뼈아픈 고백이지요. 처음엔 고통과 열등감으로 괴로웠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모든 콤플렉스가 한꺼번에 소멸하는 느낌이랄까.
이 비슷한 시기에 15년 동안 했던 교회 건축을 그만두는 일이 있었어요. 한때는 교회 건축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을 만큼 몰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더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속한 사람들과 어느 선 이상 동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잠시 모든 일을 멈추었었죠.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하는 문화의 밤 행사 중 일회건축사무실이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축과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건축 사이를 좁히자는 취지가 있었죠. 그렇게 대중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건축가로 제가 선정된 거지요.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수리’도 할 줄 아느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예”라고 한 거죠. 낡은 집을 고치기 위한 설계는 처음이었는데, 그걸 끝내고 나니 저더러 지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또 “예!”라고 했지요. 정말 무모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했어요.(웃음)


‘건축’과 ‘수리’는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건축은 작곡이고, 수리는 편곡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수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신축은 그렇지 않아요. 새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맥락이 있고 인문학적인 바탕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걸 찾기에는 우리나라 도시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모두 새롭게 축조된 것들이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스토리를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신축에 매력을 못 느껴요.
반면 수리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집에 대한 인간의 히스토리. 이만한 재미가 없지요. 건축이 아니라 사람이 개입되는 것. 그들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들의 초청으로 제가 일정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되었나요?(웃음)
수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집 사람들이죠. 생각과 소망들. 그런데 어려운 건 그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마치 꿈처럼 얘기하죠. 그래도 너무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 몇 마디 툭 던져요. “아저씨, 다락방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은 확 터 주세요. 시원하게”. 그런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런 핵심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이유로 나왔을 뿐이지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집을 확 터달라고 얘기했던 그들은 어쩌면 지하실 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햇빛에 목마른 사람일지도 몰라요. 건축주는 옹알이처럼 말을 하고, 건축가는 그걸 잘 해몽해야 해요. 꿈을 던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거예요?
수리를 엔지니어 분야에서 시공학이라고 말한다면 신축을 염두에 둔 프로세스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익숙하죠. 기술자들마저요. 그런데 수리는 그 프로세스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잘하는 기술자들도 여기에 오면 소용이 없지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 부분이 매우 힘들어요.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막막할 때도 있지요. 물어볼 데가 없으니.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재미에요. 그 재미에는 힘들다는 것이 포함되지요.
저는 집 설계를 싹 다시 해요. 많은 건축주가 그걸 원하죠. 현재 있는 집은 지어질 당시에 최적화된 생활 모습을 반영한 집들인데, 지금 이미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 아버지가 입던 옷을 못 입는 이유가 패셔너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체격부터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옷감만 놔두고 모두 손봐야겠지요. 기능에서부터 맵시까지 지금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 수리는 그 정도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주로 어떻게 떠올리시나요?
떠올린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에 대한 분석이 있을 뿐이죠. 필요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지. 건축은 순수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가당치 않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들이 참 재미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글들인가요?
남이 너무 몰라주면 소외감 느끼지 않나요? 사실은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재미있어요. 그걸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제가 잠망경이 돼서 프락치처럼 현장에 들어가 친구들에게 “야! 이거 재미있다!”하고 싶더라고요. 혼자만 꿀꺽 먹기에는 음식이 아주 맛있는 거죠.
현장에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인부들은 잠깐 동안 몇십 년의 이야기를 풀어놓거든요. 서로가 타인이기 때문에 말하기 쉬운, 그러나 깊은. 가끔 허풍도 섞여 있지만, 순진한 수준의 거짓들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출판 계약을 여러 군데 했어요. 아직 기록을 하기보단 느끼는 시간이 좋아서 한 권도 못썼지만요.(웃음) 조만간 열심히 써야겠지요. (블로그 링크 페이스북 링크)
김재관을 공구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도끼’ 같아요. 전 완벽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분명한 개념을 만지고 싶어해요.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아주 명쾌한 그 무엇.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수리라는 말이 뭘 고친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닦을 수’, ‘다스릴 리’ 자를 쓴단 말이에요. 닦고 다스린다. 이게 진정한 설계이지요. 얼마 전 한 대학교에서 저를 불러 자기네 교사가 폐허가 됐는데, 이 건물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보통은 쓰임을 말하고 방법을 묻는데, 저에게 쓰임을 묻다니. 저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목적부터 정해서 만드는 것. 그래서 그 건물을 컨설팅하겠다고 했어요.


무엇이 수리를 계속하게 하나요?
어느 외국 배우는 극 중에서 6명의 배역을 혼자서 했다고 해요.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났죠.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디테일을 몰랐다면 그렇게 완벽하고 세세하게 만들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디테일만 가지고는 안돼요. 커다란 서사도 읽을 줄 알아야 하죠. 때론 그 두 가지가 모순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어요. 마치 천재나 그 둘을 넘나들 수 있는 것처럼. 전 천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루고 싶은 것이 목적이에요.
농담 삼아 그러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나로부터. 나에 의해서.” 이것이 제가 수리에 뛰어든 이유에요. 내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요. 미치도록 궁금해지고 보고 싶어요. 내 생각이 맞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기쁨 같은 것들이 범벅돼서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마치 중독처럼.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요.
* 기사에 쓰인 사진 중 일부는 건축 전문 사진가 박영채의 작품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