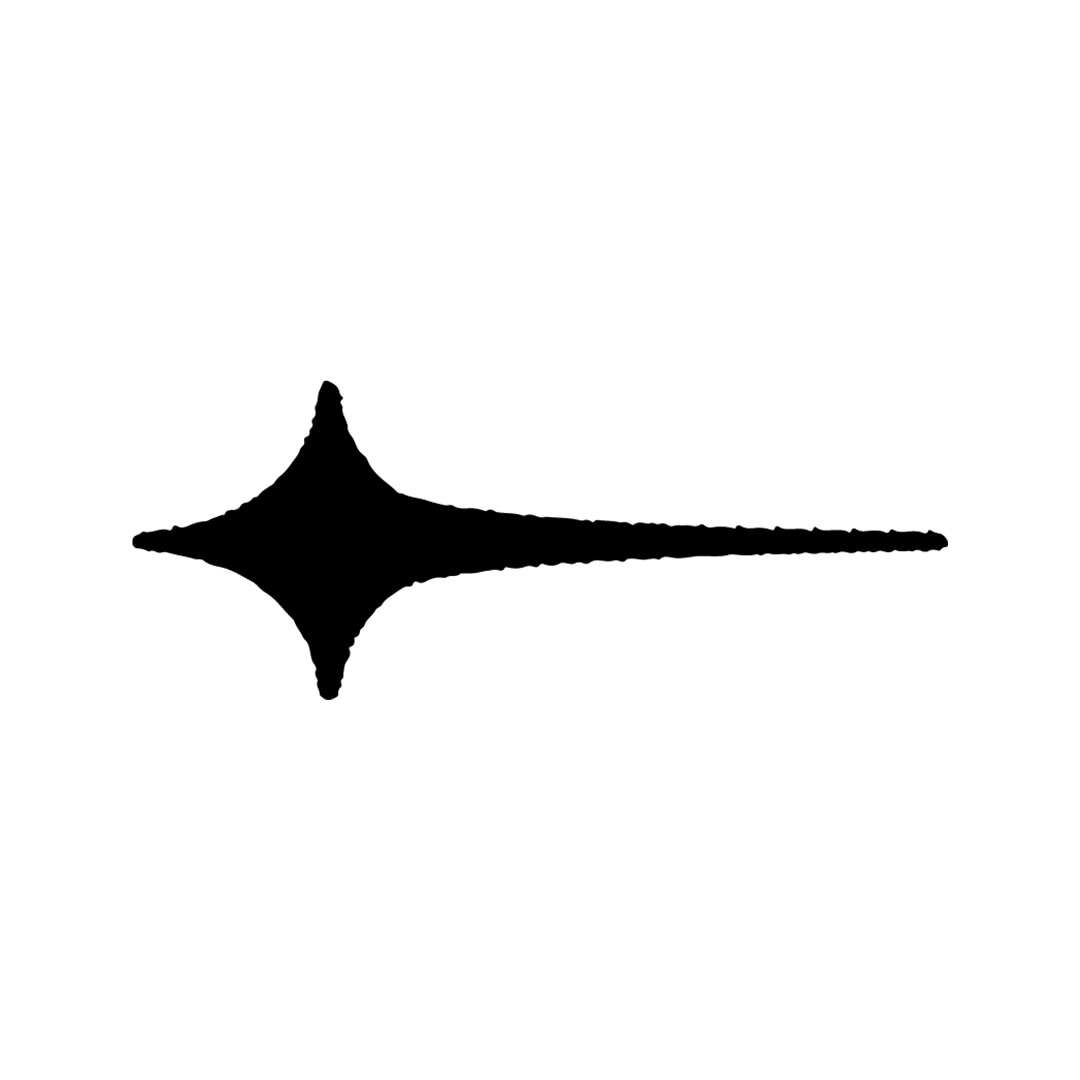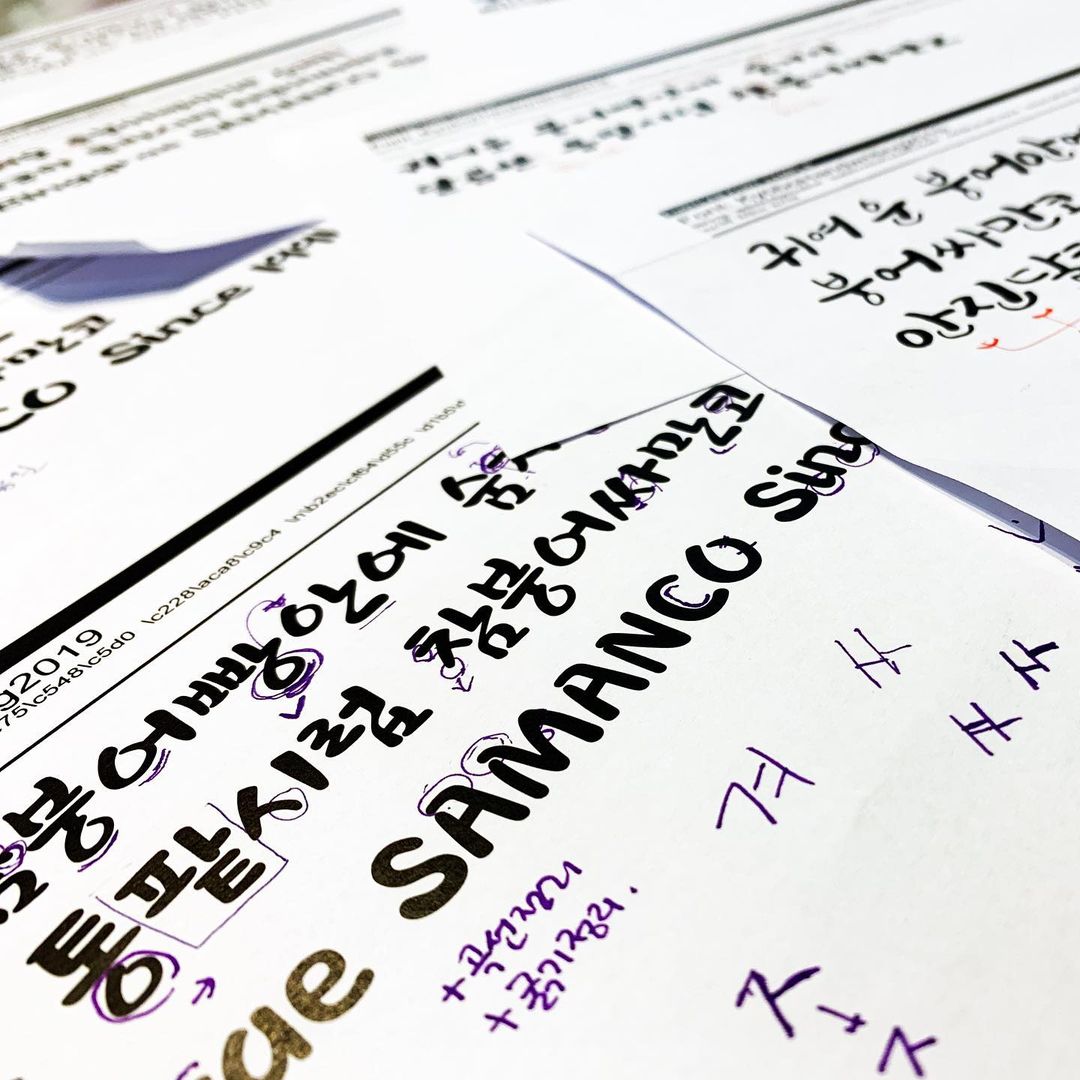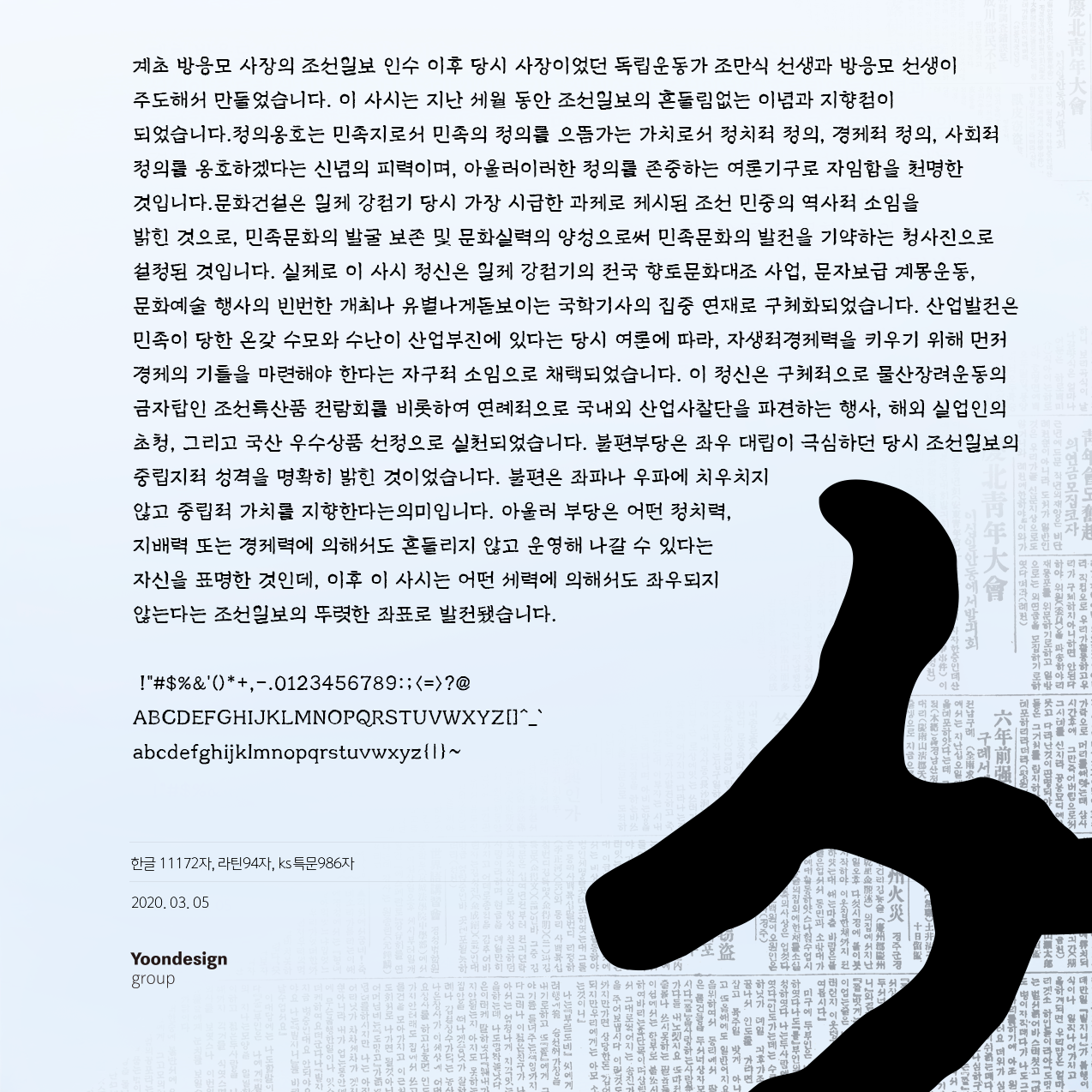그가 살며시 손을 흔들었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어디선가 바다 냄새가 났다. 푸른 바다가 소금이 되기까지의 시간, 그 속에 녹아 있을 햇빛과 바람과 수많은 노동. 아름다운 하나의 이미지가 그를 통해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는 어떤 시간을 통과해왔을까.

프린트, 아이덴티티,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애착을 느끼는 분야가 있나요?
열심히 한 건 다 애착이 가죠. 빨리 잊고 빨리 시작해요. 큰 일 하나를 오래 잡고 있기보다 작은 일 여러 개 하는 걸 좋아하고요. 늘 최근 작업에 열의를 갖고 애정을 쏟죠. 끝내고 나면 다른 것에 금방 관심이 가요.
<소금꽃이 핀다>로 국제적인 Core77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셨죠. 일상적인 소금이 이렇게 훌륭한 오브제가 될 수 있다니, 신선했어요.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심플하게, 한글 자체가 주는 조형성과 구조적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당시 유행하던 민속에 대한 뻔한 테마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파랑색과 흰색이 주는 선명한 색채대비와 바다와 소금이라는 오브제의 결합도 인상적이었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블랙사바스―심장을 울리는 드럼, 영혼의 절규처럼 다가오는 일렉트릭 기타. 블랙사바스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았던 소년 재민은 재즈와 인디음악을 흥얼거리는 어른 이재민이 되었지만 그에게 음악은 한때의 취향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뮤직 그래픽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릴 때 헤비메탈을 좋아했어요. 자연스레 LP를 모았죠. 커버들이 지금보다 예술적이랄까, 정교한 유화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좋아했던 커버들은 영국 디자인 팀인 ‘힙그노시스(Hipgnosis)’ 작품들이 많았더라고요. 이런 거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세포 깊숙이 각인된 환상적 분위기가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커버와 북클릿 작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음악을 열심히 들어요. 가사를 음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리에 어떤 이미지를 얹어주면 좋을까를 생각하죠. 감각에 필 받아서 작업하기보다 텍스트를 놓고 고민해요. MP3로 다운받아 듣는 것과 시디를 사서 듣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이미지를 보고 기대하는 사운드도 있을 것이고. 보면서 들으면 공감각적 총합이 훨씬 커지니까요.
음악의 영향 때문인지 다른 작품에서도 자연스럽게 내적인 리듬감이 느껴져요.
작업할 때 자주 음악을 들어요. 나이가 드니까 말랑말랑한 음악이 좋아지기도 하고. 아이돌 음악도 편견 없이 듣고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해요. 뭔가 꾸며서 보여주는 게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과가 있으면 껍질 까고, 씨앗 꺼내고 이런 것보다 그냥 사과를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해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위 왼쪽부터] 몽구스 ‘Girlfriend’(2012), 이재민·이화영 공동 작업 / 한강의 기적 1집(2011)
[아래 왼쪽부터] 흐른(강정임) 2집 ‘Leisure Love’(2011) / 원펀치 1집 ‘Punch Drunk Love’(2012), 이재민·이화영 공동 작업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The Pains Of Being Pure At Heart>, <수요生음악회>, <서울서울서울>, <그 많던 해파리 떼들은 모두 어디에>

‘그러나’보다 ‘그리고’가 어울리는 사람. 혼자이되 여럿이 함께 할 줄 알고 프라이드를 지녔으되 소통하려 노력한다. 진지한 눈빛을 지녔지만 웃으면 콧잔등에 귀여운 주름이 잡힌다.어른스럽다. 그리고 개구쟁이 소년 같다.
이재민 개인에게 Studio fnt는 어떤 의미인가요?
개인 작업실이자 공동 작업실이기도 하고 동료를 만나는 채널이죠. 조직이라기보다는 공간의 의미가 커요. 디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thought)을 눈에 보이는 폼(form)의 형태로 구현해내는 작업이잖아요. 스튜디오 이름도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다양한 것을 실험해보고 도전하는 곳이죠.
과거의 작업이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작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작업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서 녹아나는 것들이에요. 순대 먹을 때 경상도 분들은 막장에 찍어 먹잖아요. 저도 자신의 취향대로 체험하려고 노력해요. 거긴 너무 덥더라, 그거 맛있던데, 등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이 쌓이면 언젠가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아티스트와 공동 작업을 하면서 얻었던 성과라면 어떤 게 있나요?
다른 견문을 얻는 것이려나. 그것도 공짜로.(웃음)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것도 함께 하면 가능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게 재미있어요. 소규모 공동 작업을 좋아해요. 공동의 목표를 공동의 취향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주로 작업해요. 포트폴리오 볼 때도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보다 기호와 취향의 방향성을 보는 편이에요.


냉면―점심으로 먹은 냉면 한 그릇, 식후의 달달한 아이스 카페라떼 한 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 우리가 대화하고 걷고 사랑하는 오늘 하루. 그는 천재적 영감보다 먹고 보고 듣고 살을 맞대는 일상의 힘을 믿는다.
냉면 그릇 하나를 봐도 디자인은 이미 삶에 깊이 배어 있잖아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래픽 디자인만 특별히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저와 제 작품을 보신 분 사이에 ‘인연’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생각은 해요. 같은 걸 봐도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뭉툭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보다 교감할 수 있는 소수를 위해 좀 더 뾰족한 것도 만들고 싶은 거죠.
‘이재민 스타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서(웃음). 오히려 ‘나는 디자이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디자이너기 때문에 특별하고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얽어매는 족쇄가 될 위험도 있고 진부한 클리쉐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전 제 일상을 사랑하고 평범함이 주는 가치를 소중히 여겨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당장은 9월 18일부터 시작하는 명동예술극장 의 포스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패키지 작업이 있네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현장에서 작업하고 싶어요. 냉면처럼 가늘고 길게(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