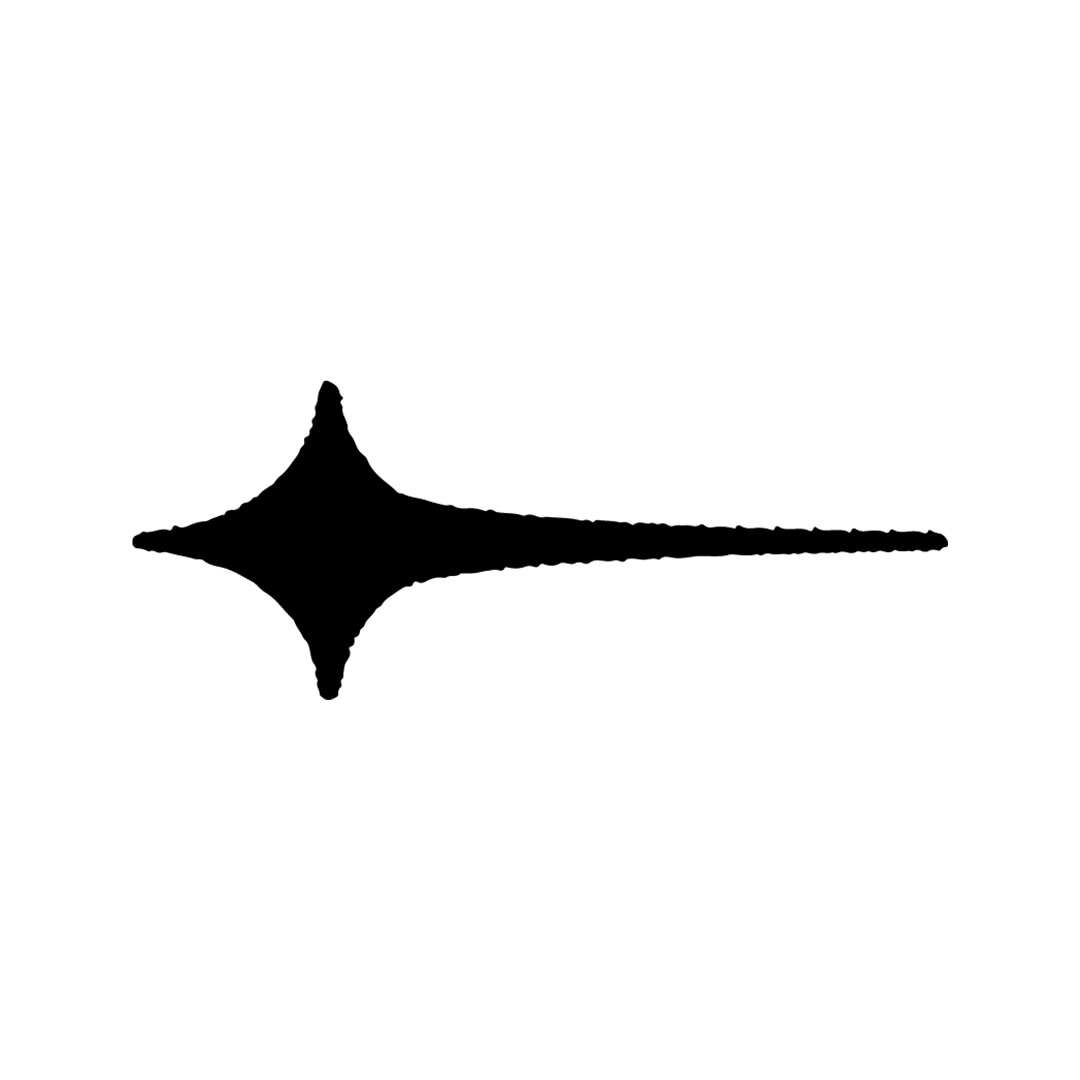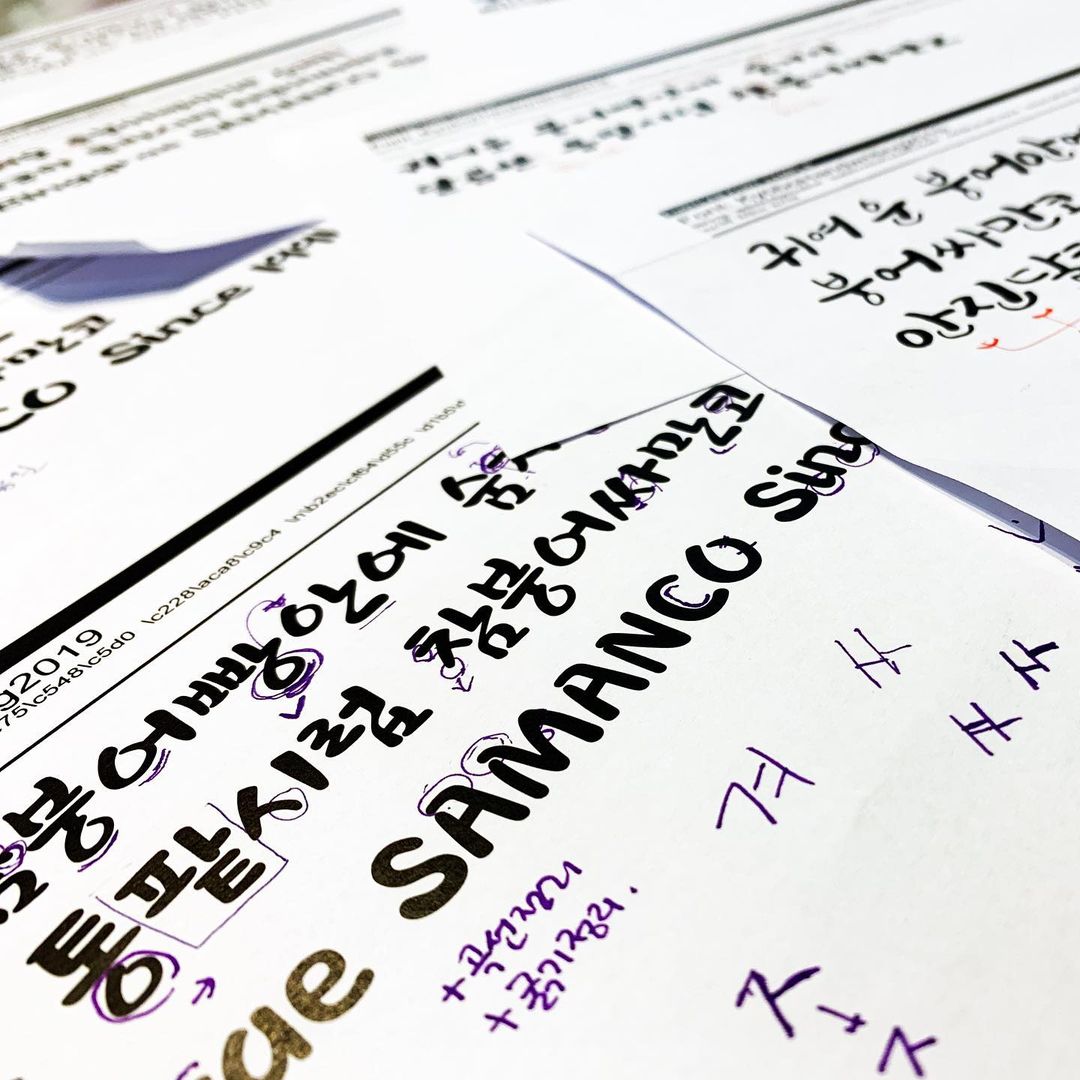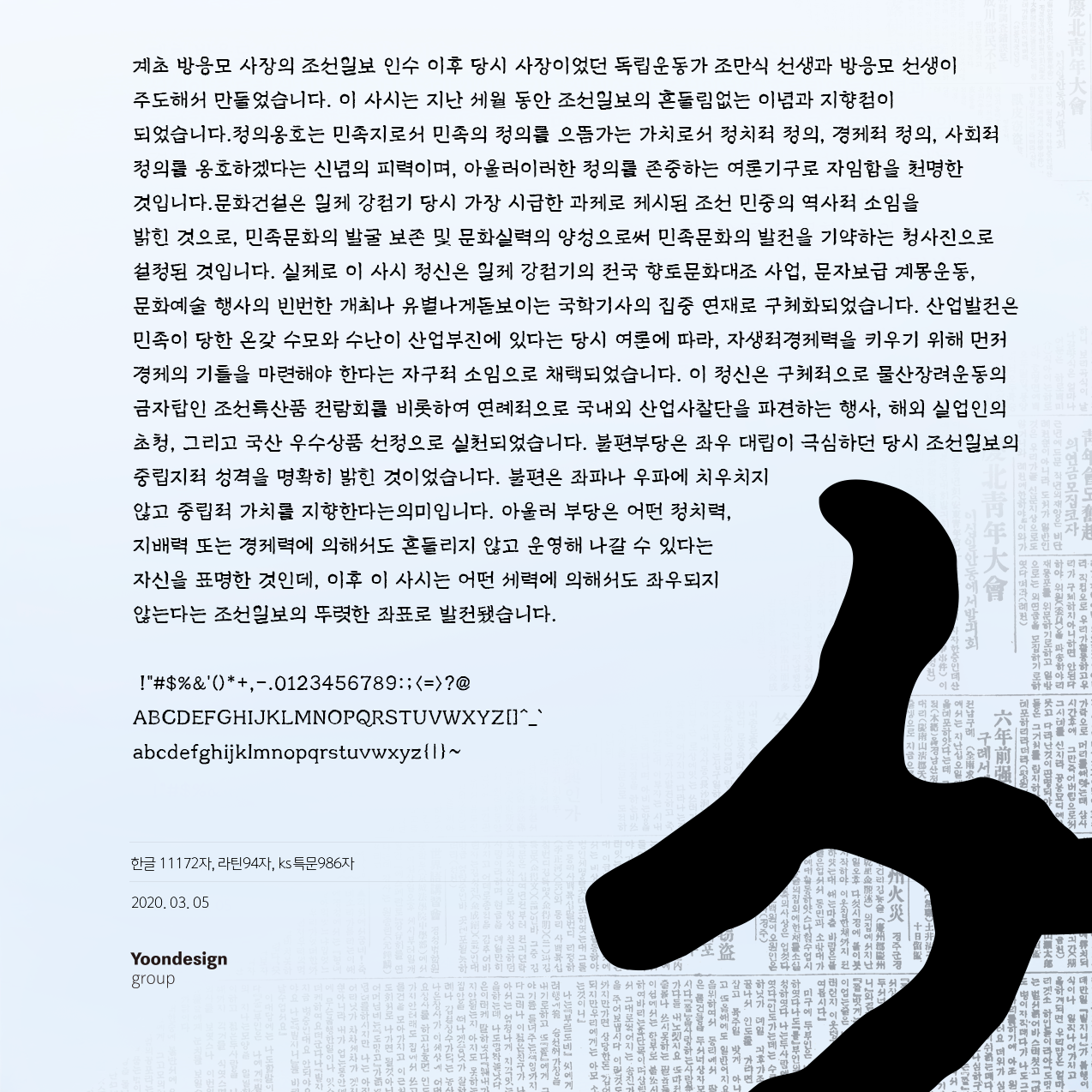이 인터뷰는 순전히 우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태원 거리의 간판 글자들을 카메라에 담다가 벌어진 일이 이번 인터뷰다. 눈에 띄는 레터링을 이정표 삼아 걷다 보니, 서울 중앙 성원 앞을 지나고 있다. 우사단길(정확히는 우사단로10길)에 온 김에 도깨비시장까지 가보기로 한다. 가는 길에 햇빛서점에도 들러볼 참이다.(지난해 『타이포그래피 서울』에 실린 인터뷰 잘 읽었다는 인사도 건넬 겸.)

이태원에서 가장 한산한 지역이 바로 이 서울 중앙 성원부터 도깨비시장까지 이르는 길이라더니, 과연 인적이 드물다. 간판 사진 찍느라 행인을 막고 설 일이 없다. 그렇게 세월 네월 셔터를 누르다 발견한 것이 ‘This Retro Life!’라 적힌 간판―이라기보다 로고. 구제품 가게인 모양이다. 통유리 너머로 책이며 시계며 구식 라디오며 온갖 것들이 진열돼 있다.


남 실장과 종이컵 커피를 마시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건 ‘This Retro Life’ 로고 스티커 몇 장을 챙기려는 목적이다. 진열장 위에 놓인 스티커들이 가게 밖 낯선 이의 시선을 붙든 것이다. 얼마든 가져가도 좋다고,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꽤 푹한 날씨인데도 야상을 걸치고 볼캡을 쓴―가 말한다. 로고 디자인은 직접 한 거냐고 물으니 뜻밖의 솔깃한 대답이 돌아온다.
“푸하하하프렌즈라고,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건축가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서 디자인도 하고 소설도 쓰는 한승재 씨가 만들어줬어요. 콘셉트는 제가 잡은 거고요. 좀, ‘미제’ 느낌이 났으면 해서, 『롤링스톤』 잡지 제호 서체를 쓰고 전체적인 느낌은 러키스트라이크 담배 패키지스럽게 해달라고 했죠. 30분 만에 후딱 완성해주더라고요.”
푸하하하프렌즈 한승재, 한양규의 인터뷰가 3년 전 『타이포그래피 서울』에 실린 적이 있다. 처음 본 가게 주인과의 연결고리 하나가 발견된 것. 서로 통성명을 하고 명함을 교환한다. 호칭을 사장(님)이라고 하려다가, 명함에 적힌 직함대로 부르기로 한다. 디스레트로라이프 남승민 실장.

종이컵 커피를 받아들고 의자에 앉는다. 『타이포그래피 서울』이란 매체에 대해 설명하니, 남실장은 잠깐 기다려보라며 좁은 가게 어딘가로 사라진다. 이내 헌책 세 권을 들고 와 자신의 의자에 앉는다. 다행히 손님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 자리가 마련된다.
남 실장 손에 들린 건 글자와 관련된 옛 책들이다. 그중 한 권인 『글자를 빨리 만드는 법』은 어느 목사가 쓴 것이다. 1980년대 교회 신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부활절이나 부흥회 같은 큰 행사 때면 신도들이 직접 글자를 도안해 오려 붙이는 식으로 홍보 인쇄물을 만들었는데, 그럴 때 참고하는 용도다.
나머지 두 권의 제목은 『약화·도안 사전』. 1975년에 나온 것으로, 당시 교사들이 애독하던 『새교실』이라는 잡지의 부록이다. 동물과 사물, 도형, 글자 들로 장마다 채워져 있다. 교사들은 이걸 보고 ‘정숙’, ‘뛰지 맙시다’ 같은 글자들과 교훈 등을 그리고 오렸다고 한다.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담임이라면 각종 동물 그림들과 그것들의 이름 글자를 정성껏 따라 그리고 오렸을지도. 70년대에 이른바 ‘환경미화’라 불리던 교실 꾸미기의 단상이다. 이런 옛 일상이 어쩌면 우리나라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남 실장은 말한다.

“한국 타이포그래피의 또 다른 족보랄까요?(웃음) 제대로 된 조건과 환경에서 정식으로, 전문적으로 발전해온 쪽이 있었던가 하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반인들이 타이포그래피를 해왔던 것 같아요. 70~80년대 한국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은 일상의 현장에서 태동됐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려나? 말도 안 되나요?(웃음)”
말이 되고 안 되고보다, 혹시 디자인을 공부했거나 디자인계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가 더 큰 관심사다. 물으니, 문학을 전공했단다. 문학 잡지 『악스트』에 사물 에세이를 연재 중이고, 한때 해외문학 서평도 썼다. 출판사를 하는 지인을 도와 편집 일도 잠깐 했다.
“글 쓰는 일이 본업은 아니고요. 그냥 장사꾼이죠. 원래는 종로4가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중고 손목시계 나까마 일을 했었고요. 아, ‘나까마’라는 게 일본어로 ‘동료’나 ‘친구’를 뜻하는데 한국에선 그냥 ‘도매상’으로 통해요. 업계 용어처럼.(웃음) 여기 우사단길 온 지는 한 3년 됐네요.”
‘쇼와 레트로’와 ‘카시오’를 기억하며
‘This Retro Life’ 스티커가 놓인 진열대에는 ‘마성의 빈티지 교양인의 손목시계’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도 세워져 있다. 주인의 이력도 그렇고, 이 가게 주력상품이 아무래도 손목시계인가보다. 그렇다면 ‘(교양인의) 손목시계’와, 남 실장이 표방하는 ‘이 레트로(This Retro)’는 어떤 맥락으로 통하는 것인지. 문학도 출신이니 가게 상호와 주력상품 간에도 나름의 플롯을 설정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또 물어본다. 남 실장은 일본의 전후 시계 산업과 전자시계 브랜드 카시오(CASIO) 얘기를 풀어놓는다.

“1969년에 일본에서 쿼츠(quartz) 시계가 개발돼요. 쿼츠, 즉 수정 진동자를 활용한 건데요. 이전의 기계식 시계에서는 밸런스라는 게 돌아가요. 한 시간에 18,000번 회전을 하죠. 이걸 초당 진동 수로 환산하면 5~10Hz(헤르츠) 정도 되고요. 그런데 쿼츠는 대략 32,000Hz거든요. 이 진동 수가 말하자면 시간을 쪼개는 단위인 셈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피자 한 판을 네 조각으로 등분하느냐, 서른여섯 조각으로 등분하느냐의 차이. 잘게 쪼갤수록 한 조각이 다른 한 조각과 같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걸 1초로 삼으면 돼요. 원자 시계는 쿼츠보다 더 잘게 쪼개겠죠.
이 쿼츠 기술 이후에 LCD 패널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초기 단계인 건데요. 당시 카시오가 이 쿼츠랑 LCD, 그리고 자기네가 계산기를 제조하면서 쌓은 기술력을 결합시켜서 값싼 전자 손목시계를 만들었어요. 카시오가 원래는 계산기 만드는 회사였단 건 아시죠? 아무튼, 그러면서 진짜 쓸모없는 기능들을 시계 안에 다 담기 시작하거든요. 타이머, 스톱워치, 온도계, 기압계, 방수 등등부터 무슨, 무선통신을 결합한 게임 기능이 들어가질 않나, 종이 지도의 축척을 실거리로 환산해주는 특수 톱니까지 달려 나오고··· 진짜 별 쓸데없는 기능들이 전부 구현된 거예요. 저는 카시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들을(웃음), 말하자면 진정한 레트로의 집대성으로 보는 입장이죠.”
시계 얘기에 열을 올리던 남 실장은 종이컵 커피를 금세 비운다. 우리는 가게 앞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들어온다. 구제 지포라이터에 매달린 체인을 빙빙 돌리며, 남 실장은 “한마디로 그때는 모험과 과잉의 시대”라며 마저 얘기를 잇는다. 여기서 “그때”란, 카시오가 “말도 안 되는 시도들을” 지속했던 때다. 또한, 남 실장이 “쇼와 레트로”라 칭하는, 레트로의 오리진이라 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1926년부터 1989년까지를 연호로 ‘쇼와’라고 불러요. 근대화에서 고도자본주의까지의 시기인데요. 버블경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점도 이때랑 맞물리고요. 일본의 레트로 애호가들 사이에 ‘쇼와 레트로’라는 말이 있는데, 쇼와 시대에 나왔던 모든 물건들이야말로 최고였다는 찬사의 단어죠. 미국이건 유럽이건 당시 일본 제품들을 엄청 참고하고 베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 쇼와 레트로에 해당하는 시기가 뭐랄까, 모험과 과잉의 시대였다고 봐요. 카시오가 그런 모험과 과잉의 최전선을 선점했던 것 같고요. 카시오에서 일했던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칩 개발자 같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시계로 구현해보려고 아등바등했던, 지금 시점에서 보면 참 쓰잘데없는 실험과 시도 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시절이죠. 좋은 시절이랄까?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모험과 과잉의 시대’에 대비되는, 그러니까 오늘을 일컬을 만한 표어로 남 실장은 “냉소와 최적화의 시대”란 표현을 고른다. 빅데이터 시대라 부르는 요즘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빠삭한 정보들이 온오프라인상에 집적된 터이므로, 리스크를 감수한 ‘모험’이 원천 봉쇄된다. 따라서 반복적 모험 혹은 모험적 반복으로 인한 온갖 실험과 시도의 ‘과잉’은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남 실장의 생각이다.
“지금 제조사들은 투자한 만큼 회수하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효율 생각 안 하고 나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다간 투자자들도 죄다 끊기고 시장에서도 도태될 거고. 위험 부담을 안기가 어려운 구조죠 지금은. 그래서 더 옛날 물건들의 철학이 짙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은, 뭐랄까, ‘지금 내가 이만큼 보여줬으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걸 보여줘야지’ 이런 정신이 충만했달까요.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이 활발했던 때이기도 하니까, 그런 시류에 맞춰서 제조사들이 무리하게 꾸역꾸역 뭐든지 개발해댔던 것 같고요. 스마트 시계도 아니고, 80년대 전자 손목시계 하나 가지고 온도계, 기압계, 무선 게임 기능을 다 보여주려던 바로 그 정신.(웃음)”

손님들이 몇 들어온다. 남 실장의 레트로론은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락. 마침 손목에 스마트 시계가 채워져 있었으므로, 시간을 확인한다. 액정 화면엔 시간 말고도 요일과 날짜, 당일의 최저/최고 기온, 날씨 같은 정보도 활성화돼 있다. 이 역시 모험과 과잉의 2017년 버전이려나. 삼십 년쯤 지난 뒤엔, 자신의 손목이 ‘정유년 레트로’를 경험해봤던 희귀한 신체로서 경애의 대상이 돼 있을지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인터뷰 치고는 꽤나 오래 앉아 있었단 걸 알게 된다. 일면식도 없는 구제품 가게 주인의 사상을 물어 들은 행위 또한 모험에 속할 수도. 평일 한낮의 빈 가게에서 손님도 아닌 이를 과잉 접대한 시간 또한 남 실장에겐 모험이었을지도. 가게 주인과 손님 아닌 이의 시간―이 인터뷰도 레트로의 일각으로 남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