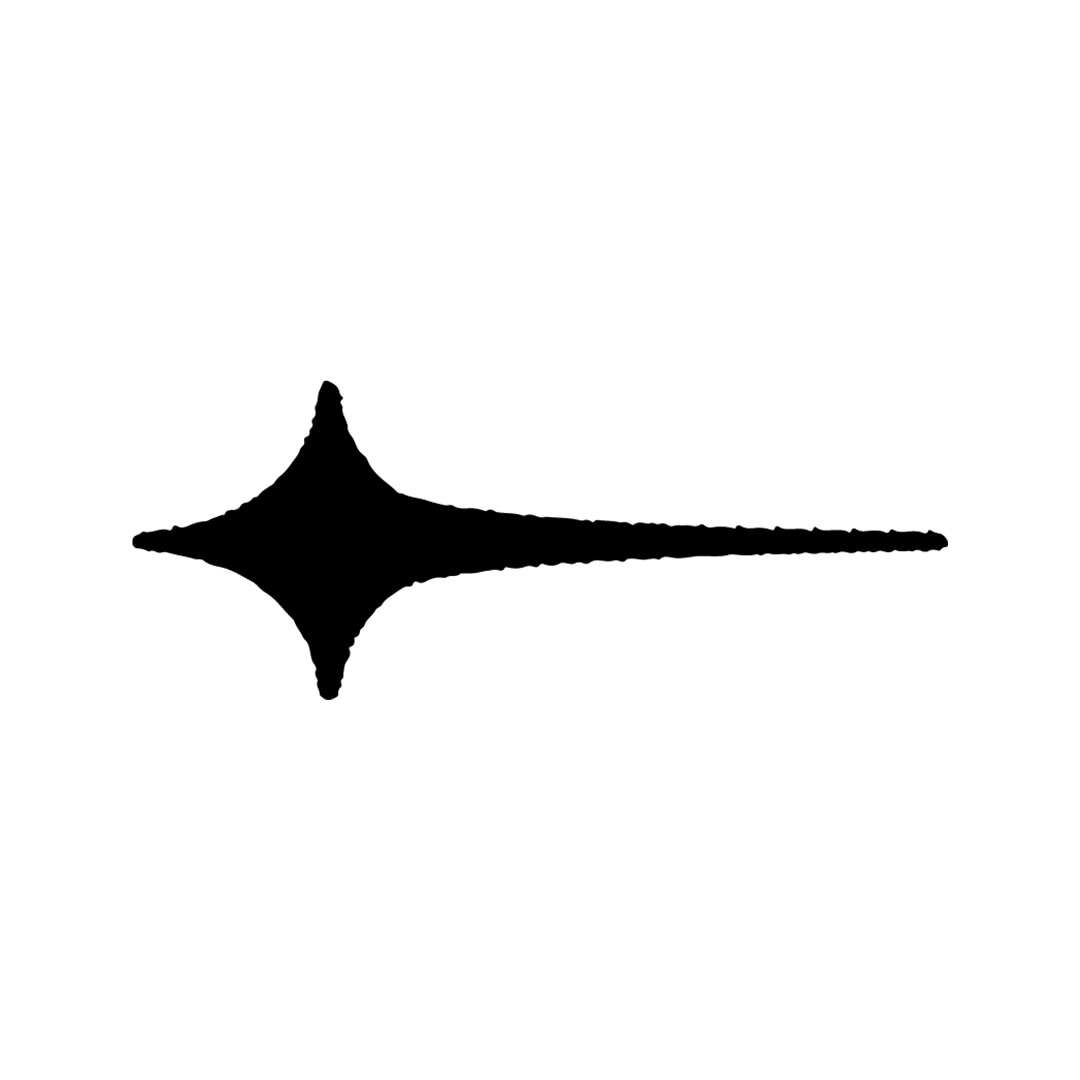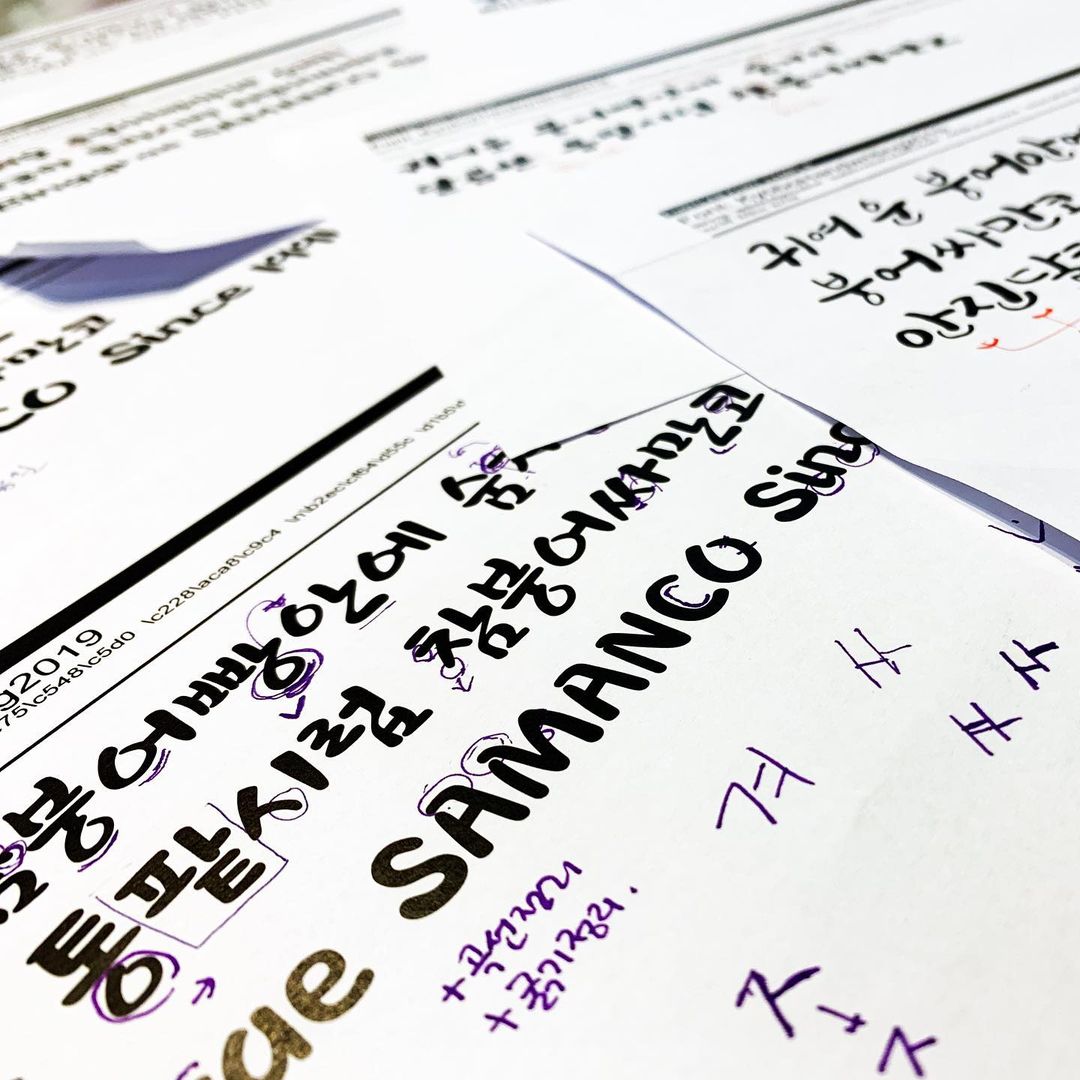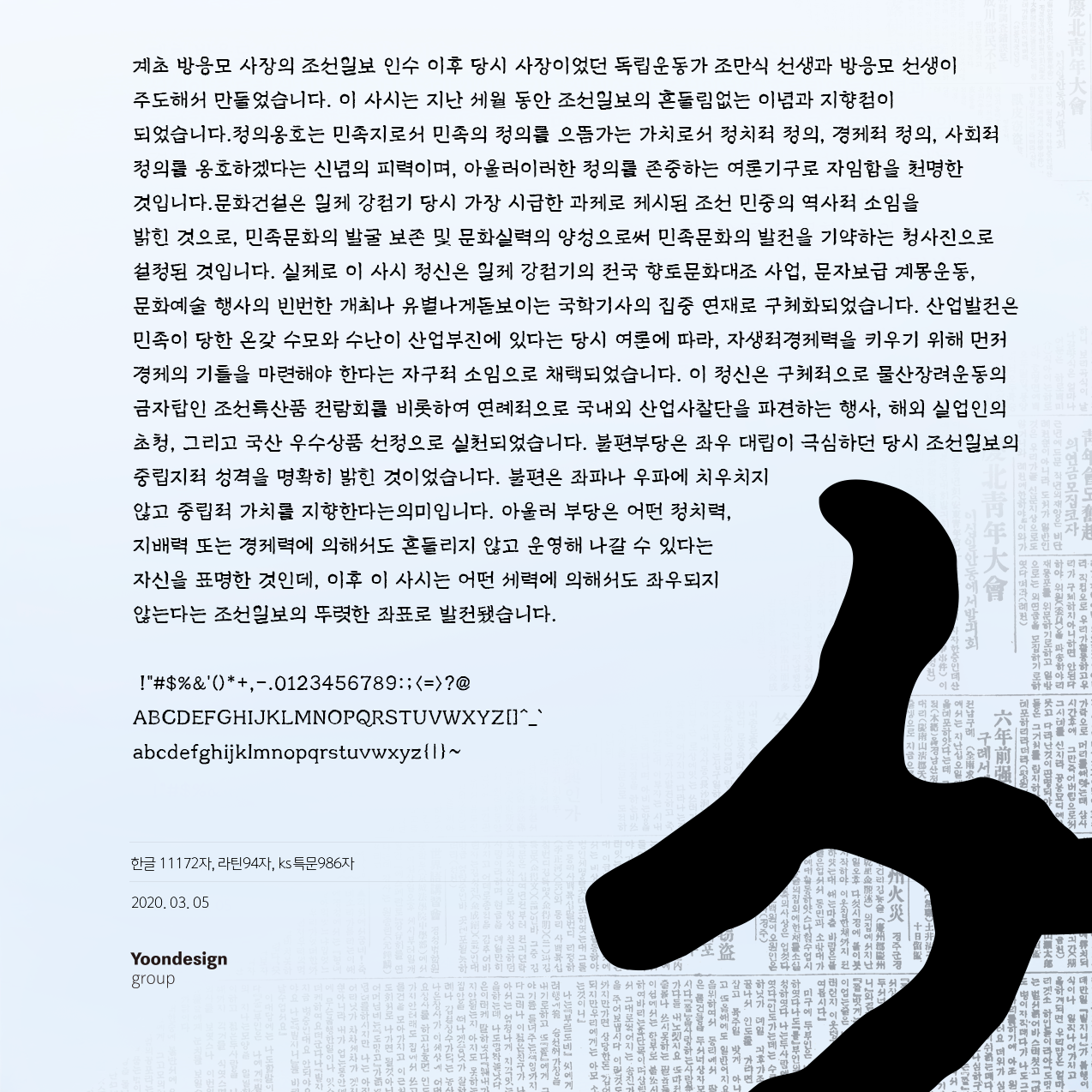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쇼팽 좋아해요?”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음악부터 들려준다. 창문 너머엔 감들이 붉은 등처럼 달려 있고 빈 목련나무 아래 낙엽이 가득하다.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자유로운 보헤미안으로 살아가는 그녀를 꼭 닮았다. “춤추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다시 묻는다. 꽃과 시와 음악이 넘실거리는 이곳에서라면 누구라도 맨발로 춤추는 보헤미안들(La Bohème)처럼 살고 싶어질 듯하다.

집이 참 근사하네요. 작업하기 좋은 분위기에요.
1년 동안 고르고 골라 찾은 집이에요. 원래는 예전 초등학교 친구네 집이었는데 삼계탕 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기 간판처럼 생긴 거 보시시죠? 은행나무집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지금은 홍지윤의 꽃으로 덮였죠(웃음). 그런데 집 앞만 그럴 듯해요, 담장도 앞에만 막아놔서 정작 뒤는 뻥 뚫렸어요(웃음). 동네에 화가의 집으로 알려졌다는데 동생 말로는 저만 모른대요(웃음).
올 해 유난히 많이 바쁘셨죠?
정말 그랬어요. 상반기엔 개인전과 인천아트 플렛폼 레지던시를 했는데 자동차에 그림도 그리고 니키 드 상팔(Niki de Saint Phalle) 오마주 작업인 <낭만변주곡> shooting 퍼포먼스를 했어요. 여름엔 백령도에서 영상과 설치,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화려한 경계> 작업을 했죠. 가을엔 TED 강연이랑 안도 다다오, 쟝샤오강 등과 함께 헤럴드 포럼 인터뷰가 있었네요. 지금은 박사논문 마무리 작업 중이고요. 특히 두 개의 국제 포럼과 작품논문 준비는 최근 십년 동안의 삶과 작업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집에 있을 시간도 별로 없어서 덕분에 외로울 틈도 없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 내다볼 땐 아까워요, 낙엽 좀 천천히 지면 안 되나, 저 노란 색 너무 아깝다.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았을 텐데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규칙적으로 살아요. 회화 작업하거나 글 쓸 땐 밤 10시쯤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작업 해요. 졸리면 낮에 조금 더 자고. 새벽 5시쯤이 우주와의 교감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밖에서 사먹는 음식이 몸에 잘 안 받아서 밥도 집에서 해먹어요. 김치도 직접 담그고. 나름대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죠.



오방색 꽃들이 화려하다. 몰골법을 기조로 한 꽃들은 형태를 드러내기보다 해체함으로써 오히려 본질에 가까워진다. 흩어진 꽃잎은 새가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정원에 몰래 들어온 고양이가 된다.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투영한다는 인드라망 같다. 꽃은 겹이다. 삶 또한 그렇다. 신비롭고 황홀한 '인연'의 세계다.
특별히 이런 방식의 꽃그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동양적인 것으로 어떻게 현대미술에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형식보다 본질적인 내 마음에 의지하게 됐어요. 동양사상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자연적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형식의 해체가 가능하죠. 예술이 지향하는 정신과도 닿아 있고요. 색동꽃은 전체 작업의 성격을 일괄하고 있어요.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드러내는 은유의 아이콘(icon)이면서 사의적 팽창을 위한 모험의 메타포(metaphor)죠. 오방색과 형광컬러의 요소가 공존하는데 모필로 스케치 없이 단번에 그렸어요. 동양화 기법 중 하나인 ‘몰골법’은 뼈대를 부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존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제 의식의 반영이기도 해요. 삶과 죽음+삶의 안팎, 동양적 사유와 회화형식+현대의 감수성과 다중매체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꽃이 만다라 같기도 하고 정신적이면서도 굉장히 관능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랑의 담론과 맞물려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회화적으로 육화된 터치감이 저를 표현하는 데 더 맞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추구한다기보다 그게 그냥 나인 것 같아요. 난 자유로운 영혼이니까(웃음). 디자이너들과 접촉하면서 셍긴 그래픽적인 감각과 모니터 작업에서 보이는 색을 그림 안의 꽃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한 면도 있고요.
처음 볼 땐 색감이 화려한데 보면 볼수록 깊은 슬픔이 묻어나네요.
우리 엄마가 나를 분신처럼 키우셨는데 제가 서른둘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유체이탈이라고 해야 하나, 한 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작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경험을 한 셈이죠. 한동안 너무 슬퍼서 그림만 그렸어요. 제 작업 속의 색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누구는 꽃상여 색 같다고도 해요. 색은 독일체류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그전엔 수묵 위주로 작업했는데 독일에서 돌아온 후부터 색채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뮌헨 문화부 초청으로 반년 남짓 독일 남부에서 머물렀는데 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죠. 내 안의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된 시기였고요.
작품 속에 시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동양인이 인식하는 삶은 ‘윤회’, 또는 “인연’이라는 말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을 의식하죠. 삶과 공간이 유한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오는 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비극적으로 생각하면 살기 힘들죠. 슬픔과 기쁨이 통하고 산다는 건 죽어가는 거죠.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그녀의 시는 핏방울 같다. 은유가 많은데도 스트레이트하게 심장을 울린다. 생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 영감을 받은 후 자신 안에서 먼저 육화된 것이 상징으로 풀려나온다. 삶과 죽음, 현실과 이상, 예술가와 생활인, 이쪽과 저쪽 경계를 넘나들며 동시에 그녀는 존재한다. 하얀 목련과 빨간 계단이 있는 집에서 낭만적인 시를 짓고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며 홍지윤으로, 홍지윤답게.
작업들이 이론보다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계산적이질 못해요. 그게 콤플렉스였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나답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봐야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아예 전면적으로 극대화하자고 생각했죠. 영감이나 체험보다 공부가 먼저 들어가면 설명화에 불과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건 사건이건 움직이고 부딪치는 편이에요.
단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화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작업방식이 있나요?
어떤 한 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전후관계가 있잖아요.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도 모르는 맥락이 있다고나 할까. 그런 게 작업에 묻어나죠. 내 속의 나와, 나와 관계된 세상을 통찰하면서 하나의 ‘대상’으로 보려고 해요. 의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질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작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요?
예술은 결국 영감에 의한 것이지 지적체계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술가나 예술이 빛이 날 땐, 영감이 먼저인 경우에요. 한 마디로 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필을 어떻게 단단하게 예술로 만드느냐가 포인트죠. 필만 보여주면 애들 장난이고 낙서에 불과하니까요. 어떻게 보편화해낼 것인가? 어떻게 포맷을 맞출 것인가? 그것이 자신의 실력인 거죠.
시도 쓰고 글씨 작업과 퍼포먼스도 하시잖아요. 본인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동양화의 상징적 재료인 지필묵으로 글씨를 쓰고 작품화하고 싶었어요. 전통 서예는 너무 딱딱하고. 캘리그래피도 하나의 전형이라고 생각되는 게 유행을 따르는 느낌이에요. 남들이 써놓은 걸 왜 똑같이 쓰지?(웃음) 재료는 그대로 가져가되 표현은 내 스타일대로 하자고 생각했죠. 제 작업의 감각적인 면은 서구적인데 본질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는 방식은 동양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