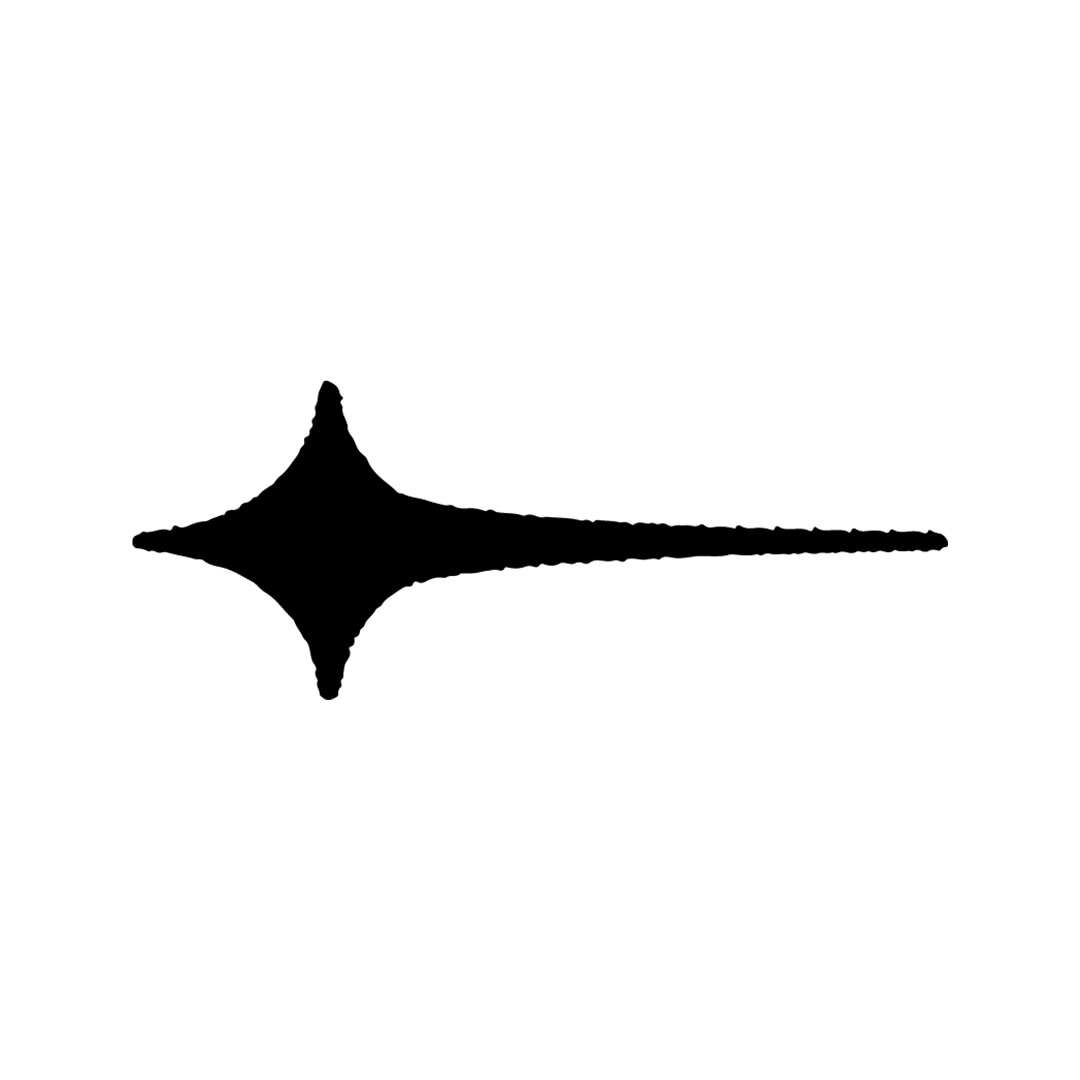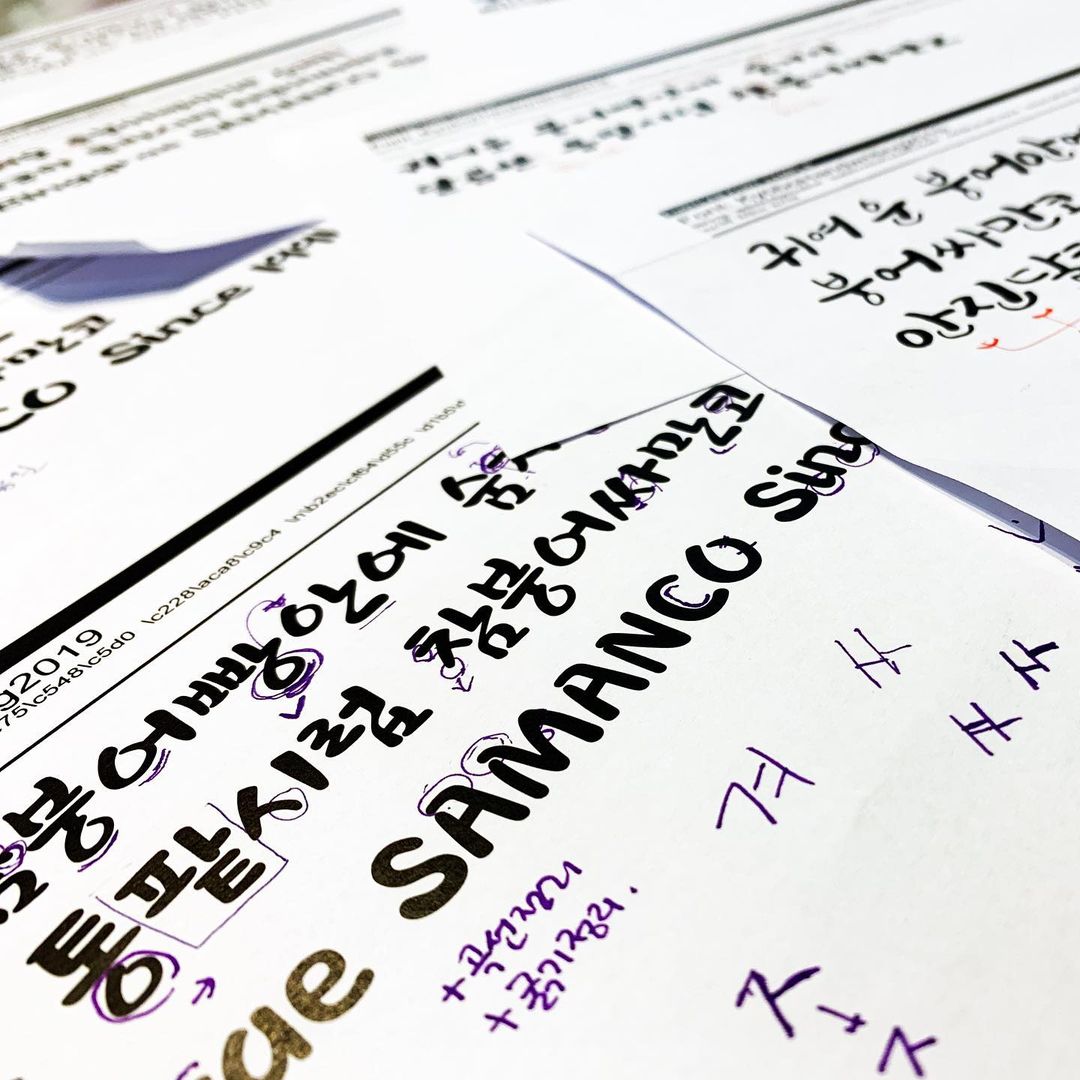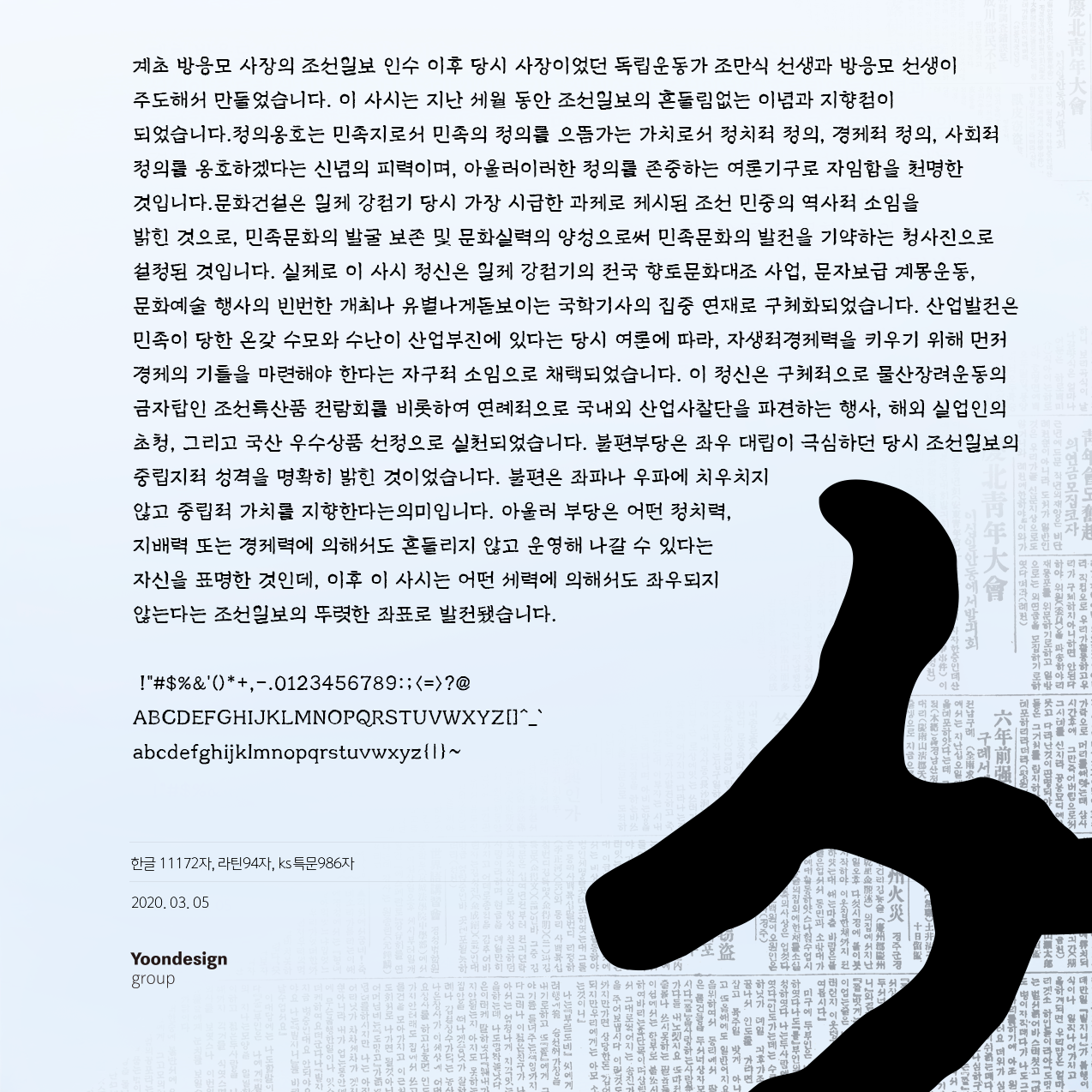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4년 전에 한국에 왔지만 이제 막 도착한 느낌이에요." 서울예술대학 교수 겸 디자인디렉터 배춘희는 '이제서야 한국의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이해되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16살 때부터 30여 년을 독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에게 한국사회는 그리움의 대상이지만 낯선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눈에는 독일과 한국의 차이가 자연스레 보여’졌’다. 그렇게 그녀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것은 <만남>, <붕어빵 이야기> 같은 전시가 되었다.

전시 제목이 <붕어빵 이야기>인데, ‘붕어빵’으로 전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붕어빵이 디자인적으로 정말 퍼펙트하다고 생각해요. 몸의 비율과 꼬리의 비율. 그리고 통통하게 생긴 게 매우 예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잘 까먹어서 고기빵이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붕어빵만 보이면 바로 하나 사 먹을 정도로 좋아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에요. 사람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한 생각에 비슷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요. 전시된 것 중에 ‘넌 왜 그 모양이니?’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는데, 재료는 다 똑같지만 색이 달라 외면하는 걸 보여준거에요. 누가 색다르게 생각하면 손가락질만 하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도 손가락질하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사진 밑에 쓰여 있는 문장을 보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뜻을 지닌 문장이더라고요.
이것들은 제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왜 나 바라봐’하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왜 쳐다봐’ 하고 싸우지.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하고 ‘바라보는 것’하고 보는건 완전히 다른거죠. 바라보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쳐다보는 것은 깔보는 마음이라고 할까. 우리나라는 그런 (말의)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인터넷 카페에 ‘사소한 질문’이라는 영상이 있던데 어떤 측면에서 시작하게 되신 건지….
그것들은 제 학생을 인터뷰한 거에요(보러가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학생들은 저한테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학생들한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5분만 선물하세요’하고 질문을 하나씩 던져서 답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줬지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보고 학생들은 또 생각하게 되고….
전에 <만남>이라는 전시도 그렇고 ‘다르다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게 느껴져요. 저는 한국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해는 할 수가 있죠. 4년 전에 한국에 왔지만 이제 막 도착한 느낌이랄까. 이제서야 한국의 문화, 사회 시스템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행동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차이가 있어요.

독일 광고회사에서 일하셨지만 한국 기업과도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한국 기업과 작업을 하더라도) 유럽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대신에 한국 사람들과 일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게 되면 애매한 대답을 자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색이 노란색인데 마음에 드십니까?’라고 하면 ‘예’ 혹은 ‘아니오’라고 대답해줘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 거에요. 아주 모호한 대답만 거듭하기 때문에 한번은 그냥 여러 색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하나를 찍으라고 했어요. 어느 색을 원하는지. 그럴 때 문화의 차이를 느꼈죠.
그럼 그런 일로 많이 어려워 하셨겠어요.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웃음) 한국에 와서도 제가 눈치를 채야 하는데, 그 애매함 때문에…. 제가 독일에 오래 살아서 눈치가 없어요. 독일은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눈치 없이는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제가 단어 속에 숨은 뜻을 잘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식사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하면 제가 곧이곧대로 듣고 진짜 약속을 잡으려 전화를 하거든요. 그럴 땐 서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져요. 그쪽은 그냥 인사말로 한 얘기였는데 저는 그게 인사말인 줄 몰랐으니까.(웃음)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교수로서의 배춘희는 좋은 선생이다. 얼마 전에 낸 책 <유럽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글씨체>도 학생들에게 타이포그래피를 가르치는 데 쓸 교재가 없어서 만들게 되었단다. 유럽의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폰트 50가지를 골라 사진과 폰트를 함께 보여주는 포켓북으로, 책의 구성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의도는 간단하지가 않다.
<유럽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글씨체>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폰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만들었어요. ‘Garamond’는 귀부인이라면 ‘Bodoni’는 숫처녀. 그런 것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어떤 폰트를 썼을 때 왜 이 폰트를 썼는지 물어보면 그냥 썼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냥’이라는 이유를 싫어해요. 그냥 삽니까? ‘그냥요’가 어디 있어.(웃음)
그러면 전에는 학생들이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건가요?
없죠. 이런 책도 처음이래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프로젝트를 해요. 학생들이 하나하나 레이아웃을 만들면 거기 맞는 폰트를 찾으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황당했어요. 우선 반응이 없었거든. 그리고 학생들이 나를 안 쳐다보고 책상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학생들 마음을 열려고 학생들 데리고 산책을 간다거나 몸 푸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화할 때는 저를 보라고 했죠. 저를 봐야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제가 뭐든 해줄 수 있잖아요.
책에 있는 폰트 50개 중에서 나는 이 폰트와 닮았다 하는 것이 있나요?
기분에 따라 다른데.(웃음) 제가 많이 쓰는 것은 ‘Frutiger’에요. 세련되면서도 특이하고 또 별로 튀지 않아요. 이것은 산세리프 폰트인데 어떻게 보면 여성적이기도 하지만 세련됐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세리프 폰트에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충해주는 타이포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건 ‘Futura’에요. 이것은 보수적이면서도 괜찮은 폰트에요. 그리고 또 모던한 디자인에 써야된다고 하면 ‘Eurostile light’. 이 폰트는 완벽히 세련됐어요.

혹시 지금 전시 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글 타이포를 하고 싶은데 엄두를 못 내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해서는 안 되고 한 5년 정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쭉 해나가야 해요. 한글 서체를 잘 만들어 놓으면 외국에 나가서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읽을 수 있는 문자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양이거든요.
디자이너나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독일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Gestaltung(게스탈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디자인’은 결과물을 보고 하는 말이고 ‘Gestaltung(게스탈퉁)’은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Gestaltung(게스탈퉁)’은 고된 노동이고 좋은 ‘Gestaltung(게스탈퉁)’ 뒤에는 여러 방면에 관한 상식, 체력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심리가 숨어있어요. 디자인은 소비자를 위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소비자를 위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