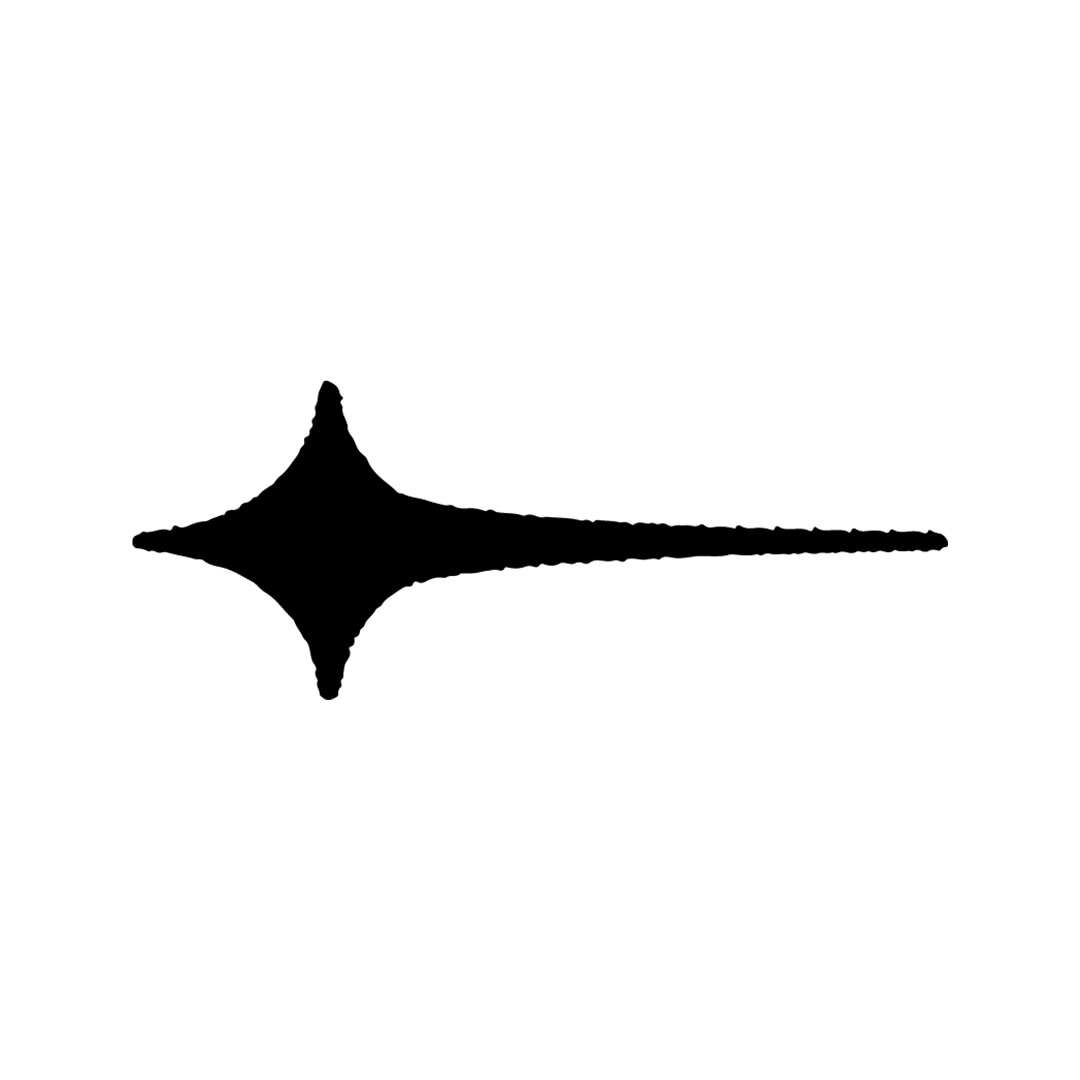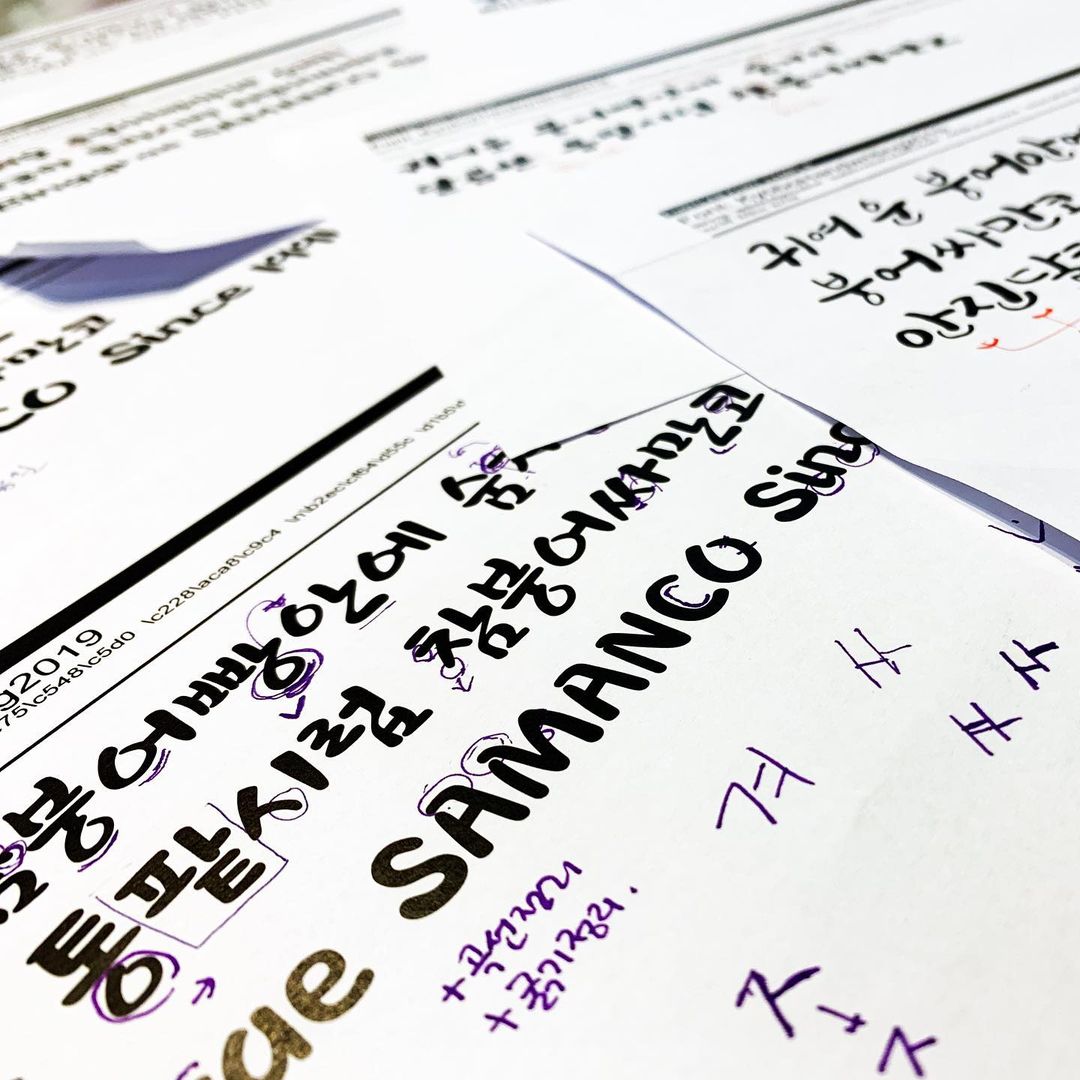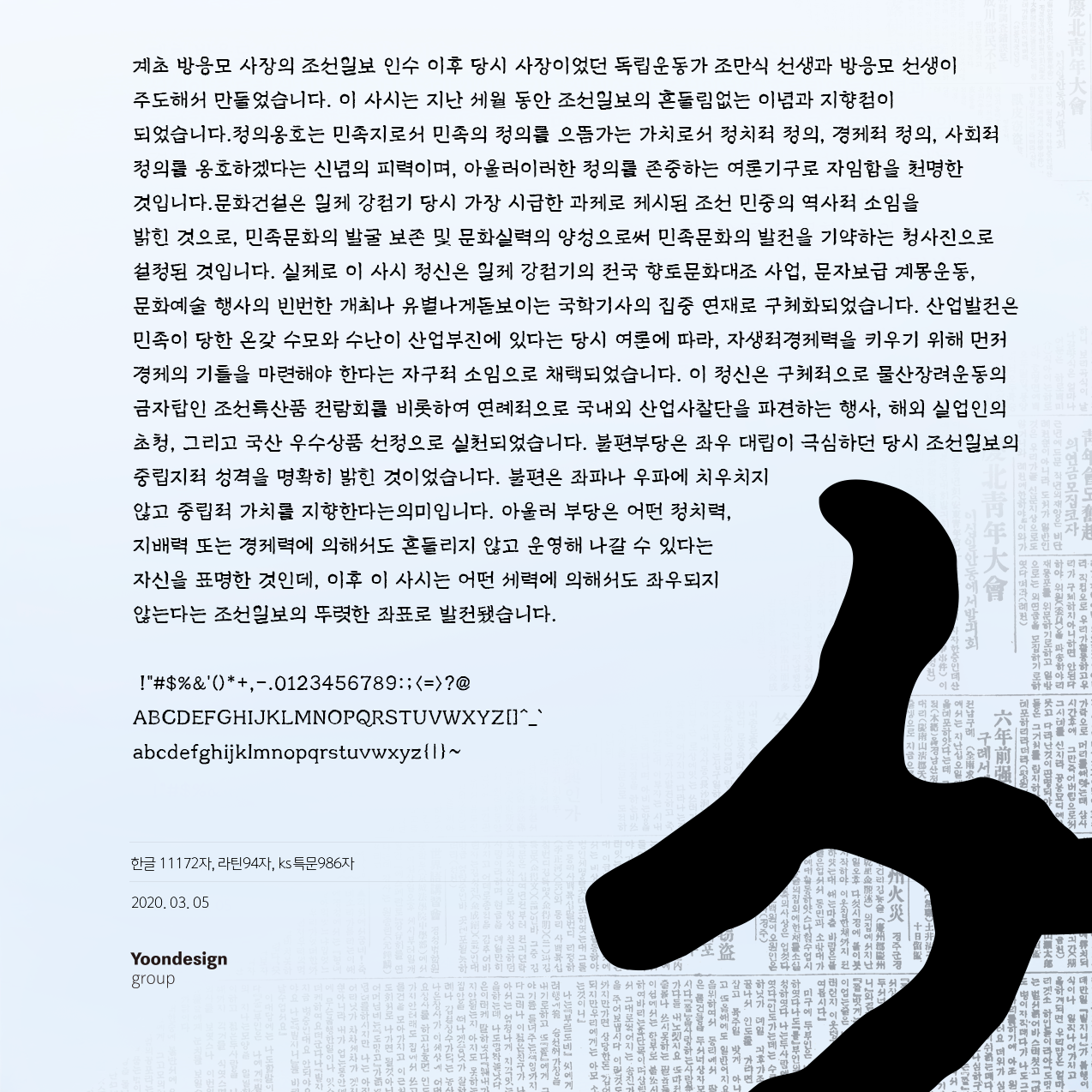인디레이블 '붕가붕가 레코드'의 수석디자이너 김기조(29)는 네모꼴의 복고풍 한글 레터링으로 자신만의 영역 표시를 했다.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버린 정방형(혹은 장방형) 글꼴 디자인에 대해 “네모꼴 틀 안에 글자를 우겨 넣어 새로운 조형미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글자뿐만이 아니라 김기조 본인도 네모난 공간에 우그린 채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자리한 그의 비좁은 작업실 이야기다.
〈아기공룡 둘리〉의 희동이 아빠 고길동을 기억하시는지. 자기 집에 얹혀살던 둘리와 도우넛, 또치를 끊임없이 구박하면서도 결코 내쫓지는 못하던 인정 많은 아저씨 말이다. 그의 단출한 단독주택이 있던 곳이 바로 쌍문동이었다. 이 동네에서 둘리와 친구들이 뛰어다녔고, 불시착한 오징어 외계인들이 길을 헤맸고, 뮤지션을 꿈꾸는 이웃 주민 마이콜이 구공탄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만화가 처음 발표된 때가 1983년이니,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쌍문동 일대는 1980년대의 아날로그적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곳곳에 보이는 세탁소, 전파상, 슈퍼마켓, 집 수리소 들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처럼 행인들을 마주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0년째 쌍문동 주민으로 살아온 김기조는 지난해 6월, 집과 가까운 곳에 허름한 작업실을 얻었다. 열 평 남짓한 공간은 이 동네의 다른 건물들처럼 퍽 연로한 인상이다. 1층짜리 작업실 건물은 건천(乾川) 앞 대로변에 앉은뱅이처럼 자리해 있다.
흡사 물류 창고를 연상시키는 낡은 여닫이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자 부연 먼지들이 햇빛과 섞여 분주하게 와글거린다. 날개가 부러진 선풍기, 타다 만 양초, 한쪽 다리를 저는 나무 탁자 같은 사물들이 계통 없이 널브러져 있다. “좀 어수선하죠?”라며 멋쩍게 웃는 김기조가 전기난로를 켜고, 등산용 버너를 이용해 찻물을 끓이자 그제야 실(室)다운 온기가 감돈다.

② 여닫이문의 뿌연 유리에 눌어붙은 포스터 속에는 아마도 과거의 스타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빛바랜 미소를 짓고 있다.
③ 입구 바닥에는 아직 줍지 않은 전단지들이 흩어져 있다.
④ 누군가가 버린 물건을 김기조는 주워 오고,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작업실 안은 고물상 같은 모양새다.
그가 이 공간을 마련한 이유는 단순하다. 잔뜩 벌려놓기를 좋아하는 성격 탓에 더 이상 집에서 작업하기가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내 방을 집으로부터 약간만 떼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집과 10분 거리인 이곳을 작업실로 정했다.
인심 좋은 주인 덕에 전기세와 수도세를 따로 낼 필요 없는 저렴한 월세로 계약을 했다. 그의 표현대로 “침침한 반지하가 아닌 볕 드는 지상의 건물”을 실로 파격적인 조건에 얻은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비좁은데다 어수선하고, 몹시 지저분한(?) 공간이지만 구색은 다 갖췄다.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일 없이 나오고, 철야 작업에 지친 몸을 누일 쪽방도 있다.

⑦ 오후 5시 57분에서 멈춰 서 있는 플립시계. 이 시계는 제 수명이 다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⑧ 계통 없이 모여 있는 이 사물들은 모두 김기조라는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처럼.
딱히 앤티크 컬렉션이라 부르기에도 뭣한 골동품들(혹은 고물들)은 작업실의 액면 나이를 높이는 주범들이다. 때묻은 레고 소인(小人)들, 로봇 장난감, 수채화용 붓, 시간이 멈춘 플립시계, 원목 책꽂이 등등. 이것들은 김기조가 직접 발품을 팔아 주워왔거나 일부러 돈을 들여 사 모은 것들이다. 이 스물아홉 살의 괴벽스러운 청년은 자신의 수집에 대해 꽤 거창한 철학을 갖고 있다.
“요즘 같은 대량 소비사회에서 마감 시간에 쫓기며 완성된 물건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주 버려지고, 쉽게 또 다른 새 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이죠. 특히 MDF나 파티클보드로 만들어진 가구들은 나무인 척하는 눈속임 제품 같기도 해요. 이에 비해서 옛것들은 재료에 보다 충실하달까. 물성(物性)이 굉장히 솔직하다는 생각을 해요. 쉽사리 교체되지 않고 사람과 함께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죠.
음, 공공 디자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실 ‘디자인서울’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엔 서울시민들에 의해 누적된 옛걸들을 없애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덧입히는 작업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작업실에 옛날 물건들을 수집해놓은 것도 일종의 반발심이죠. 개발과 건설의 연속인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제 일상에 축소시킨 거예요.”

⑩ 디자인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소설과 인문학 서적들도 꽂혀 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저 너저분하기만 했던 작업실이 한 젊은 투사의 비밀스러운 아지트로 다시 보인다. 실제로 김기조 본인도 자신의 작업실을 “베이스캠프”라고 불렀다. 옛것을 급습하려 하는 새것들의 동태를 살피며, 김기조는 위병소처럼 좁은 작업실에서 지금도 경계를 서듯 작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