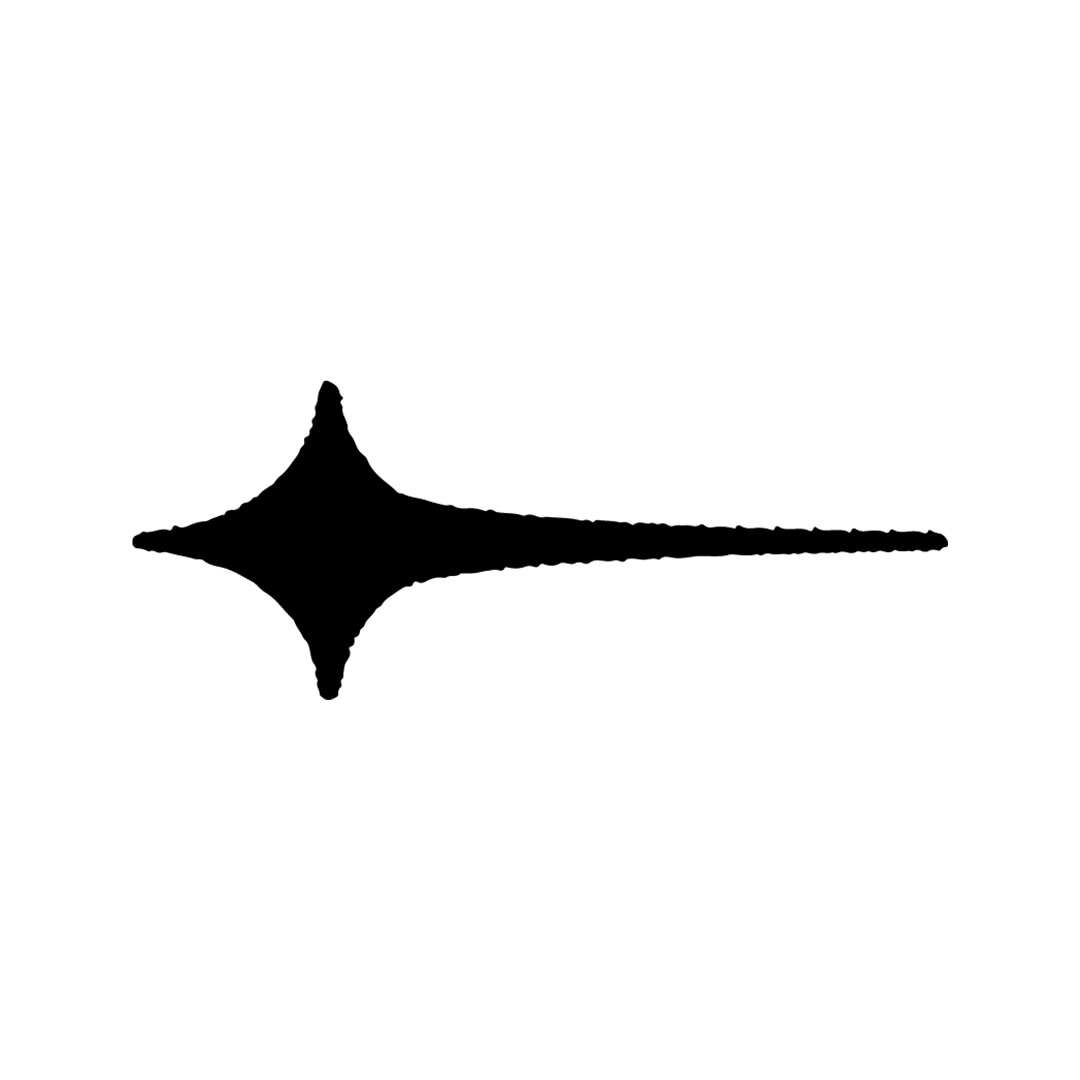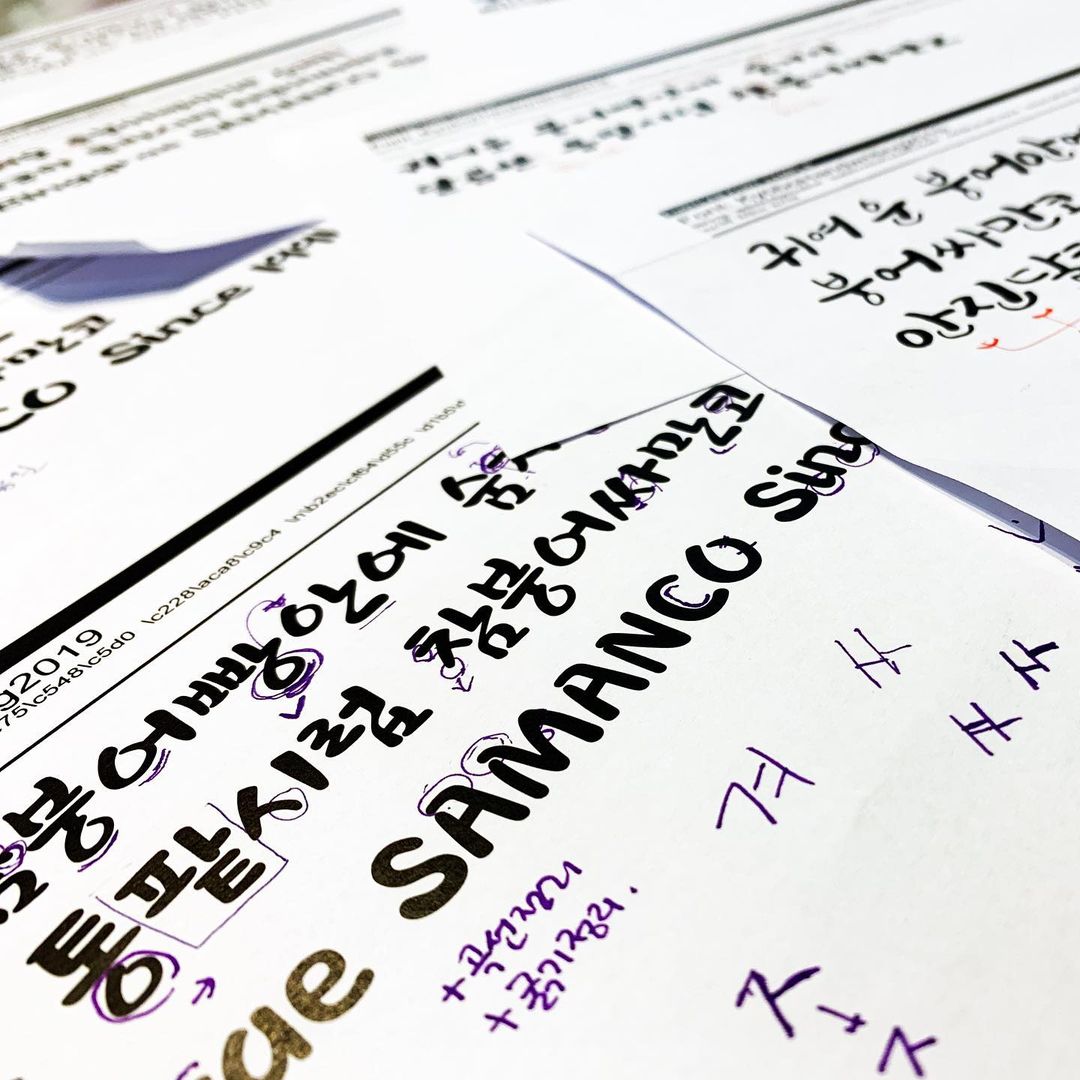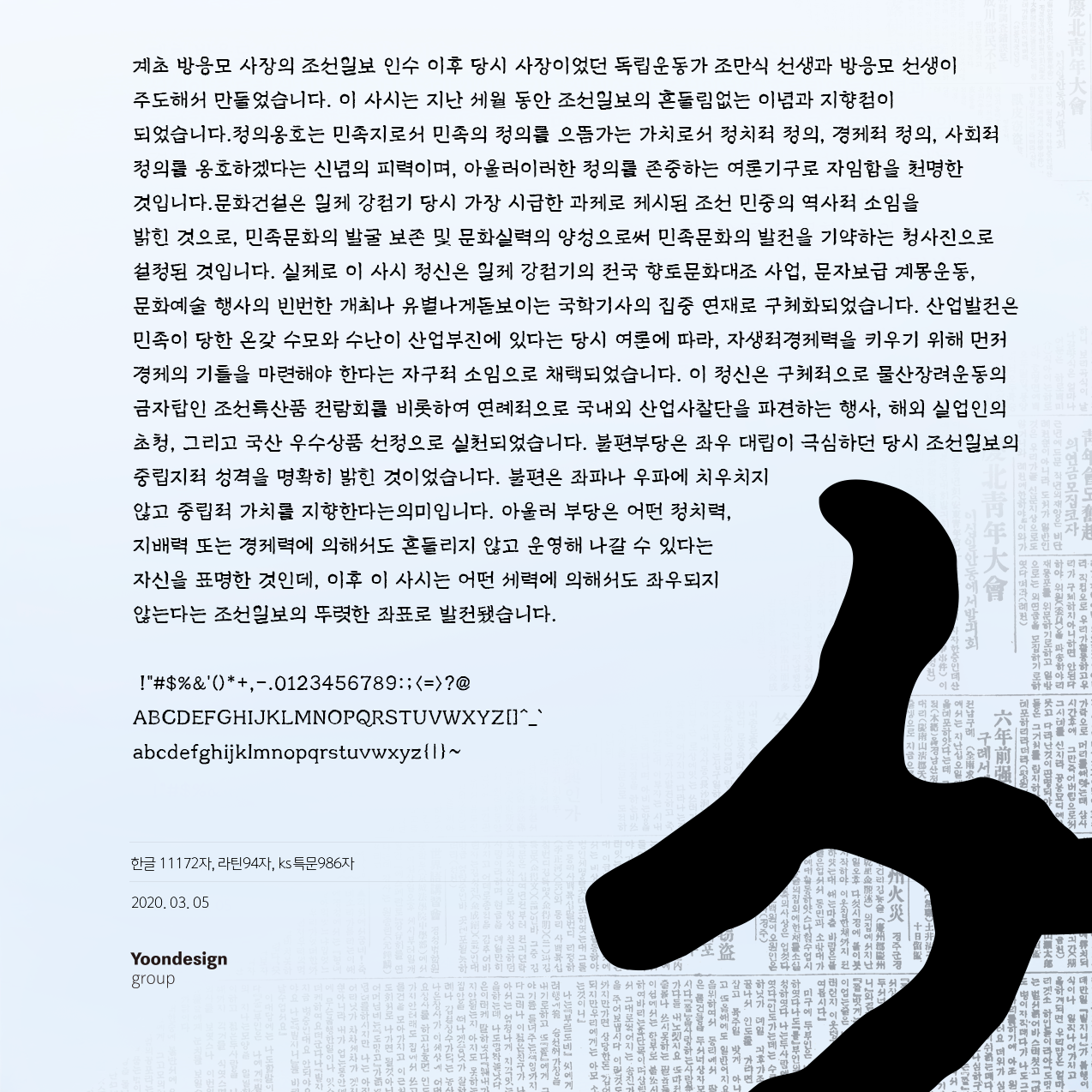그래픽 디자이너 강주성은 핀란드 헬싱키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한다. 그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현송과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이름이 리모트(Remote)다. 스튜디오 리모트는 물리적 공간을 두지 않는다. 강주성·이현송은 각자의 시공간에 머물며 공동의 작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스튜디오명이 리모트다. 이러한 원격 작업은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요하는 것이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성과 표정과 제스처를 생략한 채로 누군가와 제대로 교신하려면, 그 생략된 바들에 상응하는 정밀한 의사 전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메일 한 통을 쓸 때도 적확한 언어를 구사해야 할 것이다. 수신자가 못 알아듣는 두루뭉술한 구어체 문장은 일 처리를 더디게 할 것이므로. 먼 대상과 물리적 공간을 두지 않고 통신하는 데 익숙한 탓인지도 모른다. 강주성이 유달리 ‘공간’을 사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의 몇몇 그래픽 작업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게 뭘까’ 하고 갸웃하게 한다. 능동적 관찰자라면 ‘저게 뭔지’를 스스로 알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가만히 멈춰 있게 된다. 사람이 한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그 자리는 그 사람의 ‘공간’이 된다. 식당의 빈 자리에 손님이 앉는 순간, 그 자리는 그 손님의 자리-공간이 되듯이. 강주성은 자신의 어떤 작업들을 가리켜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지 못한 장소를 다시금 떠올리는 역할”이라고도 설명한다. 이 인터뷰 또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 서울의 인터뷰어는 헬싱키의 인터뷰이를 만나지-경험하지 못했다. 이메일로 전송된 인터뷰 질문은 일정 부분 상상의 산물이었다. 강주성은 아마도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인터뷰이 쪽에서도 일면식 없는 인터뷰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상상해봤을 것이다. 리모트의 방식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낯선 타인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한다. 서로가 떠올린 이미지가 각자의 실체와 얼마나 닮았는지는 나중 얘기다. 우선은 만났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 인터뷰는 헬싱키의 인터뷰이와 서울의 인터뷰어 사이에 생성된 공간이다. 서로의 상상이 만든 공간, 거기서 ‘리모트’는 이루어졌다.


『타인의 삶』은 한국·핀란드·일본에서 활동 중인 창작자 18인의
삶과 공간을 소개한 출판 프로젝트로, 강주성이 총괄 기획했다.
그래픽 디자이너 강주성과 얘기해보고 싶다, 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일자로 『It’s Nice That』에 실린 인터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인터뷰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책을 덮고 나면, 자신의 삶과 주변 공간들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제가 경험했듯.(The moment you close the book, you begin to reflect on your own life and the spaces around you, as I experienced.)”
2018년 제작한 책 『타인의 삶』을 언급하면서 했던 말이죠. 『타인의 삶』은 크리에이터 18인의 삶의 단면(a slice of life)을 그들의 공간을 통해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누군가의 공간은 그 누군가와 몹시 닮아 있더라, 라는 발견이 『타인의 삶』 기획의 출발이었고요.
저도 이 책을 봤습니다. 현대무용 장르인 무용시(choreopoem)처럼도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을 돌아보진 않았습니다.(웃음) 다만, 공간에 대한 생각은 많아졌어요. 공간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 있지? 공간의 형태가 바뀌면 나라는 사람의 모습도 바뀔까? 나 자신이 변하면 내 공간에도 변화가 생기나? ······ 이런 물음들을 진지하게 궁리했습니다.
사람이 지각 있는 상태로 계속 움직이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공간(들)과의 인터랙션은 발생하는 듯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 디자이너라면, 인터랙션의 범위나 텐션은 좀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를테면 책이나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행위는, 책·포스터뿐 아니라 그것들이 놓일 공간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누군가가 근사한 포스터 한 장을 집 벽에 붙여놓고는 “집이 확 사는군!” 하고 감탄할 수도 있는 일이죠. 이 포스터의 디자이너는 어느 익명인의 집을 ‘확 살아나도록’ 손을 썼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작업들이 이 세계의 공간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나요.
그래픽 디자인을 그만두는 시점을 상상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언젠가 그 시점이 왔을 때의 나 자신을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매체들 가운데 책을 예로 들자면, ‘내가 디자인한 책들은 어떤 사람들의 책장에 꽂혀 있을까’ ‘몇 권이나 꽂혀 있을까’ 같은 생각들을 아마도 하고 있을 것 같더군요.
『타인의 삶』 발행 후에 ‘팩토리2’에서 짧은 전시를 했습니다. 『타인의 삶』 참여 작가인 나미 마키시(Nami Makishi)가 디자인한 책장을 공간 한가운데 놓고, 책장 한가득 『타인의 삶』을 꽂아두었습니다. 관객 각자가 자기 책장에서 책을 꺼내 보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의도한 것이었어요. 전시된 책을 훑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수평의 축〉에 그래픽 디자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시 날짜가 변경되고 일정이 축소되면서 관람을 놓친 분들이 많았어요. 그사이 작업 중이던 도록이, 전시를 직접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디자인한 작업이 누군가의 집을 확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타인의 삶』과 〈수평의 축〉 전시 도록 모두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지 못한 장소를 다시금 떠올리는 역할에 충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보면서 늘 상상하고 또 곱씹는 걸 즐기거든요. 제가 디자인한 작업 역시 같은 방식으로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타이포크라프트 헬싱키 17(TypoCraftHelsinki’17)〉 출품작 ‘PAUSE’, 서울문화예술재단 전시 〈매듭〉 포스터를 좋아합니다. 두 작업이 서로 연결돼 있단 인상도 받았어요.
‘PAUSE’는 P, A, U, S, E 다섯 글자를 절단하고 포개놓아서, 보는 사람이 각각의 문자들을 머릿속으로 복원해보게 만듭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제목 그대로 잠깐 멈춰 있게(pause) 됩니다. ‘매듭’은 무(無)의 배경에서 ㅁ, ㅐ, ㄷ, ㅡ, ㅂ이 서서히 한 획 한 획 모습을 드러내는 이미지인데, 이 작업에도 PAUSE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포스터 안에서 ‘매듭’이란 두 글자는 어떤 획순(혹은 로직)으로 현현하는 걸까, 하고 들여다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매듭은 어떻게 지어지는 걸까. 매듭은 뭘까.
식당의 빈 테이블 앞에 누가 서 있으면, 왠지 그 테이블은 ‘이미 그 사람의 자리’인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혹시 자리 맡고 계신 건가요?”라고 예의상 묻게 되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앞에 두고 사람이 가만히 서/앉아 있으면, 그 대상과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만의 보더레일(Border Rail)’이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PAUSE’와 ‘매듭’이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보는 사람을 멈춰 있게 한다, 그 사람만의 내밀한 스페이스가 생겨난다, 그 안에서 작업은 ‘의미를 지닌 무언가’로 그 사람의 눈앞에 현현한다, ···. 앞서 얘기한 『타인의 삶』도 그랬고, 어쩌면 디자이너 강주성은 ‘공간’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사람 아닐까 하는 짐작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PAUSE’와 ‘매듭’의 작업 과정 소개도 함께.
〈타이포크라프트 헬싱키 17〉에서 전시한 ‘PAUSE’는 2017년에 이현송 디자이너와 함께한 작업입니다. 공유회 〈매듭〉 포스터는 비교적 최근인 작년 겨울 작업이고요. 두 작업 사이에 2년 남짓한 짧은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무척이나 길게 느껴집니다. 2년은 더 된 것처럼요. 사실 두 작업이 서로 닮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서, 둘을 비슷하게 보셨다는 감상이 반갑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다듬어진 서체와 디자인, 그리고 알고 있던 단어가 주는 익숙함으로 인해 글을 읽는 동안 일부 단어들을 생략하게 된다는 어느 아티클을 접한 것이 ‘PAUSE’ 작업의 계기였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늘 가독성을 고려하고 읽기 좋게끔 여러 요소를 다듬어야 해요. 이와 반대되는 무언가를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알파벳이 가진 익숙함을 지우고 오히려 낯설게 만들어서, 단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어요. 가독성이 높은 헬베티카를 일정한 규칙으로 쪼개고 다시 붙여 한 세트의 낯선 서체로 재조합했습니다. ‘PAUSE’의 낯선 조형은 읽는 이에게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텍스트를 천천히 읽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다뤄야 하는 단어와 글을 전하는 방식을 ‘PAUSE’로 제안해본 것이었어요.
〈매듭〉은 ‘전통연희 증강랩’이라는 서울문화재단 운영 프로그램의 공유회 제목입니다. 완결된 전시라기보다 연구원들이 쌓아온 시간을 공유하는, 즉 풀어놓는 자리였어요. 공유회가 끝나면 연구는 재개될 것이고, 풀어놓았던 것들은 다시 여물리게 되겠죠.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매듭을 묶고 또 풀어내는 언어를 포스터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단어 ‘매듭’을 쓰는 획의 순차를 풀어서 보여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체의 그래픽 요소를 배제한 하얀 배경은 의도한 것입니다. 여백을 시각적으로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그릇으로 바라봤어요. 매듭을 풀고 짓는 연구원들의 활동으로 가득 채워질 그릇. 〈매듭〉 포스터처럼 낱장으로만 의미를 전달해야 할 때는, 지극히 짧은 찰나에도 보는 이가 충분히 사유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 장치에 대해 항상 고민합니다.

디자이너 이현송과 협업

다양한 영역의 작업자들과 협업하셨습니다. 판화 프린팅 레이블 아티스트프루프(Artist Proof)와의 인스톨레이션 작업 ‘코스모스’, 헬싱키에서 활동하는 홍콩 출신 사진작가 셔웅이우(Sheung Yiu)의 작품집 『Para-images: Cultural Ideas and Technical Apparatuses Beyond the Pictorial Surface』 등등.
제 오해일 수 있겠습니다만, 왠지 디자이너 강주성은 ‘디자인계 밖’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표현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몹시 전력투구 중인 듯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여러 예술 분야를 오가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의도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운이 좋게도 여러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창작자 분들과 협업을 시작하면, 대부분은 프로젝트 하나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 작업을 함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하기 전 전달받은 원고나 자료를 감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속에서 창작자와 작품 간의 흐름이나 관계를 배울 수 있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자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HIAP(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Programme)의 큐레이터였던 옌니 누르멘니에미(Jenni Nurmenniemi)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2017 아트선재 프로젝트 #7: 프론티어스 인 리트리트: 에지 이펙트 – 활성 지구〉 전시 그래픽을 의뢰받은 것이 만남의 계기였어요. 이후 옌니와는 2018년 광주비엔날레의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 〈허구의 마찰(Fictional Frictions)〉을 비롯해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타인의 삶』도 그중 하나입니다. 옌니의 에세이 「’화석연료에 종속된 삶’과 두 개의 몸」이 수록돼 있어요. 옌니는 ‘생태학적 사고와 현대 미술의 교차점’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큐레이터입니다. 저희가 같이했던 전시들은 그 연구 주제의 연장선에 있었어요. 제게는 낯선 분야였는데, 협업하는 동안 조금씩 알아가고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창작자들과 시간을 두고 주고받는 호흡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 협업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외 분야의 협업만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웃음)

아티스트프루프와 협업







디자이너 에머리 대시(Emery Dash)와 협업
기획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언급한 『타인의 삶』도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였고, 지난해 열린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선 공동기획자로도 참여했습니다. 디자이너-기획자 강주성이 생각하는 ‘기획력의 조건들’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제 자신을 ‘기획자’라 칭하는 게 아직은 낯설어서요. 『타인의 삶』의 경우라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삶』에는 사진가, 작가(writer),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끄는 기획팀 등 여러 분야의 창작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지만, 『타인의 삶』과 어울리는 ‘타인’을 섭외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사진가 그룹을 예로 들면, 훌륭한 사진을 찍는 분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이 책의 결에 맞는 사진을 담아낼 작가이자, 프로젝트에 애정을 느낄 분을 찾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저로서는 이 짧은 경험을 통해 ‘기획자’의 태도와 소임을 배운 것 같아요. 기획자가 창작자의 작업 방향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방향에 맞춰 적절한 역할과 과업을 배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기획자로서 창작자에게 의뢰한 경험보다, 디자이너로서 기획자에게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경험이 더 많아서 이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업 의뢰를 한 기획자가 제가 쌓아온 디자인의 결에 관심을 두고 이를 이해해줬을 때, 좀더 큰 시너지가 생겼거든요.


스튜디오 리모트의 강주성·이현송이 공동 아트디렉터로 참여한 제19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 2019
이현송 디자이너와 함께 운영 중인 스튜디오 리모트,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인가요?
강주성
(스튜디오 공동 운영자인 이현송 디자이너에게도 이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제 답변에 이어 현송 씨의 답변도 덧붙입니다.)
스튜디오 이름을 ‘리모트’로 결정한 시기가, 저와 이현송 디자이너가 2019년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아트디렉터로 참여했을 때입니다.
의뢰를 받은 당시에 저는 헬싱키, 이현송 디자이너는 런던에서 각각 활동 중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를 유럽의 도시에서 준비한다는 게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침 또 스튜디오명을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작업의 완성도에 물리적 거리는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다(않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이름에 담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리모트’라 정했어요.
이현송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특수하지만, 어찌 보면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원격으로 협업이 가능한—상황을 활용한 협업 형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함께 일을 해보자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예요. 어떤 나라나 도시에 정착해서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도,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당분간은 이러한 가상적 형태의 협업 구조를 여러 모습으로 변형해 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