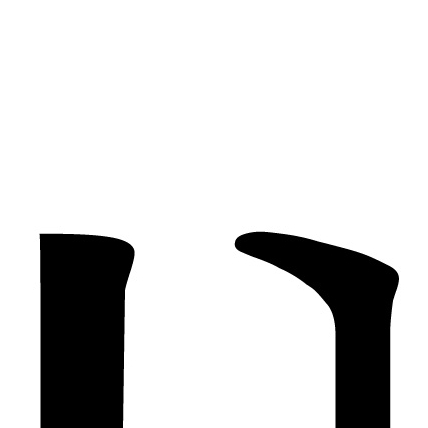지난 「미미와 소소」 1~6부는 ‘고딕’ 편이었다. 여섯 편의 글을 통해 ‘고딕의 다름’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명조의 다름’을 알아볼 차례다. 명조는 고딕에 비해 특징적이다. 고딕이 직선적이라면 명조는 곡선적이다. 그래서 혹자는 명조에 한국적인 선이 깃든다고도 표현한다. 우리가 책이나 문서를 읽을 때 늘 보던 명조, 그 명조(들)에는 어떤 ‘다름’이 숨어 있을까.
명조의 사전적 정의는 ‘글자 줄기 끝에 부리가 있고 붓의 영향을 받은 글자꼴’이다. 이 부리가 바로 명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부리란 ‘글자 줄기의 머리나 맺음에서 꺾이거나 튀어나온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첫돌기(돌기)’라고도 통칭한다. 하지만 명조와 고딕에서 첫돌기의 형태와 역할은 각각 다르므로, 명조를 논할 때는 따로 구분하여 ‘부리’라 칭한다.
한자 서예와는 다른 한글 서예, 부리의 시작
‘부리’라는 이름은 돌기 모양이 말 그대로 새의 부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졌다. 실제로 고딕의 돌기와 명조의 부리를 비교해보면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에는 그 형태가 많이 다르다. 고딕은 기존의 세로기둥에 장식의 역할처럼 돌기가 붙어 있는 느낌이라면, 명조는 획의 시작 자체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 부리의 형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부리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금이야 연필이나 펜 등 필기도구가 다양하지만 그 시대에는 오로지 붓으로 글씨를 쓰고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 붓은 펜에 비하여 성질 자체가 유연해서 글씨를 쓰는 사람의 힘과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한다. 한 획을 긋더라도 펜은 일정한 굵기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붓은 필압과 필속에 의해 획의 굵기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예의 운필법(運筆法, 붓을 움직이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펜으로 획을 그을 때는 특별한 기교 없이 단순하게 획의 진행 방향으로 하나의 선을 긋고 마치면 된다. 그러나 서예에서는 기필(起筆, 획을 시작함), 행필(行筆, 획을 그어감), 수필(收筆, 획을 마무리함)의 과정을 거쳐서 한 획을 그어야 한다. 기필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역입평출(逆入平出)이다. 이는 청나라의 포세신(包世臣)이 제창한 운필법이다. 붓끝을 획이 진행될 방향의 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역입, 붓을 일으켜 세워 붓털을 펴서 내 보내는 것이 평출이다.
역입평출은 튼튼하고 굳센 획을 만들어내는데, 전서·예서·해서 등 한자 서예에서 주로 나타난다. 필자의 글 「미미와 소소」 2부에서도 살펴봤듯, 고딕의 돌기가 역입평출의 서체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아 한자의 획(운필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추측된다.
한글 서예의 획은 한자 서예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글만의 고유한 필법을 담고 있다. 한글 창제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붓을 사용했다. 한자 필체와 서법이 한글 자형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한자 필서에 익숙했던 식자층들이 필서를 하다 보니 한자 획과 닮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훈민정음』 반포 후 10년도 안 지난 시기(1455년)에 간행된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을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한글의 획과 필법은 함께 사용된 한자 해서체 활자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한자 해서체는 기필 때 ‘역입’으로 들어가는 ‘장봉(藏鋒, 붓끝을 필획 안으로 감춤)’으로 되어 있다. 반면 『홍무정운역훈』의 한글은 기필이 ‘순입’으로 들어가는 ‘노봉(露鋒, 붓끝이 필획 밖으로 노출됨)’에 가깝다. 이는 한자 해서체와 분명 다른 형태다.

출처: 두산백과

출처: 블로그 ‘대디티처의 교육 자료실’
이 노봉은 주로 행서·초서 등에 사용되는 운필법이다. 장봉과 달리 마치 펜으로 쓰는 방식과 같아서 붓끝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노봉으로 시작되는 경우 붓끝의 가는 부분부터 글씨가 드러나기 때문에 획 전체를 보면 굵기 변화가 급격하고 획의 시작 부분이 대략 45도 경사를 갖게 된다. 이것이 점차 정착되어 궁체의 필법이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 현재 명조의 ‘부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자, 어떠한가? 이것이 부리가 ‘부리’로 된 이야기다. 단지 붓의 유연한 성질로 인해, 그리고 노봉이라는 운필법에 의해 자연히 혹은 우연히 생긴 형태나 다름없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대략 50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경험과 경험이 쌓이면서 정형화된 형태가 되어 비로소 ‘부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명조’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특징이자 빼놓을 수 없는 구성 요소가 되어버렸으니, ‘첫돌기’라는 이름으로 고딕의 그것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는 것이다. 고딕에서는 첫돌기가 없어도 고딕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명조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논문 「한글 본문용 활자체에 있어서 필서의 특징과 의의」
144쪽 이미지를 바탕으로 필자가 만들어본 예시 자료
(SM세명조의 경우 직지소프트 사이트의 폰트 미리 보기를 함께 활용)
한글 명조가 ‘붓글씨 느낌’을 품은 이유
부리는 과거 노봉의 형태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지만, 그중에서도 최정호와 최정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들은 (한글 고딕계의 아버지이자) 한글 명조계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글자 원도(최정호의 SM세명조, 최정순의 문화바탕체)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리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필법에 의해 일부러 약간 처지게 만든 것
[좌] 출처: 『꽃뜰 이미경 쓴 한글서예』, 이미경 지음, 학원사, 1982, 10쪽
[우] 출처: 『한글글자꼴 기초연구』(출판연구총서 7), 한국출판연구소 지음·출판, 1990, 202쪽
최정호는 자신의 글 「서체 개발의 실제」에서 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기둥에 있어서 세리프의 머리 부분(부리를 말함 ― 필자 주)과 맺음을 살펴보면 머리 부분의 뒷부분을 약간 처지게 하였다. 이것은 기둥의 전체가 활 모양으로 굽어져버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법을 근거로 꺾임 부분을 약간 뒤로 처지도록 하여 전체의 균형을 유지시킨 것이다.”
실제로 명조의 기둥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리가 있는 윗부분이 맺음이 있는 하단부보다 원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리가 왼쪽으로만 무게가 실린다면 기둥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정호는 부리의 오른쪽(뒷부분)에 살을 도톰하게 붙였는데, 이것은 궁체의 필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붓글씨에서 획의 시작을 노봉으로 하여 사선으로 들어가다가 방향을 돌리며 세로획으로 내려긋기를 하면, 붓의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 자리가 도톰하게 된다. 최정호는 여기서 착안하여 활자의 원도에서도 이 부리의 뒷부분을 약간 도톰하게 했다. 정형화된 활자를 만들면서도 비정형적인 붓글씨의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자의 균형을 세우고 명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활자의 균정함 속에 붓글씨의 자연스러움 혹은 손의 느낌을 더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최정호가 만든 부리를 보면 붓의 느낌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필기 시대에서 타이핑 시대로: 부리의 다양화
‘최정호·최정순’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붓은 더이상 일상적인 필기도구가 아니게 되었고, 연필이나 펜을 쥐고 손으로 쓰던 필기 행위 또한 타이핑 행위로 대부분 바뀌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부리는 얼마만큼 다양해졌을까?

직지소프트, 윤디자인그룹 FONCO, 네이버 한글한글아름답게의
미리 보기 페이지에서 각각 캡처
노은유는 자신의 책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에서 한글 명조 계열을 형태와 구조에 따라 최정호 부리 계열, 새부리 계열, 각진부리 계열 등으로 분류하였다. 최정호 부리 계열은 붓의 영향이 남아 있는 글자들을, 새부리 계열은 최정호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 단순화되고 정제된 성격의 글자들을, 각진부리 계열은 말그대로 (상대적으로) 각지게 디자인된 글자들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각각 부리에 붓의 느낌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각각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붓으로부터 시작된 부리라는 것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붓이 일상적인 필기도구에서 멀어진 지 오래인 지금도, 본문용 폰트 안에서 여전히 붓의 영향력은 건재하다. 그만큼 본문용 글자꼴은 균정함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오래 읽히고 자연스럽게 읽히려면 깔끔함과 균정함 속에서도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무언가를 최정호·최정순 세대에서는 붓에서 찾았듯, 지금의 폰트 디자이너들은 붓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찾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연필과 펜이다.

폰트 디자이너 류양희 사이트, 산돌구름 미리 보기 페이지에서 캡처
‘고운한글바탕’(2011, 디자인 류양희)은 연필로 쓴 손글씨 정체의 느낌을 살린 서체, ‘산돌 정체 530’(2019)은 펜글씨의 획을 참고한 서체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길이가 짧고 단단한 형태의 부리를 갖고 있다. 붓이 아니라 각각 연필과 펜으로 쓴 느낌을 반영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로 말이다. ‘고운한글바탕’과 ‘산돌 정체 530’의 부리 형태만을 보면 기존 명조에 비해 짧고 단단해 보이기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서체는 부리의 존재를 그저 ‘붓에서 나온 형태’로 한정시키지 않고, 부리를 글자(명조)의 구성 요소로 독립시켜서 좀더 다양한 양태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글 명조 계열을 다시 분류해보자면, 기존 세 가지 분류(최정호 부리 계열, 새부리 계열, 각진부리 계열)를 ‘붓 부리 계열’로 통칭하고, 새로이 ‘연필 부리 계열’과 ‘펜 부리 계열’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부리라는 작은 요소만으로 글꼴 계열을 일률적으로 분류하기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 콘셉트가 분명한 글꼴이라면 그 콘셉트가 작은 요소인 부리에도 잘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본다. 명조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부리가 좀더 다양해지면 글자 표정 또한 보다 다양해질 것이다. 새로움과 익숙함 그 사이에서 부리와 함께 명조에 더 다양한 표정이 입혀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폰트 디자이너. 호호타입(HOHOHtype) 대표. 2005년 렉시테크에서 폰트 디자이너로 입문해 우리폰트 시리즈, 렉시굴림, 렉시새봄 등을 만들었다. 2013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타이포그래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방일영문화재단이 주최한 제4회 ‘한글글꼴 창작 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돼 새봄체를 제작·발표했다. 이후 ㈜윤디자인그룹에서 바른바탕체 한자, 윤굴림 700 등을 제작했으며, 현재 새봄체의 두 번째 시리즈를 작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