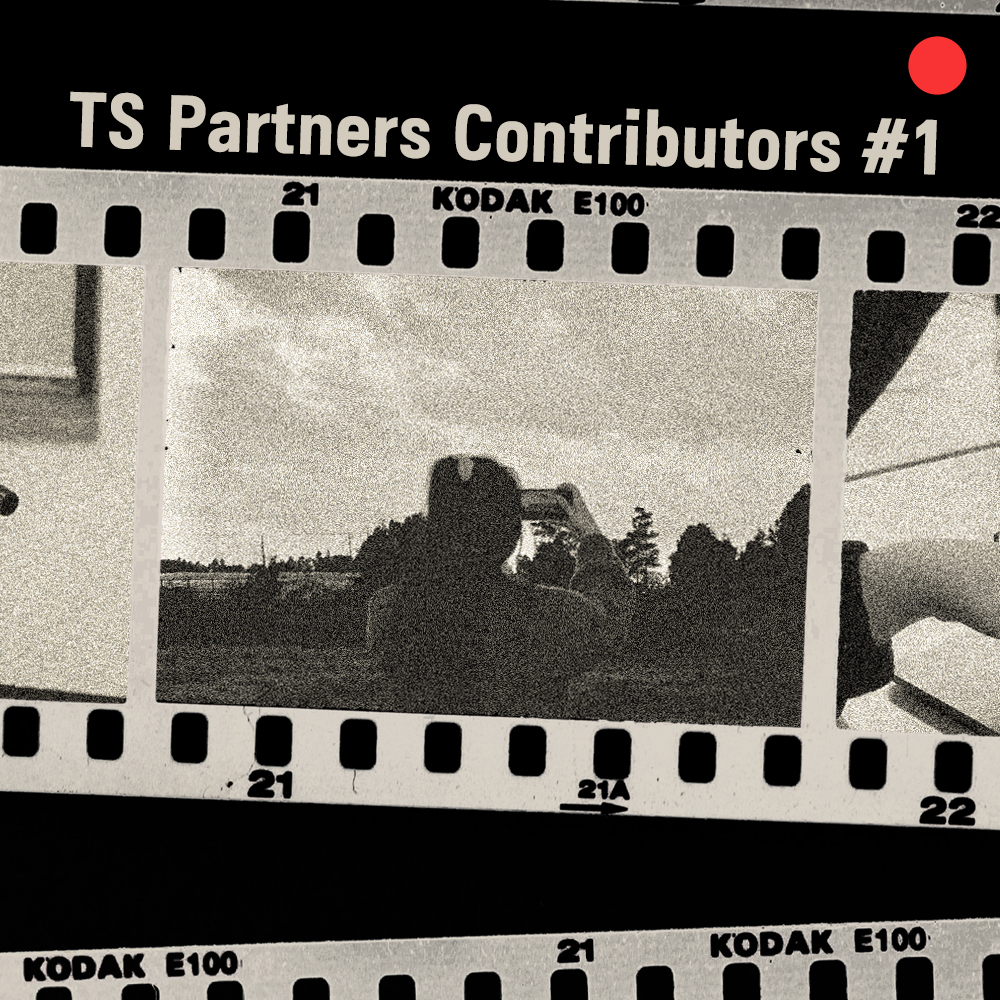뉴욕의 밤거리를 술에 취해 배회하는 가톨릭 신부 브라이언(에드워드 노튼 분). 그가 아이리시 펍의 바텐더에게 고해성사를 하듯 털어놓은 사연은 바로 기구한 사랑 이야기다. 로맨틱 코미디 〈키핑 더 페이스〉(2000)의 주요 줄거리가 시작되는 대목이다.
어린 시절 삼총사라 불리며 절친하게 지냈던 세 아이. 남자 둘, 여자 하나. 당시 유명했던 테이텀 오닐(Tatum O’Neal)을 닮은 여자아이는 아버지의 전근 때문에 서부로 이사를 가게 된다. 남은 남자 아이들은 계속 우정을 이어가고, 한 친구는 신부, 또 다른 친구는 유대교 랍비가 되었다. 브라이언 신부와 랍비 제이크(벤 스틸러 분)가 그들이다. 서로의 우정만큼이나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두 친구에게 과거의 친구 애나 라일리(제나 엘프먼 분)가 나타난다.

[아래] 어린 시절 삼총사(맨 오른쪽이 브라이언) / 두 친구는 랍비와 신부가 되어 뉴욕에서 봉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금융계의 파워 넘치는 커리어 우먼에다가 멋지기까지 한 애나. 그녀의 등장은 두 친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는다. 과거처럼 셋이서 틈만 나면 어울리지만, 더이상 어린애들이 아니기에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다. 브라이언은 신부직을 포기할 만큼 애나를 사랑하게 되고, 제이크는 비유대인 아내를 반대하는 홀어머니와 유대교당 장로들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다가 애나와 제이크는 다른 사람들 몰래 사랑을 시작한다. 애나는 제이크와의 사랑을 위해 캘리포니아의 직장까지 포기하고 뉴욕에 남겠다고 한다. 그러나 즐거운 시간도 잠시, 제이크는 애나에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며 상처를 준다. 상심한 애나는 브라이언에게 울며 하소연을 한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브라이언은 애나가 자신을 사랑해서 고민하는 줄만 알고, 애나에게 속에 간직했던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 당하고 만다.
이미 애나가 제이크와 사귀고 있음을 알게 된 브라이언은 깊은 상처를 받고 방황한다. 애나에게 거절 당한 만큼이나 제이크가 자신에게 사실을 숨긴 것이 큰 상처였던 것이다. 얼마 후 제이크에게 실망한 애나는 다시 서부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애나와 헤어진 제이크는 브라이언을 찾아와 두 사람의 관계를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한다. 브라이언은 오히려 망설이는 제이크에게 애나를 붙잡으라고 격려한다. 영화 속에서 두 친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소는 성당 근처의 횡단보도. 둘의 주변으로 어느새 사람들이 몰려든다. 브라이언이 행인들에게 “왜 여기 서 있죠?”라고 묻는다. 행인들은 “신호가 바뀌지 않아서요”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브라이언이 외친다. “여긴 뉴욕이에요. 누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립니까? 빨리 건너가세요!” 옆에 있던 제이크는 이 말을 통해 우유부단했던 자신을 깨닫고 애나의 송별 파티장으로 달려가는데···.

문제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자. [헬베티카(Helvetica)] 서체로 붉고 선명하게 ‘DONT WALK’라고 표시되어 있다. 보행자 신호는 아랫부분에 ‘WALK’라고 백색으로 표시된다. 이 얼마나 오만한 신호등인가. 영어를 모르면 횡단보도도 건너지 말라는 듯한 차별적인 신호등 아닌가. 이는 빨강·파랑 사람 모양 픽토그램이 들어간 신호등에 익숙한 우리에겐 너무 낯선 기호다. 물론 눈치껏 다른 사람들을 따라 건널 수는 있겠지만 신호등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만큼 오랜 시간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쳐왔다.

세계 최초의 신호등은 사람이 아니라 운송 수단을 위한 것이었다. 증기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던 1868년 영국 런던에서 사용된 가스식 수동 신호등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가스 폭발로 위험성이 재기되자 촛불 및 석유등으로 변화했다.
최초의 전기 신호등은 1914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설치되었다. 다만 당시엔 정지를 표시하는 적색등만 있었다. 1918년에 이르러서야 오늘날과 같은 3색 신호등이 등장해 뉴욕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교차로 가운데 설치된 교통 탑 위에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키핑 더 페이스〉에 등장하는 횡단보도 신호등은 1952년 2월 뉴욕에 도입된 것이다. 영화가 2000년작이니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셈이다. 그래서 노란 택시와 함께 뉴욕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의 수도’, ‘다민족의 용광로’라 불리는 국제도시 뉴욕이 이 불친절한 문자 기반 신호등을 50년간 고집해 왔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미 오래전 각국에서 픽토그램 기반의 적청 신호등이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문자 기반 신호등은 2004년 2월에서야 픽토그램 기반 LED 신호등으로 교체되었다. 당시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는 “뉴욕은 전 세계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비영어권 사람들도 많다. 오늘에야 그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보행자 신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뉴욕의 보행자 신호가 차별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뉴욕의 신호등은 서울의 신호등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기존의 ‘적청 신호등 + 픽토그램’에 비해 몇 가지 면에서 진화한 신호등이다. 적청 신호등은 색맹인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픽토그램도 정지한 사람과 걷는 사람으로 구별되는데 그 변별성이 미미하다. 시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비슷해 보일 것이다.
뉴욕의 신호등은 정지 신호와 보행 신호의 픽토그램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 정지 신호는 적색 손바닥이다. 접근 금지, 거부, 정지를 뜻하는 손바닥은 보편적 시각 언어다. 그리고 보행 신호는 백색의 걷는 사람 모양이다. 정지 자세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몸 동작도 역동적이다. 이 두 신호의 색상은 각각 적색·백색이므로 색맹 여부에도 상관이 없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 할 수 있겠다.

뉴욕의 신호등은 2010년 8월 다시 한 번 진화한다. 사실 횡단보도에 서면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다. 신호가 교체되는 잔여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위한 신호등에는 이런 기능을 황색 표시가 하고 있다. 이런 기능이 없는 보행자 신호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 보행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바뀌기까지의 잔여 시간을 숫자로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이 기능이 탑재된 신호등으로 교체된 이후 실제 사고율이 대폭 낮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새 신호등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애써 신호등에서 빠졌던 문자가 다시 들어간 것이다. 과연 신호등의 잔여 시간 표시에는 문자적 표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

서울의 신호등은 잔여 시간 표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화살표 표시가 줄어드는 비문자적 표시와 숫자로 알려주는 문자적 표시다. 화살표 표시의 장점은 문맹자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잔여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아라비아 숫자가 언어와 상관없이 만국 공통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로서는 숫자 표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의 신호등은 진화하고 있다. 모래시계 모양으로 잔여 시간을 표현하는 곳도 있다. 이런 시도는 LED 조명의 개발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친근한 신호등 속 사람 모양 픽토그램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독일의 신호등에 표시된 배 나온 남자 픽토그램은 암펠만(Ampelmännchen, 신호등 남자)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녹색은 게어(Geher, 걷는 사람), 적색은 슈테어(Steher, 서 있는 사람)다. 이 암펠만은 귀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50이 넘은 아저씨다.
1961년 동독의 칼 페글라우(Karl Peglau) 박사는 동베를린 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남녀노소에게 친근하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 픽토그램을 만들었다. 시력이 저하된 노인이나 지각 능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위해 발광 부분의 면적을 최대화한 결과 통통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다. 날씬한 모습의 픽토그램이 대세인 요즘에 역으로 구별되는 귀여운 몸매다.

이 신호등은 아쉽게도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됨에 따라 거리에서 사라지고 만다. 구 동독인들의 향수와 함께 사라졌던 암펠만은 1995년에 조명 디자이너 마르쿠스 헥하우젠(Markus Heckhausen)에 의해 조명으로 재탄생된다. 이후 다양한 제품으로 탄생되어 통일 이후 상대적 상실감을 느껴온 구 동독 사람들에게 향수를 자극하는 마스코트로 사랑 받았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급기야 2005년에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물론 LED 등 신기술로 새단장을 하고서 말이다. 신호등의 디자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더욱 더 진화해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한치의 망설임과 혼란 없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줄 새로운 신호등을 기대해 본다.
장성환
디자인 스튜디오 203 대표.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타이포분과 이사, 디자인단체 총연합회 실행위원을 역임했다. 홍익대학교 재학 시절 홍대신문 문화부장을 맡으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졸업 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입사해 잡지를 만들며 서체 디자인 작업을 했고, 이후 『주간동아』 및 『과학동아』 아트 디렉터로 활동했다. 『시사저널』, 『까사리빙』, 『빅이슈 코리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서울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호서대학교 등에서 편집 디자인 강의를 해왔다. ‘홍대앞’(서교동·망원동·연남동·합정동 등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를 일컫는 고유 명칭)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2009년 홍대앞 동네 잡지 『스트리트 H』를 창간하여 홍대앞이라는 역동적 장소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중이다.